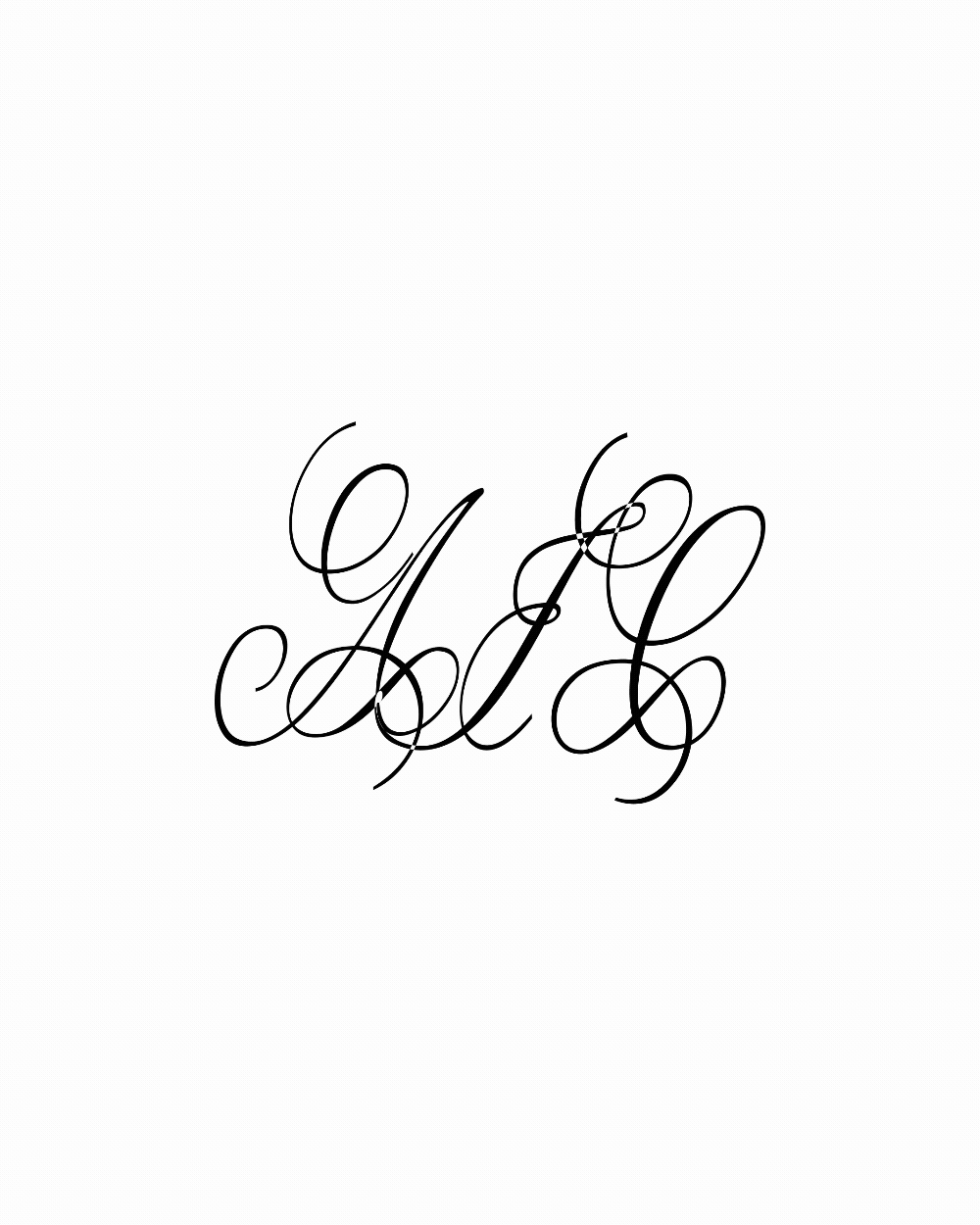AIC(Asian Institutional Critique)는 아시아를 방법론으로 삼아 미술 생태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큐레토리얼 프로젝트입니다. 미술 실천안에서 정치적이고 수행적으로 제도와 범주, 그리고 공동체를 다르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아시아 창작자들을 주목합니다.
AIC의 첫 번째 주제어는 ‘방법론으로서의 아시아’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하나의 본질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특정한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연되고 부딪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AIC는 아시아의 의미를 단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을 통해 잠시나마 기능하는 인식론적 틀을 만들어 봅니다. 이는 사유의 방법과 태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관계와 의미를 존중하는 작은 윤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AIC의 두 번째 주제어인 ‘비평성’으로 이어집니다. AIC의 비평성은 이미 구획된 제도와 미술사를 대체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 중인 시스템의 자장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비판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도 비판이 지닌 미학적 정치성은 예술 창작을 위해 포기되다시피 한 부산물을 돌보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다정한 태도를 장착한 미술이 감각과 사고의 지형을 바꾸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쑨거와 에이미 린
그리고
AS의 글은 ‘방법론으로서의 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아시아를 방법론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인식의 지평이 열리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에킨 키 찰스와
응우옌 트린 티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작가는 공동체를 감각하고 기억하며, 전통과 규율, 감각의 위계를 다시 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의 돌봄의 사유를 보여줍니다.
게시야다 시레가르는 인도네시아의 굿키친의 사례를 바탕으로, 협업 노동을 의미하는 커르자 바크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진의 감정에 대해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들기를 지속하게 하는 힘에 관해 고찰합니다. 이처럼 AIC가 호출하는 아시아란 스스로의 위치에서부터 공동에 관한 지식을 발명하는 감각적이고 윤리적인 현장입니다.
이 관점은
유간타르와
한옥희에게서 다시 한번 구체화됩니다. 인도의 실험영화 집단 유간타르는 여성 미술가의 비가시성과 성차별적인 제도의 처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하며 공동으로 미술을 제작했습니다. 남성중심주의적인 제도에 균열을 내는 언어와 방법론은 한옥희의 용감한 실험성과 맞닿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필리핀의 카시불란을 이끌었던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와
이솜이의 대화를 독해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애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그 유효성을 여전히 실험, 증명하고 싶은 영역일 것입니다. 그 바람은
무니페리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는 칠선녀를 찾아 떠난 홍콩 답사기를 통해 쉬이 가시화되지 않지만 우리 곁에 실재하며 잔존하는 믿음에 관한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이는
쉔신의 영상에서 여러 겹의 소리와 이미지를 통해 끊임없이 어긋나고 겹쳐지는 감각으로 은유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생각들은 미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상호 배움으로 전제하며, 관계 맺음을 통해 미학적이고도 정치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사이먼 순은 선택과 배제라는 큐레토리얼 지식 체계에 관해 성찰하며, 큐레토리얼 진정성이 발현될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작가들과 시간을 나누며 쌓인 존중의 마음, 그리고 전시를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상상하는 방식으로 비롯된
조이 버트의 우정 실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승아는 AIC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이론가, 작가, 미술 동료의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며, 인용으로 연결되는 관계 맺기를 제안합니다. 그 안에 삽입된
이빈소연의 영상은 이 방법론에 응답해, 차학경을 받아쓰기하며 매듭처럼 연결되어 있는 미술적 우정을 보여줍니다. 우정의 방법론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들으며 서로를 통해 비추어 지고 다시 포개어지는
아프사×다브라에게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사유들의 다발은
OTP를 통해 그래픽 언어로 옮겨졌습니다. 변환되며 연쇄되는 심볼은 방법론으로서의 아시아를 상징합니다. 나타남과 사라짐이 깜빡이며 이어지는 가운데, 어디로 도달할 지 모르는 신비한 여정을 암시합니다. 구동된 웹사이트는 마주침과 동행, 대화를 서사화하는 장치로, 수직 수평 운동처럼 느껴지지만 마치 구체 안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멀고도 아득히 느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혼연함으로 가득찬 공간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이해할 것 같은 순간을 홀연히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합적인 일일 것입니다.
AIC(Asian Institutional Critique) is a curatorial project that critically examines art institutions through Asia as a methodology. Acknowledging that we have thus far failed to care attentively for the agents involved in artworks and institutional systems, AIC focuses on Asian practitioners whose artistic practices pursue political and performative approaches to reconfigure institutions, categories, and communities in alternative ways.
The first key theme of AIC is “Asia as Methodology.” Here, Asia is not an essence or a fixed identity, but a question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knowledge is constructed. It is a concept that is continuously deferred and constantly in tension. Therefore, AIC does not seek to assign a single, definitive meaning to Asia. Instead, it seeks to create an epistemological framework that can function, however briefly, through concrete and specific cases. This approach reflects an attitude: a modest ethics that honors relationships and meanings that are continuously reconfigured within particular times and places.
This naturally leads to AIC’s second key theme: criticality. The criticality AIC pursues is not a logic aimed at replacing existing institutions or established art histories. Rather, it is a tool for understanding the forces at play within systems already in operation, and for cultivating critical imagination from within those conditions. The aesthetic and political power of institutional critique emerges from a willingness to care for the by-products often overlooked or abandoned in the process of artistic creation. From this attentive and compassionate stance, we can uncover the potential for art to transform the landscape of perception and thought.
The writings of
Sun Ge & Aimee Linand
ASprovide insights into what it means to approach Asia as a methodology. They reveal the epistemic horizons that open up and the forms of imagination that become possible when Asia is engaged in this way. This inquiry continues in the videos by
Ekin Kee Charlesand
Nguyễn Trinh Thi, both of whom explore care-based thinking rooted in the communities they inhabit. Drawing on the example of Gudkitchen in Indonesia,
Gesyada Siregarreflects on the emotional exhaustion that inevitably accompanies collaborative labor—Kerja Bakti—and considers the sustaining forces that enable people to keep creating together despite it all. In this sense, the “Asia” invoked by
AICfunctions as a sensory and ethical site, where knowledge of the communal is actively invented from one's own situated perspective.
This perspective is further articulated in the works of
Yugantarand
Han Okhi. The Indian experimental film collective Yugantar created art collaboratively, asking how to respond to the invisibility of women artists and the discriminatory practices embedded in patriarchal institutions. Their language and methods—cracking open male-dominated systems—resonate with the bold experimental spirit explored by Han Okhi. Along this trajectory, we can also consider the conversation between
Imelda Cajipe Endaya, who led the Philippine women's collective Kasibulan, and
Somi Lee. The trust and affection among women that Kasibulan embodied remains a field that contemporary women continue to explore, test, and affirm for its ongoing relevance. This exploration extends to
Mooni Perry, who, through her account of traveling in Hong Kong in search of the "Seven Fairies," reflects on beliefs that, though not easily visible, persist quietly alongside us. A similar sensibility is expressed in
Shen Xin's video, where layers of sound and image metaphorically convey an experience that continually slips away, never fully arriving.
These reflections are grounded in the premise that the process of making art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mutual learning, raising a central question: Can aesthetic and political practices be cultivated through the act of forming relationships?
Simon Soonreflects on professional ethics through the curatorial mechanisms of selection and exclusion, anticipating the moment when curatorial sincerity might fully manifest. This anticipation finds resonance in
Zoe Butt's practice of friendship—rooted in respect, in spending time with artists, and in imagining exhibitions not as fixed outcomes but as ongoing processes.
Seunga Youactively invokes the thinkers, artists, and colleagues whose ideas shaped the making of
AIC, proposing citation-as-connection as a practice in itself. Responding to this methodology,
Leebin Soyeon's video illustrates an artistic friendship woven like a knot, created through the act of transcribing Theresa Hak Kyung Cha. This approach to friendship extends further in the video by
AFSAR×DAVRA, where personal experiences are shared, listened to, and reflected upon, layering through one another to create a collective, resonant dialogue.
These clusters of ideas were translated into a graphic language through
OTP. The continually transforming and cascading symbols evoke Asia-as-method, a methodology formed through layers, overlaps, and slippages. The activated website functions as a device that narrativizes encounters, companionship, and conversation. Though its motion feels vertical and horizontal, it also gives the impression of being inside a sphere. This metaphorically suggests a belief that we are continuously linked to one another, slipping and connecting in an ongoing flow. Therefore, if—amid these stories of people who seem distant and almost unreachable, within this space filled with fluid entanglements—you suddenly experience a moment where everything appears to come into understanding, it would not be coincidental, but rather entirely coherent.
원리로서의 아시아 Asia as Principle
I. 아시아란 무엇인가?
에이미 린아시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지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나요?
쑨거 물론입니다. 아시아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지리적 구획을 넘어, 정치적·역사적·지리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는 ‘정치·역사 지리학(political historical geography)’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문화적·역사적 문제들이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맥락 속에서 논의됩니다. 아시아 역시 그러한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도(風土, fūdo) — 즉, 지역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풍토의 특성입니다.
에이미 린후도(fūdo)란 무엇인가요?
쑨거 후도는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공간이 지닌 자연 지리적 특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활동과 결합되어 인간의 정신적 삶 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그것을 후도라고 부릅니다. (후도(Fūdo, Fengtu)는 일본 철학자 와쓰지 테츠로(和辻哲郎, 1889–1960)가 저서 『후도: 인간학적 고찰』(1935)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문자 그대로 ‘바람과 땅’을 뜻하며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시아라는 개념 역시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역사적·정신적 문화가 자리하는 하나의 자연지리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신적 산물들은 언제나 이러한 특정한 공간의 맥락 속에서 논의됩니다.
에이미 린‘아시아’라는 이름은 본래 외부인들이 특정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혹은 ‘아시아라는 개념’은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쑨거 근대 이전까지 ‘아시아’라는 개념은 주관적 정체성을 내포하지 않았지만, 20세기에 들어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이 용어가 아시아 소아시아(Anatolia)만을 의미했던 시기부터 20세기 초 유럽이 세계를 식민지화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아시아 담론은 일관되게 아시아를 유럽의 ‘타자(other)’로 상정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는 그 ‘타자’가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였으나, 근대에 들어서는 비교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의 이데올로기는 아시아를 대등한 주체로, 혹은 상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 가능성의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럽 내부에서 아시아를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은 여전히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라는 개념이 정치적 상징으로 전환되는, 보다 광범위한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시아는 더 이상 서구가 만든 개념으로만 규정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의 전환은 1955년 반둥 회의(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비동맹 운동의 전신 회의)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아시아 담론이 변화해 온 과정 중 하나의 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20세기에 들어 일부 아시아 사회에서 ‘아시아’라는 개념이 정치적 주체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담론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은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는 1904–1905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 전쟁을 인종 간의 전쟁으로 인식했고,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긴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 혁명가 쑨원(Sun Yat-sen)은 수에즈 운하를 여행하던 중 한 아랍인이 자신에게 일본인이냐고 물었던 경험을 회상합니다. 당시 아랍인들은 동아시아와의 연대감을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러일전쟁은 그들에게 동아시아를 ‘황인종 세계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식 아시아주의가 전쟁과 함께 확산되었고, 그 전쟁 방식이 유럽의 식민주의를 답습했다는 점은 비극적입니다. 결국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진정한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유럽주의의 변형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유럽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침략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 방식은 초기 유럽 식민주의의 틀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주의가 아시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얼굴을 가진 복합적인 사상이며, 그 사이에는 긴장과 모순이 공존합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말하자면, 19세기 후반부터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서구가 부여한 ‘타자’적 문화 상징을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서구가 정의한 ‘아시아’의 개념은 20세기 이후 아시아인들이 ‘아시아’를 주체적으로 사용하게 된 맥락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습니다.
에이미 린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라는 개념의 의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쑨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라는 개념은 반둥 회의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즉 두 대륙의 탈식민 독립운동과 긴밀히 연결되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시아 정체성의 핵심은 국가 단위의 독립과 해방 운동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아시아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정치 단위로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 주체성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이 직간접적인 식민 지배를 경험했기에, 이러한 차별과 굴욕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는 1950년대에 강력한 연대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에는 최소 세 가지 주요 문명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쉽게 통합될 수 없는 여러 종교 전통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둥 회의는 1950년대 아시아 전역에 ‘아시아’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연대와 통합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각국이 독립과 주권을 획득하면서 아시아의 의미와 그 내부의 관계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 린 대략 언제쯤부터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쑨거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대륙 전체가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어떻게 근대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발전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서구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1970년대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아시아는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BRICS)와 같은 새로운 연대체들은 아시아가 국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재편해하는 상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시아가 여전히 지리적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강조하거나 독립적인 단위로서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의 6자회담은 아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협상에 두 개의 비(非)아시아 국가 즉,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했지만, 그 사실을 낯설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아시아는 여전히 구체적인 현실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시아는 여전히 다른 지역의 수많은 요구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1950년대 반둥 회의로 상징되었던 아시아의 연대는 오늘날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 원리로서의 아시아
에이미 린 그렇다면 아시아는 지리적 공간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군요.
쑨거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논의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아시아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정치적·역사적·정신적 문화를 아우르는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적 활동을, 그리고 사회적·예술적 활동이 지닌 후도(fūdo)적 성격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아시아를 일련의 원리로 사유하며, 논의를 재구성하고 다시 서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린 당신은 이전에 ‘아시아는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리로서의 아시아’라고 할 때는 꽤 새로운 개념처럼 들립니다.
쑨거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단계에 이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아시아 담론은 여전히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시아가 고유한 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서구 담론의 틀 속에서 단지 분석의 재료로 소비될 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서구 학계와 중국 학계 모두에서 그렇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적 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적 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시아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적 원리란 유럽적, 아프리카적, 라틴아메리카적 원리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하는 일은 서구에 맞서거나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지적 시도가 아닙니다.
에이미 린 원리로서의 아시아를 논하기에 앞서 묻고 싶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아시아의 정체성, 혹은 아시아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쑨거 예술과 문화는 정신적 에너지에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외부로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죠. 예술은 관찰을 통해 얻은 감각적 경험을 시각적, 청각적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접해온 동아시아의 미술,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의 주류는 전반적으로 서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아시아적 특수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이미 린 즉, 그 근거에는 이른바 아시아적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고, 무의식적으로 서구의 방법이나 관점을 차용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쑨거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이모우(Zhang Yimou)입니다. 그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이른바 ‘중국적 표현’은 사실 할리우드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된 연출입니다. 물론 장이모우처럼 표피적인 접근을 넘어 보다 주체적으로 아시아적 요소를 탐구하려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그리고 큐레이터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서구 중심의 관점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동시대 예술가나 큐레이터의 사고 속에는 ‘근대성’이라는 관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대성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오늘날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흐름이며,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서구로부터 스며든 결과이므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시아적 요소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주변부의 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으며 세심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 지점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이미 린 말씀하신 문화 활동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쑨거일본의 극작가 사쿠라이 다이조(Sakurai Daizo)의 텐트 극장(Tent Theatre)을 그 예로 들 수 있어요. 그의 공연은 일본의 평범한 서민층, 특히 하층 계급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삼으며, 매우 일본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사쿠라이는 탁월한 상상력을 지닌 예술가이지만, 그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의 수는 아직 많지 않은 듯해요. 그럼에도 그의 공연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형식의 새로움 덕분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담고 있는 아시아적 요소들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 광주에서의 판화 활동과, 오키나와의 사진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미야코 제도에서는 매년 2월 열리는 제의를 기록하는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는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매우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개념이나 해석에 기대지 않는 진정한 토착적 예술과 문학 활동은 여전히 널리 알려지거나 공유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술적 원천들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미 린 어쩌면 그 이유는 현대 미술을 인정하고 유통하는 메커니즘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체계 속에 있는 이들은 이러한 예술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쑨거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과 성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는 단지 아시아인들만의 과제로 국한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서구 지식인의 지위와 역할, 더 나아가 서구 세계 전체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적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아시아인이든 서구인이든, ‘근대성’이나 ‘탈근대성’이라는 기존 담론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이의 경험이 보다 새롭고 깊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과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린 일부 서구인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 정체성을 깊고 다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특징에만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른 문화를 형식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쑨거 분명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이해 부족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서구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제 막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 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서유럽과 북미의 지식인들은 아시아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언어의 장벽 때문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에이미 린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일종의 고립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쑨거 이는 최근 정치와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오랫동안 유리한 위치에서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문화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에 대해 진정한 인식과 감수성을 지닌 서구의 문화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이미 린 정말 드문 경우군요.
쑨거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제를 논할 때, 서유럽과 북미의 지식인들은 먼저 근대성, 탈근대성, 합리성, 개인의 권리, 과학주의, 진화론 등 몇 가지 개념적 틀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틀은 근대 유럽의 견고한 문화 구조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며, 서구의 지식인들은 이 체계 안에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러한 전통적 사고 체계를 공유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동양과 마주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접한 대부분의 서구 지식인들은 낯선 경험을 마주하면 그것을 자신이 익숙한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주저하면서도 그 틀로 해석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이미 린 그렇게 보면 ‘원리로서의 아시아’ 필요성이 명확해집니다. 서구 지식인들에게도 그것은 거대한 도전이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쑨거 맞습니다. ‘원리로서의 아시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보편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즉, 모든 지적·정신적 활동은 고유하며, 다시 말해 후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이나 북미에서 얻은 부분적인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인류 전체의 보편적 경험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접근은 처음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리로서의 아시아’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과제입니다. 오늘날 아시아를 여전히 유럽적 원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른바 보편적 상상력을 동원해 아시아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시아 속에서 근대성을 찾고,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태도는 서구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이미 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받은 교육과 학문적 훈련을 통해 사고의 방식이 이미 서구화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체적·감각적 경험은 이러한 정신적 체계를 넘어섭니다.
쑨거 이러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아시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이동성, 더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이주 노동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각 사회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는 일입니다. 이는 긍정이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이자 지적 탐구의 영역입니다. 저는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적·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적 원리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 아시아적 원리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것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의 공존을 전제로 한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미 린 물리적 현상이란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후도를 의미하나요?
쑨거네 맞습니다.
III. 아시아 미술을 위한 전제
에이미 린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 미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미술의 이른바 ‘아시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쑨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아시아 미술의 존재가 단순히 가능하다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아 미술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미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특정한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구 미술은 비교적 쉽게 대표적인 학파나 경향을 열거할 수 있지만, 아시아 미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아시아 미술의 특징입니다. 아시아 미술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거나 일차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이미 린아시아 미술에는 그것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특징이 없는 것이군요.
쑨거지난 한두 세기 동안 우리는 서구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어떤 분야를 논할 때 대표자나 중심을 상정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의 중심이 아닌, 다원성을 인식하고 논의하는 습관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미술을 논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미술은 본질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다양한 특수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철학자 천쟈잉(Chen Jiaying)이 제안한 ‘특수(the particular)’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과 그 특성이 결합된 고유한 양상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미술이 무수히 많은 이러한 ‘특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것저것을 모아놓은 집합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면, 아시아 미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특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며, 우리는 이 관계를 아시아적 원리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그 관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특수들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맞닿는 방식 또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럽적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시아 미술은 특수들 간의 관계를 상호 이해, 자기 해방, 그리고 개인의 초월을 통해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기준으로 아시아 미술을 해석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감상 습관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화를 영어로 번역한 뒤, 그 번역을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이미 린아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념 속에는 서구 세계나 그 이론에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요소가 있나요?
쑨거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구의 방법론에 저항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무언가에 맞서는 순간 우리는 곧 그 반대항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에이미 린결국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는 셈이군요.
쑨거맞습니다. 이는 지식 생산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본질적으로 건설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탈근대성(post-modernity)은 근대성(modernity)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시아 역시 서구에 의해 일정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조건입니다. 만약 그런 한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 해방을 이루고자 한다면, 단순한 비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해야 합니다. 핵심은 서구가 아시아에 끼친 영향까지 포함해 스스로의 이해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건설적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시아적 사유와 문화를 확립하려면 구조적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의 지식인들이 취해온 두 가지 방식은 서구를 비판하거나 개혁하려는 접근이었는데, 이 두 방향은 모두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서구의 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들이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서구에 종속되거나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기반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보다 자율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에이미 린아시아라는 관념은 경쟁과 협력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쑨거두 요소가 모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놓고 보면 결국은 경쟁이고, 그 경쟁을 뒷받침하는 협력은 언제나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도 비슷해요. 하지만 문화의 영역, 특히 정신적 창조의 과정은 단순히 경쟁이나 협력이라는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아에서 정신적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훨씬 더 복합적이며, 저는 그것을 ‘매개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이미 린‘매개적’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쑨거제가 말하는 ‘매개적’이란, 상대를 단순히 비교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작업과 정신적 산물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과 창작 동력을 확장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작업을 통해 나의 작업이 자극받고 성장하며, 동시에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주로 물질적 교류의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왔는데, 그것은 제한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더 심화된 차원에서, 즉 정신적이고 상호적인 교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경쟁이나 협력이 아닌, 매개적이고 상호적인(reciprocal)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린올해(2015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예술이나 문화가 이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쑨거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상적으로 문화는 국경을 넘어 국가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언어나 문화적 뿌리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체성을 충분히 성찰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가 국가 간의 긴장과 제약을 넘어 설 수 있으려면, 예술가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성찰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는 더 큰 정체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결여되면 넓은 차원의 정신적 산물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단위를 초월한다고 해서 국가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테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 창작의 근본적인 원천임은 분명하지만, 국가 정체성을 절대적인 전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에는 여러 층위의 깊이가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 정신의 깊은 차원에 닿을 때, 비로소 국적의 틀을 매개로 하면서도 그 너머의 인간적 보편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린 해외에서 활동하는 몇몇 예술가와 큐레이터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어떤 깊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 정체성이나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어디로든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새로운 곳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쑨거좋은 지적이에요. 정체성의 기반이 부재한 예술가에게 미래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IV. 아시아 담론의 생산 플랫폼으로서 현대미술
에이미 린최근 홍콩, 광주, 상하이,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석유 수출국들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기관들이 잇달아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지역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지역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향은 아시아적 정체성 혹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쑨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55년 반둥 회의가 열렸을 당시,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은 오직 정치인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변화는, 여전히 정치인들이 아시아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제는 아시아가 그들에게 더 이상 전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는 당신이 언급한 움직임들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아시아적 주체성의 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여러 층위에서 문화가 주도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다소 망설이며 쓰긴 하지만요.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아시아를 서구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거나, 그저 ‘다채로운 뷔페’처럼 접근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과거의 일본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남아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술계에서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현대미술이 이미 아시아적 원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이는 또한 반둥 회의 시기처럼 국가 단위의 독립운동이 중심이던 정치적 시대에서, 원리와 사유를 탐구하는 문화 중심 시대로의 이행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열리는 수많은 비엔날레들은 겉으로는 ‘아시아’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지역별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대규모 ‘전시 뷔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시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담론의 초점이 지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기도 하지만, 그 차이는 결국 자신이 속한 문화를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유연하게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 초월’의 능력이야말로 아시아적 특성, 즉 ‘아시아다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를 논할 때 우리는 아시아적 원리를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지닌 의미와 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아시아’를 내세운 수많은 전시나 행사가 있지만, 그 안에서 아시아다움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아시아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린제3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각 국가는 제3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죠. 아시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아시아’ 혹은 ‘세계’를 상상하며, 그 중심 안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아 내부의 국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현실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적 맥락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쑨거 이 문제를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타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중국인이지만 중동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각지대는 단순히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관심과 동기의 결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기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오늘날 제3세계의 주류 지식인들을 보면,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지식 체계에 익숙하고 또 그 자료가 충분합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번역된 유럽 고전을 읽고, 토론 자리에서는 그것을 권위 있게 인용하죠.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배워야겠다는 동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사유나 원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무관심이야말로 서구 중심의 지식 구조와 현실 권력 체계가 만들어낸 사각지대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서구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회 또한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지배적 문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사상을 내세우거나 예술가에게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로 이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술의 역할은 문제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회의 특정한 문제를 환기하고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결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한편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성찰의 매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사유의 지평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에이미 린최근 중국, 일본, 한국 간의 예술 교류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외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교류는 제외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관찰자로서 보기에 중국이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무관심한 나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쑨거그 점은 1949년 중국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적 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1958년의 국가 슬로건은 ‘조영간미(超英赶美, 영국을 뛰어넘고 미국을 따라잡자)’였지요. 이는 우리의 적이 서구에서 비롯되었고, 동시에 우리의 근대적 상상력 또한 서구로부터 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은 정치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담론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주요 관심사 또한 유럽과 미국을 비판하거나 대항하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 영역에서의 상상력 역시 서구 중심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아시아적 상상력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순수미술계뿐 아니라 지식 생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즉,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은 일정 부분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큐레이터들이 저를 초청해 ‘아시아’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즉, 이제 예술가들이 이 담론의 전면에 서 있으며, 미술계가 그 변화를 이끄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2015년 8월 5일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며, 중국어 원문은 쑨거와 에이미 린이 편집하고 다니엘 니에가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문본은 2015년 가을호 『아트리뷰 아시아』에 처음 게재되었고, 2023년에 재편집되었습니다. 본 텍스트는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쑨거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중국과 일본의 문학 및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지속해 왔다.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대 중국문학, 일본 근대 사상사, 비교문화연구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나하에서 상하이까지: 위기 상태 속 삶』(2020), 『아시아를 찾아서: 세계를 아는 또 다른 방식』(2019), 『역사와 인간: 보편주의에 대한 성찰』(2018), 『사상사 속 일본과 중국』(2017), 『왜 동아시아를 말해야 하는가: 상황 속의 정치와 역사』(2011), 『문학적 위치: 마루야마 마사오의 딜레마』(2009), 『타케우치 요시미의 역설』(2005), 『만연하는 주체성의 공간: 담론적 아시아의 딜레마』(2002), 『아시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2001) 등이 있다.
에이미 린은 상하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작가, 비평가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비교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LEAP》의 창간 편집장(2010–2012), 《ArtReview Asia》의 공동 창간자이자 편집장(2013–2019), 그리고 베이징 롱마치 스페이스(Long March Space)의 디렉터(2019–2021)를 역임했다. 현재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School of Visual Arts)의 그레이터 차이나(Greater China) 대표로 재직하며, 중국과 뉴욕을 오가며 활동한다.
I. What does Asia mean?
AIMEE LINWhat does Asia mean? Does it possess meaning beyond its geographical connotations?
SUN GEOf course. Asia is more than a spatial concept, which is to say, it is more than a geographical concept, and it is also more than a political-historical-geographical concept. In academia, there is now a field called political historical geography in which various political, cultural and historical ques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where they happened. Asia is indeed a compound concept of politics, history and geography, but in addition to that, I believe it has an important alternative function, one that is often overlooked: its spiritual fūdo character.
AIMEE LINWhat is fūdo?
SUN GE Fūdo refers to the natural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a given region or geographical space. The combin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with the particular spiritual life of people via social activities is called fūdo. [Fūdo, or Fengtu, is a term used by Japanese philosopher Tetsuro Watsuji (1889–1960) in Fūdo: ningen-gakuteki kōsatsu (1935), translated in English as Climate and Culture (1961). The term signifies ‘wind and earth… the natural environment of a given land’.] So the concept of Asia is at the very least a particular natural geographical space that bears the weight of political, historical and spiritual culture produced by human activity within it. The various spiritual products of society and the humanities a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a particular space.
AIMEE LIN‘Asia’ was originally a name that outsiders used for a specific geographical space. Does Asia, or the concept of Asia, mean something to the people who live within this space?
SUN GE Prior to modern times, ‘Asia’ did not have any connotations of subjective identification, but in the twentieth century that changed. From the Crusades, when the term referred only to Asia Minor (Anatolia), until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as Europe gradually subjected the world to colonialism, the Asia discourse of the West was consistently one in which Asia served as Europe’s ‘other’. During the powerful classical period of the Islamic world, this ‘other’ was a formidable foe. In modern times, this ‘other’ has become a source of comparison – evidence against the predominance of European culture.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European ideology did not acknowledge that Asia could be an equal counterpart with which mutual understanding was possible. Even then, such a relationship was merely a possibility. And to this day, this possibility remains relatively marginal in Europe.
As for Asia, it was not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at a relatively widespread trend emerged in which the meaning of ‘Asia’ was reversed in order to connote a subjectively identified political symbol. At that point, one could no longer say that Asia was merely a concept created by the West. This change in the symbol was marked by the Bandung Conference of 1955 [the meeting of African and Asian states that anticipated the formation of the Non-Aligned Movement of countries]. Of course, that was just one phase of its evolution. In terms of major historical trends, the general development of the Asia discourse began in the twentieth century as ‘Asia’ was transformed into a symbol of self-identification in some societies in the Asia region. Japan was the first place where this self-identification occurred. The growth of Asianism in Japan reached its peak with Japan’s victory in the 1904–5 Japanese–Russian War. The Japanese saw this war as a war between races: a victory of the yellow race over the white race. In his speech on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1905], [Chinese revolutionary] Sun Yat-sen recounted how, on his boat trip on the Suez Canal, an Arab asked him if he was Japanese. At that time, Arabs rarely expressed their sense of solidarity with East Asia, but the Japanese–Russian War had contributed to Arabian identification with Asia as part of the yellow race. The unfortunate thing is that Japanese Asianism accompanied war, and their methods of war were imitations of European colonial methods. So Japan’s path was not one of genuine Asianism; it was a path of Europeanism. This Europeanism was most typically exemplified by the Second World War and Japan’s invasion of East and Southeast Asia. Japan’s colonialism, along with its methods of advancing the war, was completely in the mould of early European colonialism.
Therefore, if it can be said that Asianism exists in Asia, then this Asianism has many faces, and tension exists between them. But we can say without value judgement that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trend emerged in which several different parts of Asia, in many different forms, began to cast off the cultural symbols of the Western ‘other’ and adopt subjective symbols of self-identification. It was a historical trend, and so the earlier period of history in which ‘Asia’ was named by the West cannot be used to explain the use of the nomenclature of Asia by Asian people after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AIMEE LINThen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meaning of this idea of Asia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SUN GE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is idea of Asia was used at the Bandung Conference in the context of Afro-Asia – ie, Africa and Asia – and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of the two continents. At that point, a core aspect of Asian identity was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at the state level. During the process of Asia’s rise during the 1950s, the principle significance of Asia as a political unit was political subjectivity. Other than Japan, the vast majority of Asian regions had experienced either direct or indirect colonisation. In this context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feeling humiliated, Asia experienced a sharp surge in solidarity in the 1950s. Asia is not like Europe in that it cannot be roughly integrated on the basis of a single religion. There are at least three major civilisations in Asia, and more than three main religions that cannot be easily integrated. However, the Bandung Conference symbolised a period of integration during the 1950s in which the concept of Asia was spread vigorously through virtually the entire region. As these states gained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so the situation changed.
AIMEE LIN Roughly when did that happen?
SUN GE I would say it happened as the Cold War structure began to disintegrate. Asia began to split up during the 1970s, because at the time the entire continent was facing a developmental problem: how to achieve modernisation. The result was all sorts of dialogu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the West. Thus, after the 1970s, a new round of colonialism began, but this time in an invisible form.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the early 1990s, Asia was faced with the question of forming new alliances. So new coalitions, like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or the BRICS countries, are in fact symbols of Asia’s reorganis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se circumstances we discover that Asia is already incapable of acting, in terms of geography, as an independent unit in order to emphasise its identity. For example, the Six Party Talks in Northeast Asia are a major thing for Asia, but nobody raises an eyebrow at the participation of two non-Asian state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States had already completed its internalisation in Asia, and especially in East Asia. These circumstances have led some people to say that Asia has not been established as a reality.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Asia does indeed seem unable to cast off the countless claims of other regions. The solidarity of the 1950s symbolised by the Bandung Conference has indeed disintegrated.
II. Asia as Principle
AIMEE LIN So the integration of Asia as a geographical space was not achieved.
SUN GE That’s right. But if we recall our initial discussion, we said that Asia is more than a geographical concept. It is also an amalgamation of political, historical and spiritual culture. It symbolises people’s spiritual activities, and the fūdocharacter of soci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this sense, I believe that today we have reached a stage in with we can reorganise and rephrase the discussion by treating Asia as a set of principles.
AIMEE LIN You have previously written about the question ‘how does Asia mean?’ But it sounds quite new when you mention ‘Asia as principle’.
SUN GEI reached this step quite recently. In my opinion, the present Asia discourse is still off the mark. If Asia does not have its own principles, then it truly is no more than field material within the framework of Western discourse. To date, that is how Asia has been treated in Western and Chinese scholarship, but I believe that we should now produce Asian principles. However, producing Asian principles is not only for the benefit of Asian people. I think it is a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benefit of humankind. Asian principles are simply principles that are relative to Europe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principles. The discussion of them is not an intellectual activity intended to resist or replace the West.
AIMEE LIN Before we start discussing Asia as principle, I want to ask you: do art or culture play a role of shaping the identity of Asia or the idea of Asia?
SUN GE Art and culture give form to spiritual energy. The spiritual activities of humans must have form before they can present themselves to us. Art utilises the form of direct observation to communicate this spiritual information. I can say that, to date, the art I have been exposed to, such as the fine arts, theatre and film from East Asia, are Westernised in the mainstream. Their Asian-ness is insufficient.
AIMEE LIN Are you saying that the reasoning behind it lacks that awareness of so-called Asian subjectivity, and it unconsciously uses Western methods or Western perspectives?
SUN GE Yes, it uses Western perspectives. The most typical example is Zhang Yimou: all of the expressions of Chinese-ness in his films are intended to cater to the requirements of Hollywood. Of course, there are other ambitious artists who are not as superficial as Zhang Yimou. They are more inclined to seek an Asian element, but these artists, including art curators, have an essentially Western field of vision. For example, one deeply rooted idea in the minds of contemporary artists and curators is modernity. If you do not let them talk about modernity, they basically cannot function. This is a trend that exists today, and I do not believe that it should be negated, because in a certain sense it expresses the consequences of Western infiltration of all of Asia, from politics and economics to culture. But in fact, there are fring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which comparatively Asian elements are developing. This development requires nourishment, but I believe that Asian intellectuals seem to have not yet reached this point. It requires a process.
AIMEE LIN Can you give an example of the cultural activities you mentioned?
SUN GEOne example is the Japanese playwright Sakurai Daizo. His Tent Theatre is extremely Japanese. The performances draw on the lives of ordinary, lower-class Japanese people. It is a very special artform. Sakurai is very imaginative, but the number of intellectuals who can appreciate his Tent Theatre is limited. Yet Sakurai has received acclaim throughout East Asia. Young intellectuals are especially fond of his plays because his methods are very fresh. But the Asian element that he contains must evolve. Another example is the printmaking activities in the Korean city of Gwangju. There are also some artistic activities in Okinawa, such as photography. That area retains its original religion, which resembles shamanism. There is a photographer who photographs a sacrificial ritual that takes place every February in the Miyako Islands [the largest archipelago in Okinawa Prefecture]. But this kind of genuinely indigenous artistic or literary activity that does not utilise Western concepts and hermeneutics is to date very difficult to circulate and share widely. This is a basic fact, but this wellspring possesses powerful vitality. It will not disappear.
AIMEE LIN Perhaps the explanation lies in the mechanisms of acknowledgment and circulation in contemporary art. After all, the people within these mechanisms have no ability to see and understand this kind of art.
SUN GE I think this is a matter that requires a bit more time, and moreover, it is not just a matter for Asian people to resolve.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Western intelligentsia, or one could even say the entire Western world, changes. The Western intelligentsia’s conception of Asia is also changing. I think that ambitious intellectuals, whether they are Asian or Western, will not be satisfied solely with questions of so-called modernity and postmodernity when the reality of our lives is so diverse and abundant. The day will come when everybody’s experience will be fresher and more abundant. In this sense, art and culture can play an extremely important role, but to this point, they have really not done much.
AIMEE LINThere are some Westerners who believe that the language barrier is the reason that Western people define Asian identity through culture. They can only mechanically imagine other cultures. What do you think of this opinion?
SUN GE I think it is definitely one factor, but it does not tell the whole stor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sia in the West is in a certain sense due to the excessive autonomy of the West, which has only just begun to change. When Westerners begin asking this kind of question, it demonstrates that they have begun to recognise the problem. Yet to this day, the majority of Wester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intellectuals lack genuine curiosity about Asia, and the reason for this is certainly not the language barrier.
AIMEE LIN Is it a kind of insularity in their own cultures?
SUN GE That goes together with the historical trends in politics and economics of recent times: the West going forth to conquer the whole world from an advantageous position. Culture cannot be separated from politics and economics, even though they each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Cultural people in the West with a genuine awareness of Asia are definitely on the fringes.
AIMEE LINThere are very few.
SUN GE But I believe there are some. When I discuss the China question with Wester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intellectuals, they first trot out a few frameworks, such as modernity, postmodernity, rationality, individual rights, scientism and evolution. All of these frameworks in fact constitute the quite mature cultural structure of modern Europe, and Western intellectuals have been instructed within this cultural system to see them as normal. But the question is, what do they do when they are faced with the East, which does not share these traditions but only imports parts of those elements (from those frameworks)? It seems that every Western intellectual I encounter always tries hard to take whatever unfamiliar experience he or she witnesses and hesitantly cram it into these frameworks, and use them to interpret it.
AIMEE LIN When you put it that way, the necessity of Asia as principle becomes apparent, because to them as well this is a huge challenge, a very difficult task.
SUN GE Yes. ‘Asia as principle’ is not an empty phrase. It means that we must redefine what is universal. We must start from this perspective: any intellectual or spiritual activity is endemic, ie, governed by fūdo. This means that you cannot take your European or North American partial experience to other regions and treat it as a global experience shared by all humankind. This kind of approach should be negated right from the start. This is the demand that Asia as principle makes of humanity. At present, if you view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principles, then you will use an allegedly universal imagination to view Asia. So you will search for modernity in Asia, and search for scientific rationality. It is not just Westerners who do this. Asian people also do this.
AIMEE LINThat is because in our minds we have already become like them due to our education and academic training. But our lives, and our physical and sensory experiences, go beyond that mental aspect.
SUN GE Everybody with this kind of educational background has trouble interpreting the change that is occurring in the various Asian societies. For example, how should we interpret the present high degree of mobility, or more specifically, the massive phenomenon of migrant labour in Chinese society? The point is not to give a basis of legitimacy to the existence of every society. This is a kind of intellectual work, so it is not about affirming or negating. What we want to do is to understand. I do not make ar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history, this issue is extremely pressing. This is what compels us to discuss Asian principles. I think Asian principles in their most simplified form are a universalism based on the premise of the coexistence of a diverse plurality of physical phenomena.
AIMEE LINWhen you say physical phenomena, is that the fūdo you mentioned?
SUN GE That’s right.
III. The Prerequisite for Asian Art
AIMEE LINFrom your perspective as a scholar, is there such a thing that can be called Asian art, and if so, what constitutes the so-called Asian-ness of this art?
SUN GEThis is truly a big question. First of all, I think the existence of Asian art is not only possible but necessary. However, the existence of Asian art is definitely a diverse existence. So when we talk about Asian art, the prerequisite is that it does not have representatives. We cannot say that Western art has definite representatives – in fact it is very easy to name several different schools of Western contemporary art. I believe that Asian art is the same. But there is also a way in which it differs from Western art, in that there is no ‘primariness’ that encompasses Asian art.
AIMEE LINIt has no unifying characteristic.
SUN GEThat’s right. Over at least the last one or two centuries of forceful moulding by the West, we have become accustomed when discussing a given field to identify a representative and talk about their primariness. What we should do now is discuss the plurality of a field, but people have not yet formed this habit. This is the prerequisite for discussing Asian art. The reason we need this prerequisite is because Asian art cannot be unified. It is varied and plural. The Chinese philosopher Chen Jiaying has proposed the terminology of ‘the particular’, which emphasises the combination of the individual and the characteristic. I think Asian art comprises countless particulars, but what we want to talk about is not a buffet. If it is a buffet, then Asian art does not exist, because it is too dispersed. There are relations between the particulars, and we must use Asian principles to interpret these relations. What is the meaning of these relations? Well, the various particulars are absolutely not the same, and the ways in which they coincide with each other are also not uniform. In establishing these relations between particulars, there is no good and bad. This idea does not comport with European principles. Asian art takes form when we have the goal of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 particular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self-liberation and through the individual’s transcendence. This is related to the need for us to change our practice of appreciating Asian art on the basis of Europea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ur current custom of appreciation is to first translate our culture into English, and then use it to enter other cultures.
AIMEE LINAre there some aspects of this idea of Asia that contradict or oppose the Western world and its theories?
SUN GEYes, but I think that point is not so important. Opposing the methods of the West has been necessary thus far, but as soon as you oppose something, you become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your opposition.
AIMEE LINYou are ‘countered’.
SUN GEYes, which means that this part of the production of knowledge is transitionary, and not particularly constructive. For example, postmodernity is restricted by modernity, so it cannot be free. Asia is restricted by the West: an unavoidable historical fact. If you want to work towards genuine self-liberation from this state of being restricted by the West, I think criticism is ineffective. You must relativise the West, not negate it. The crucial thing is to build our own framework of understanding and organisation that includes the effects of the Western infiltration of Asia. Negating and opposing the West has no constructive function. The establishment of Asian thought and culture requires structural construction. At present, two relatively familiar methods of Eastern intellectuals are those of critiquing the West and reforming the West. These two modes are both significant, and they are both closely linked to the West itself. But I believe that they are transitionary. They form the foundation on which we must engage in our own construction, unrestricted by the West and not predicated on opposition to the West. We must imagine more freely and build more autonomously.
AIMEE LIN Is this idea of Asia driven by competition and opposition, or by cooperation?
SUN GEA little bit of each. If we’re talking about the economy, then it is definitel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hich serves the needs of competition, is always provisional. Politics is similar. But I think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a difficult terminology to use to understand the realm of culture, and particularly the creation of spiritual products. In fact, I think the creation of spiritual products in Asia is intermediary.
AIMEE LINWhat do you mean by intermediary?
SUN GE I mean that I treat my counterpart as a medium, and draw on their work and their spiritual production to fuel my own imagination and creative motivation. Intermediary means that my work is not entirely their work, and their work cannot interpret my work, but if we did not understand each other, then my work would not be the way it is. For example, the spiritual produc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s to date been imagined in an extremely material form, which is a low-level way of thinking. The truth is that we should take the next step, into a field of greater q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should be intermediary, or reciprocal, which is neither competition nor cooperation.
AIMEE LINThis year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Historical factors have created an extremely powerful state of psychological tension between, for example, South Korea and Japan, and China and Japan as well, which has still not dissipated. Can art or culture, through certain means, dissipate this tension?
SUN GEThere are several ways to look at this. Ideally, culture will transcend borders, and in this way it can dispel the imagined opposition between different societies created by national tension – for in fact this opposition exists only in the imagination. But the truth is not that simple. When cultural workers do their thinking and creating, it is their mother tongue that determines their identity. The vast majority of cultural people rarely reflect on this self-identification. If culture is to transcend the tense mentality between nations, then cultural people must first reflect on the very presupposition of their self-identification, and then form an identity for themselves that is greater than their national unit. I believe that people who cannot transcend this specific unit cannot create truly world-class spiritual products. This is not to say that if you transcend your national unit then you have no nationality. No, what I want to emphasise is that of one’s fixed cultural characteristics, one’s mother tongue, is certainly a fundamental source of one’s creative practice, but one need not treat one’s nationality as an absolute presupposition. I believe that there are various levels of depths in cultural identity. If a cultural identity reaches the depth of human spirit, it will reflect it [human spirit] by means of nationality, while resisting an abstract, general expression.
AIMEE LIN I am reminded of certain artists and curators who live abroad. They can freely travel to the most distant parts of the world, but their spirituality seems somewhat lacking. Once a person completely ceases to believe in nationality or their original culture, they may be able to depart a place, but they ultimately never arrive at a new place.
SUN GEYes, I think that is very accurate. Artists with no roots have no prospects.
IV. Contemporary Art as the Production Platform of Asia Discourses
AIMEE LINRecently, new cultural and art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Hong Kong, Gwangju, Shanghai, Singapore and the oil-exporting states in the Middle East. They all proclaim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their position on a regional scale. Together, they appear to present the formation of a regional field of vision. What effect does this trend have on our Asian-ness or our self-identification as Asian people?
SUN GE This is a very encouraging phenomenon, because when the Bandung Conference was convened in 1955, the only people talking about Asia were politicians. Today, the biggest change is that our politicians are still talking about Asia, but Asia is no longer a presupposition for them. But to people in the worlds of art and culture, this trend you mention is a symbolic change that represents the imagination of Asia and the formation of its subjectivity, guided by the cultural world at different levels of society – although I use that word reluctantly. Some people who do academic research are still content to treat Asia as either a field for the West or a big buffet. As for China, it is treated by some intellectuals as a representative of Asia, just like Japan was previously. So when the artworld invites me to talk about Asia, I recognise that contemporary art has already become an important platform for the production of Asian principles. It also symbolises the transition from the politics-driven period of the Bandung Conference, where the subject was Asian independence movements at the state level, to a culture-driven period in which we search for principles.
The various biennials in the region may take place in Asia, but the content of the exhibitions are basically a big buffet of their own region. In a lot of places, when they say Asia, they are really talking about themselves. Sometimes they switch to talking about Asia,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t lies in whether or not you are able to deeply explore the principles of your own culture, and if you are, whether or not you are able to use open, principled, relativised methods to transcend yourself. The ability to transcend the self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sian-ness. When you discuss a local culture, you can take the approach of Asian principles. This culture of yours can possess Asian-ness, and you can use the approach of Asian principles to address your local issues, which are otherwise merely a particular situation. So I don’t think the question of being a particular region is that important. The crucial thing is how you do it. Conversely, we see many events with ‘Asia’ in their title that assemble large quantities of Asian things to exhibit, but the Asian-ness of these events is in fact quite shallow. But regardless, I think it is an important phenomenon that Asia is now obtaining attention.
AIMEE LINOn the subject of the Third World, you once said that each state’s understanding of the centre of the Third World is different. When we discuss Asia, we face the impulse of different states to establish a world or an Asia in which they are at the centre. In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many blind spots in how states within Asia relate to and acknowledge each other. Each of us inhabits a specific reality and culture, and we require an operational solution to overcoming these blind spots in our fields of vision. If we can do that, then we can see and understand the regional situations within Asia.
SUN GE To elaborate on that point, I would say that the problem can be identified. In what circumstances should we seek to understand ‘the other’? For example, though I am a Chinese person, I have the desire to understand the Middle East. The blind spot is a problem of motivation, not a problem of knowledge. Where does this motivation come from? We can see that most intellectuals in the Third World today, particularly in the mainstream, have quite complete repositories of European and American knowledge. Even if they do not speak English, they read the European classics in translation, and quote them authoritatively in discussions. But they have no interest in Africa, no motivation. They think it is a place that does not produce ideas or principles. This kind of blind spot is the result of the prevailing Western-centric power structure of knowledge and reality. Moreover, whenever a new nation-state is formed, it reproduces this paradigm. So you cannot locate this problem solely in the West. All of the societies of Asia are like this. They put themselves at the centre and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dominant culture. To an extent, this situation will be resolved by history.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rely on artists to guide us through by emphasising certain ideas – that is useless.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limitation of the effectiveness. Artists can do some work, for example urging people to resolve certain problems in Chinese society. But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not easy to identify. Accessing the resources of other regions of Asia can be very helpful if they can be transformed into the intermediary of reflection, and will naturally lead to new ideas.
AIMEE LINI have recently been observing artistic exchanges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not including art programmes sponsored by government cultural or diplomatic initiatives). As an observer, I sense that China is the state that least cares about other Asian states. How do you view this issue?
SUN GEI think there is some truth to your observ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anxiety that has afflicted the entire state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49. In 1958, the national slogan was chao ying gan mei: ‘Surpass England and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This was because our enemies came from the West, which was also the source of our modernised imagination. Once the state had been established and society began to develop, that is to say, during the reform period that followed the Cultural Revolution, the political modes inherited by the intellectual class were transformed into cultural modes. So you see our leading intellectuals are those who studi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ir discourse is essentially an English-based discourse. Their only contribution is either to critique or to refor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Given this framework, our imagin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cultural field essentially runs on a Western track. As a consequence of these circumstances, the present effort to develop an Asian imagination is a nascent one. This fact influences the fine-arts world as well as other fields that overlap with the intellectual world. There is a certain historical logic to our neglect of other Asian states, of our neighbours, but that is not a justification. Now, things are beginning to change. In recent years, curators are always dragging me out to talk about Asia, which has led me to recognise what I just mentioned: cultural people have moved to the front. The artworld has moved to the front.
Interviewed on 5 August 2015, the Chinese text was proved and edited by Sun Ge and Aimee Lin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y Daniel Nieh. The English text was first published in the Autumn 2015 issue of ArtReview Asia and re-edited in 2023. Use of the text is for non-profit purposes only.
Interested in the issue of East Asia from early on, Sun Ge has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iteratures and philosophies of China and Japan across the boundaries of academic disciplines and departments. Her fields of interest include modern Chinese literature, the history of modern Japanese thought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Her major works include How Does Asia Mean?(2001), Space of Pervasive Subjectivities: The Dilemma of Discursive Asia(2002), The Paradox of Takeuchi Yoshimi(2005), The Literary Position: Masao Maruyama’s Dilemma(2009), Why Shall We Talk About East Asia: Politics and History in Situation(2011), Japan and China in History of Thought(2017), History and Humanity: Reflection on Universalism(2018), In Search of Asia: Another Way of Knowing the World(2019), From Naha to Shanghai: Living in Critical State(2020)
Aimee Lin is a curator, writer and critic based in Shanghai. Master of Comparative Literature from Fudan University, Shanghai. Formerly founding editor of LEAP(2010-2012), co-founder and the Editor of ArtReview Asia (2013-2019), and Director of Long March Space, Beijing (2019-2021). Lin currently works as the Greater China Representative of the School of Visual Arts, for which she travels between China and New York.
“어떠한 제한도, 또 안 된다는 금지도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제한도, 또 안 된다는 금지도 없어요”1, 하지만….
여러 아시아 미술계의 서로 다른 여러 당신께,
우리는 몇 년간 동남아시아를 ‘남동아시아’로 줄곧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는 우선적으로, 언어 제국주의와 서구 조형 언어의 이식이 남긴, 흔적을 지닌 미술과 자료가 흡수되는 과정을 살피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줄곧 자국과 타국의 시각문화에 내재한 목적성과 이를 꾸리는 사유가 생산 주체별로 상이했음을 이해하려 했고, 2020년대의 연구자와 비평가의 시각은 어떠해야 할지를 토론했습니다. 더불어 AIC의 토대가 되기도 한 쑨거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서구 근대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지적 저항과 대안을 마련할 아시아의 지대 중 하나인 남동아시아를 적극 탐색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 등은 복합적인 언어 번역과 사고 체계가 작동하는 사유 공간입니다. 특히 20세기 미술을 들여다보면 남한과 남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 역사, 국가주의와 개발주의에 관한 공통 감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때론 유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유별한 시점에 따른 작품들을 표출해 왔습니다.
미술계 일원들이 내부적으로 주도한 남동아시아 미술은 줄곧 서로에게 우호적인 교류와 공동체적 창작의 모델이 되어왔으며, 동시에 의도적으로 은폐된 기억의 연결과 회복의 양태를 드러내 왔습니다. 물론 그 결괏값 모두를 긍정하기엔 불가능한 지점도 존재하나, 우리는 복잡다단한 검열의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주제 의식을 드러낸 미술 앞에서 보편성과 지역적 사유라는 특수성의 공존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아시아 미술’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오역하기’를 일삼다 보니, 남한에서 함께 획일적 집체교육을 받은 또래 연구자의 부름에 응답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초여름, 우리는 승아에게 동시대 아시아, 특히 남동아시아 미술이 ‘미술로서’ 존재하려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역사·정치·경제·젠더·계급의 문제와 변동성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태국의 제도와 작품 그리고 기존에 발행된 텍스트를 독해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왜 태국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이 주창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의 유령이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시각문화에 잔존함을 살폈던 2024년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에 기반한 허구적 프레임을 미적 경험의 한 양태로 정착시킨 일본이, 그들의 식민 체계에서 ‘장자’로 여겼던 태국의 시공에서 배태된 미술의 양상이 궁금했습니다.2 태국의 예술 생산 조건이 여타 남동아시아 국가들과도 상이하다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절대 왕정,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근대화를 반영하는 미술을요. 동시에 지금까지의 ‘태국 미술’이 어떠한 관점으로 읽혀왔는지를 되짚었습니다.3 예를 들어 우리는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1961~)를 ‘관계의 미학’을 대표하는 외국 작가로만 대했던 사실(심지어 작가가 관객과 그린 카레를 나누지만)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곧바로 물질적인 ‘태국’을 떠올리지 못했던 까닭은 작가의 실천이 남동아시아라는 형이하(形而下)적 맥락으로 읽힌 것이 아니라, 서구 큐레이터의 담론으로 개념화된 미술로서 한국에 수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작가의 작업이 자전적 특색과 음식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선택 했음에도, 우리는 이를 동시대 서양 미술을 구성하는 하나의 예시로 인식해왔음을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라는 실체를 탐색하고자 착수한 원거리에서의 ‘읽기와 질문하기’는 물리적 발디딤, 즉 ‘내가 머무는 땅과 나의 사유가 같은 곳에 있으며, 이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자각과 함께합니다. 1990년대생 연구자로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물리적 한계를 인지했고, 타자의 형상을 온·오프라인 리서치로 이해하거나 메타비평을 시도해 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은 우리가 모르는 대상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넘겨짚지 않는 것, 쉽게 동일시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러므로 다양한 매질과 물음으로 상대를 새로이 알아갈 것이란 규칙으로 이끌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AIC가 제시한 “행위 주체와 어떻게 더 감성적인 ‘돌봄’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장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역사 해석의 충돌이 지속되는 태국의 현대미술사를 분석할 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 방콕 중심의 다층적 검열, 불교문화의 도상과 상투적인 주제를 반복하는 경향 등 태국 미술이 동시대적 공동체의 상상력을 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복수의 ‘그것’을 무시하거나 차치한 채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가? 남동아시아 예술, 특히 태국 미술의 어떤 요인을 작품이 ‘순수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가?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겠지만, 동시대 태국 시각문화의 일면에 관한 해답을 주었던 데이비드 테(David Teh)의 여러 글 가운데, 우리는 「순회적 영화: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의 사회적 초현실주의(Itinerant Cinema: The Social Surrealism of Apichatpong Weerasethakul)」로부터 길어 올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실파콘 중심적인 미술(Fine Art)을 비판하고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외부의 치앙마이와 북부 지역에서 등장한 대안적 성격의 미술, 그리고 이후 태국의 면모를 독자적으로 재현해 온 무빙이미지, 그중에서도 영화를 다룹니다.4 그 속에서 우리는 1955년 찟 푸미삭(Jit Phumisak, 1930-1966)이 주창한 ‘삶을 위한 예술’ 개념과 순턴푸(Sunthorn Phu, 1786–1855)와 같은 걸출한 작가들이 써온 태국의 전통 시 장르인 ‘니랏(Nirat, นิราศ)’ 형식의 호응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배움을 넘어 그 형식과 내용을 차용해 지금, 당신께 편지를 띄웁니다. 태국으로부터 발원한 글과 이미지를 남한에서 독해한 후, 동료들과 함께한 공부의 여정과 감정적 경험을 그러모아 당신께 전해드리기에도 탁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이 서간이 상호 배움을 통한 지식 생산, 콜렉티비즘, 자기이론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리고, 물론, 이 편지로 우리가 성급하게 태국 미술과 초국가적 미술계에 보편화된 연대 의식을 피상적으로 엮어보려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모국어도, 우리의 지대와 의식도, 주어진 연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기에 섣부른 긍정으로 이 편지를 결론지으려 덤비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 공동체의 지향을 하나로 봉합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와 먼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리는 동시대 태국의 예술과 무빙 이미지가 보편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모호함 속으로 숨는 듯한 인상을 자주 받았기 때문입니다.5 다만 당신께 말을 걸면서 태국 미술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각과 세대별 관점의 간극을 좁혀가고 싶습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우리가 주목한 것은 태국의 몸체에서 자라난 물건들과 이야기가 고착된 사진, 그리고 시간성으로 전위된 무빙이미지였습니다. 이는 그것이 실제의 시간과 비례하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독립성 확보를 일정하게 행해온 장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기예나 도상적 전통보다 작품 제작 의도에 과도하게 편중해 장르를 편식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부적으로 전략적 ‘절충’이 중시되어 온 ‘태국이라는 사유 공간’의 실체를 언어로 굴릴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외부적 검열과 내부적인 냉소 또는 비판적 관점이 한 작품 안에서 ‘내부 필터’로 작동하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작품의 면모는 분명 질료와 연출로부터 촉발되기에 흥미롭지만, 주제가 우회적으로만 펼쳐지기에 한국 관객으로서는 작품의 태도가 다소 수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례로, 사리나 사타폰(Sareena Sattapon, 1992~)의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You and Me and Everyone We Have Met)〉(2024)은 거울상으로만 볼 수 있는 무빙이미지로, 한 지점에서 전체를 관찰하거나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식별할 수 없는 표면이 재생되는 모니터를 특수한 유리판으로 비추어야만 우리는 작가가 선별하고 번역한 태국어와 일본어, 영어가 교차하는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라팟 지와랑산(Prapat Jiwarangsan, 1979~)의 2024년 연작 〈기생 가족(Parasite Family)〉, 〈시암 가족의 초상(The portrait of Siamese Family)〉와 같이 기성세대의 사진과 왕권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가일층 직설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작은 조각으로 잘린 인물 사진 더미는 메시지를 일부 분쇄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근과거를 언술하는 아노차 수위차콘퐁(Anocha Suwichakornpong, 1976~)의 작품 〈서사(Narrative)〉(2025)에서도 드러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가 겪어온 폭력과 삭제된 기억의 감각적 복원을 도모하는 이 작품은 2010년 방콕 반정부 시위 이후의 이야기를 소집단의 대화와 제스처로 소조합니다. 관객은 외부와 차단된 것처럼 보이는 세트장에 모인 출연자와 스태프의 반응만으로 15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팩션(faction)을 따라가게 됩니다. 방콕의 풍경과 관련 인물의 소지품, 기억을 구성하는 딸림 자료의 모습은 49분의 영상 후반부에서야 조금씩 드러납니다. 사회 문제에 관한 내부적 인식과 배경이 소거된 시공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대조됩니다. 작품은 예술가가 진술하려는 사건과 사회적 후퇴가 교착되면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현실’을 감지하게 합니다. 동시에 작품은 왕권, 불교, 군부에 저항하면서도 때로 협력해 온 태국 미술인들의 복합적인 입장을 그저 침묵 속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태국이라는 전제 자체를 곱씹게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 전달을 지연시키는 것, 이로써 공동의 사유가 휘발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작가의 선택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 독재, 종교와 사회가 교착된 다른 국가들의 예술과 함께 놓아볼 수 있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근과거를 언술하는 아노차 수위차콘퐁(Anocha Suwichakornpong, 1976~)의 작품 〈서사(Narrative)〉(2025)에서도 드러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가 겪어온 폭력과 삭제된 기억의 감각적 복원을 도모하는 이 작품은 2010년 방콕 반정부 시위 이후의 이야기를 소집단의 대화와 제스처로 소조합니다. 관객은 외부와 차단된 것처럼 보이는 세트장에 모인 출연자와 스태프의 반응만으로 15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팩션(faction)을 따라가게 됩니다. 방콕의 풍경과 관련 인물의 소지품, 기억을 구성하는 딸림 자료의 모습은 49분의 영상 후반부에서야 조금씩 드러납니다. 사회 문제에 관한 내부적 인식과 배경이 소거된 시공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대조됩니다. 작품은 예술가가 진술하려는 사건과 사회적 후퇴가 교착되면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현실’을 감지하게 합니다. 동시에 작품은 왕권, 불교, 군부에 저항하면서도 때로 협력해 온 태국 미술인들의 복합적인 입장을 그저 침묵 속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태국이라는 전제 자체를 곱씹게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 전달을 지연시키는 것, 이로써 공동의 사유가 휘발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작가의 선택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 독재, 종교와 사회가 교착된 다른 국가들의 예술과 함께 놓아볼 수 있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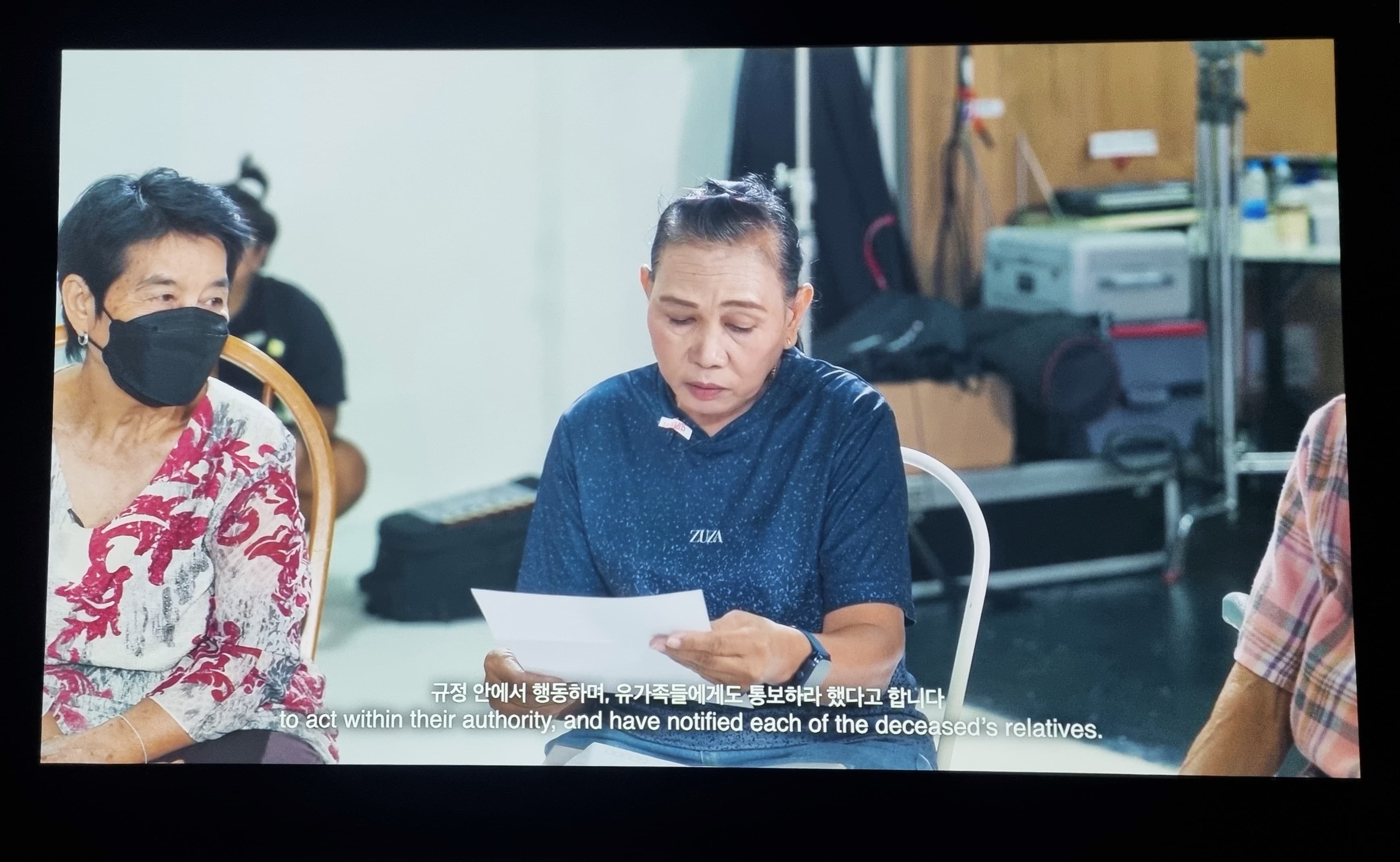

무빙이미지가 동시대 태국 미술의 특색을 글로써 풀어갈 실마리가 되어주었다면, 공동체적 영감을 건네는 또 다른 희소한 모델로는 우머니페스토(Womanifesto)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민족적 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지역을 초월해 대안적인 국제적 연결망을 지속하는 동시에 과거의 자료를 현재에 뿌리내리는 역사적 실례로서 뜻깊습니다. 기득권과 남성 중심적인 남동아시아의 시공 속에서 자신의 미술살이를 나누고 ‘일반적’ 의제의 주변부로 상대화되어 온 공동의 곤경을 논의하는 배움의 장은 현재 우리가 채택해야 할 실천적 방식으로서도 유용합니다. 태국에 위치한 반 우머니페스토(Baan Womanifesto)의 지속은, 그러므로 앞서 반추한 태국의 또 다른 면모를 현시합니다. 쑨거의 언명처럼, 우리가 보편적이라 여기는 이론을 상대화하는 연습을 수행해야하는 세대로서, 대중적인 시각 요소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작가들이 견지한 대안적 의제를 중시하며 미술을 독해할 때, 진정 아시아라는 사유 공간에 관한 다면적 이해와 역설적 면모가 합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께 드리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남한과 다른 이웃 남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탈식민적 궤적을 토대로 전략적 절충주의를 발전시켜 온, 태국이라는 사유 공간에서의 미술이 매개하는 아시아성에 관한 우리의 관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요. 그럼으로써 검열과 집단행동을 비공식적으로 제재해 온 남동아시아의 미술 생산과 수용 갈래를 배수로 늘려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4개월간의 이야기가 태국 미술에 관한 궁금증을 솟아오르게 하고, 보이지 않았던 정보와 감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단초가 되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서울에서, 현아와 혜인.
*이 편지의 바탕이 되어준 추가적인 읽기 목록입니다.
① 순턴푸. 『프라아파이마니』. 김영애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② 씨부라파. 『그림의 이면』. 신근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22.
③ 테, 데이비드. 「작가의 주권에 대하여」. 『이미지 소비시대의 황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9: 69-75.
④ Lara van Meeteren and Bart Wissink. What Should Biennials Do?. Bangkok: Poop Press, 2019.
⑤ Lenzi, Iola. “Beyond Local: Thailand’s Recent Art of Political and Historical Witness.” In Next Move: Contemporary Art from Thailand, 36–45. Singapore: Earl Lu Gallery, LASALLE-SIA College of the Arts, 2003.
⑥ Lenzi, Iola. “History and Memory in Thai Contemporary Art.” C-Arts (London), no. 11–12 (2009): 16–21.
⑦ Teh, David. "The Art of Interruption: Notes on the 5th Bangkok Experimental Film Festival." Theory, Culture & Society 25, no. 7–8 (December 2008): 309–320.
⑧ Teh, David. “Itinerant Cinema: The Social Surrealism of Apichatpong Weerasethakul.” Third Text 25, no. 5 (2011): 595–609.
⑨ Teh, David, et al. Artist-to-Artist: Independent Art Festivals in Chiang Mai 1992–98. London: Afterall Books, 2018.
⑩ Asia Art Archive. Womanifesto Archive. Hong Kong: Asia Art Archive. https://aaa.org.hk/en/collections/search/archive/womanifesto-archive
⑪ Womanifesto. Essays of Womanifesto – An International Art Exchange. https://www.womanifesto.com/essays/
AS는 2023년 조현아와 문혜인이 결성한 스터디 및 큐레토리얼 콜렉티브로, 서구 중심의 제도권 교육에서 누락되어 온 남동아시아 시각예술사를 재서술한다. 이를 위해 AS는 ‘남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서구와 군부, 제도가 구축해온 서사를 우회하며, 남동아시아 시각예술을 읽기, 쓰기, 오역하기, 재생산하기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탐구한다. 또한 근과거의 사회적 시각이 반영된 작품과 기록물을 살피는 프로젝트를 이어 오고 있다.
1 순턴푸, 프라아파이마니, 김영애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83. 인어 낭응악과 결합하기 위해 프라아파이마니가 건넨 말로, “부부가 되는 것은 모든 동물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는 성별 구분이나 소수자성에 구애받지 않는 태국의 성 문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해당 문장이 이득을 얻고자 타자 또는 타국과의 연합과 회유를 지속해온 태국 기득권의 되풀이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도 본다. 결국 낭응악은 “온전한 인간 모습을 한 사내애”를 낳았지만 프라아파이마니는 또 다른 인간 여성에게 구애하고, 이후 혼인한다.
2 일본은 태국의 필요에 의한 우호 관계를 이어온 국가이기에 감성적인 무대로서 묘사될 때가 있다. 씨부라파의 『그림의 이면』은 그 예 중 하나로, 1930년대 후반 태국의 정치적 전환과 구세력과 신세력을 대표하는 인물간 끌림과 결국 합치되지 못한 상황을 드러낸다. 태국 미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에서 유학한 젊은 태국인 남성을 화자로 내세운 소설이 태국 안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은 이유와, 태평양전쟁기 태국의 인식이 동시기 한국이나 인접 국가의 그것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했다. 태국 청년이 일본에서 사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와 사회적 위치를 확립해가는 내용은 1932년 시암 혁명을 통한 입헌군주제로의 전환과 여성으로 표상된, 외부 사회에 노출된 빈도가 적은 기존 세력과 고별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도 해석되어왔다. 『그림의 이면』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동아시아 국가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비균질적인 시각이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며, 시점의 차이를 여전히 발생시키는 예술로서 유효하다.
3 AS(문혜인, 조현아), 유승아의 대화 . 2025년 5월 25일.
4 태국의 영화 및 영상 작가들이 검열의 환경 안에서 사회비판적인 의식을 표하는 시도들과 불안정한 국가적 정치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관해 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화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정제’는 주로 배급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영화 제작자들은 시장 논리에 더 많이 노출된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더 비순응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2025년 9월 8일 조현아의 메일에 답신한 데이비드 테의 메일 내용 중 일부.
5 2008년 제5회 방콕실험영화제(Bangkok Experimental Film Festival) 《변화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The More Things Chang)…》의 큐레이터이기도 했던 데이비드 테는, 필자에게 현시점에서 35세 이하의 예술인 및 영화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세대가 취했던 정치적 입장차를 고려해 보라는 조언과 함께 연대의 형태와 세대별 단절의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기획한 《아시아 민주·인권·평화미술전: 진실 비틀어 보기》에 참여한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는 ‘진보적 미술인’ 수티 쿠나위차야논트(Sutee Kunavichayanont)에 관한 태국 민주주의문화운동가(Thai Cultural activist for Democracy, CAD)의 공개서한과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정치적 단절과 표면적인 연대의식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 제 또래는 정치에 손을 떼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정치적 무능의 악순환이 너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유머, 추상, 혹은 “비정치적인” 척하는 예술을 선호하는 이들에 관한 비판적 시선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주변부의 급진적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고, 그들은 예술에 관해서는 할 말이 적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태국의 진보적인 밀레니얼과Z세대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이들은 군주제 비판에 있어 훨씬 더 강경하고 직설적이에요.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지난 세대 진보주의자들과는 더욱 단절되어 있다고 봐요. 저희 세대는 비판적이긴 했지만 머리로 하는, 때론 냉소적 접근을 했고 저희보다 앞선 세대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칭하며 예술에 일정한 위상과 비판적 ‘자유’를 부여하려 했으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군주주의자였죠. 이들은 1970년 세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태국에 살던 2008년경 혹은 그 이전부터 그러한 계보가 허상임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단절의 연속이 있는 셈입니다. 일종의 범국가적 정치 연대처럼 여겨진 ‘밀크티 연대’에 관한 환호가 있기도 했지만요. … 이런 단절을 알고 나니,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의 문제를 껴안는 것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대 간 소외를 대변하는 건 아닐까요?” 2025년 9월 8일 조현아의 메일에 답신한 데이비드 테의 메일 내용 중 일부.
산마루에서 우리 만나요: 6.0753° N, 116.5588° E Meet Us at the Ridge: 6.0753° N, 116.5588° E (2024),
피스랜드 Peaceland (2024)






에킨 키 찰스, 〈산마루에서 우리 만나요: 6.0753° N, 116.5588° E〉,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9초
* 이 작품은 카다잔두순(Kadazandusun) 전통 희생 제의, 몽구카스(Mongukas)를 기록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현지 동물 보호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 물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과정에서의 혈흔 장면이 있습니다. 관람에 유의를 바랍니다.
에킨 키 찰스, 〈피스랜드〉,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1분 31초
〈산마루에서 우리 만나요: 6.0753° N, 116.5588° E〉와 〈피스랜드〉는 작가가 키마라강(Kimaragang)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어린 두 소녀와 노년의 세 여성을 통해 드러낸 작업입니다. 〈산마루에서 우리 만나요〉에는 카다잔두순(Kadazandusun) 전통의 희생 제의인 몽구카스(Mongukas) 과정에서 도살 당하는 물소의 모습과 산등성이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는 소녀들이 교차합니다. 키마라강 사람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사후에 낙원인 키나발루산(좌표: 6.0753° N, 116.5588° E)으로 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믿음은 어린 소녀들에게 동경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피스랜드〉는 세 친구 레나, 미나, 조니가 한 달치 식료품을 장만하고, 고향을 떠난 레나의 딸을 만나기 위해 불법 트럭을 타고 도시로 향하는 여정을 담습니다. 장난스럽고 생기넘치며, 또 때로는 악동스러운 노년 여성의 모습을 담습니다. 호젓한 어린 소녀들과 호쾌한 할머니들, 어린 나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은유하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관습과 전통, 규율의 개념을 단수형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복수형으로 만듭니다.
Ekin Kee Charles, Meet Us at the Ridge: 6.0753° N, 116.5588° E, 2024,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8min. 9sec.* This work documents the traditional sacrificial ritual of the Kadazandusun people. During the filming process, local animal protection regulations were followed.
* This work contains sensitive content and scenes with blood. Viewer discretion is advised.
Ekin Kee Charles, Peaceland, 2024,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1min. 31sec.
Through the figures of two young girls and three women in their sixties, the works Meet Us at the Ridge: 6.0753° N, 116.5588° E and Peaceland illustrate the complex emotions that artist Ekin Kee Charles experiences as a member of the Kimaragang people. The Kimaragang believe that the souls of the dead face in the direction of Mount Kinabalu (located at 6.0753° N, 116.5588° E), which represents paradise in the afterworld. For the young girls, however, the traditional beliefs of the Kadazan-Dusun are objects of both admiration and fear. The video work juxtaposes the slaughter of water buffaloes and images of girls traveling freely through the mountain ridges with the experience of fear in the depths of a river. The result resembles the way in which life makes a leap forward at the moment of death, fusing and flowing into death in the process. In Peaceland, three friends named Rena, Mina, and Joni buy a month’s worth of food and board an illegal truck on a journey to the city to see Rena’s daughter, who has left her hometown. The elderly women appear playful, vibrant, and sometimes mischievous. Through stories featuring quiet young girls and animated seniors, artist Ekin Kee Charles offers metaphorical representations of her own younger and future selves. In the process, she transforms conventions, traditions, and norms into something plural rather than reducing them to a singular level.
에킨 키 찰스는 카다잔두순 다약(Kadazandusun Dayak) 계통 아래에 속하는 소부족, 키마라강(Kimaragang)족의 후손이다. 에킨은 산악 내륙 지역에서 코타 마루두(Kota Marudu)로 이주해온 가족들이 모여 사는 폐쇄적인 공동체 속에서 성장했다. 에킨의 시각적 표현은 늘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의 시선에서 출발한다. 《Among Us》(타이베이 현대미술관, 2025)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제40회 베를린 인터필름 국제단편영화제(2025), 씨쇼츠 영화제(2025) 등에서 작품을 상영했다.
Ekin Kee Charles is an indigenous filmmaker from Sabah, Malaysia. She is a descendant of the Kimaragang tribe, a sub-tribe from the Kadazandusun Dayak umbrella. Ekin grew up in a closed community that consisted of family members who migrated from the inland mountain area to Kota Marudu, Sabah. Almost instinctively, her visuals often come from an innocent perspective, one that still sees the world with wonder. Ekin Kee Charles held a solo exhibition, Among Us (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 2025), and her works have been screened at the 40th Interfilm Berli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2025), the SeaShorts Film Festival(2025).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Cải tiến Thế giới (How to Improve the World) (2021)






응우옌 트린 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2021, 단채널 비디오, 흑백, 컬러, 사운드, 47분
소리와 이미지 가운데, 이미지를 신뢰한다는 응우옌의 딸과 소리를 믿는다는 토착 공동체의 한 남성.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은 베트남 중앙고원 지역 토착 공동체의 한 남성을 따라, 청각 중심의 문화에서 기억을 만드는 방식을 관찰합니다. 이는 시각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세계와 조금 다릅니다. 응우옌은 말합니다. “세계화되고 서구화된 문화가 시각 매체에 장악되면서, 나는 영화 창작자로서 시각 이미지가 가진 서사적 권력을 저항해야 한다는 필요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계를 감각하는 보다 균형적이고 섬세한 접근—특히 청각적 풍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늘 관심을 가져온 ‘알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접근 불가능한 것, 그리고 가능성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Nguyễn Trinh Thi, Cải tiến Thế giới (How to Improve the World), 2021, single-channel video, B&W, color, sound, 47min.
Nguyễn’s daughter trusts more in images than in sounds, while another member of the indigenous community says that he trusts more in sounds. Cải tiến Thế giới (How to Improve the World) follows a man living in an indigenous community in Vietnam’s Central Highlands as it observes how memories are formed in a hearing-centered culture. The result appears somewhat different from a world that focuses on sight. Nguyễn says, “As our globalised and westernised cultures have come to be dominated by visual media, I feel the need and responsibility as a filmmaker to resist this narrative power of the visual imagery, and look for a more balanced and sensitive approach in perceiving the world by paying more attention to aural landscapes, in line with my interests in the unknown, the invisible, the inaccessible, and in potentialities.”
응우옌 트린 티는 기억의 문제를 매개로 감춰지거나 밀려나고 오해된 역사를 탐구하는 동시에 베트남 사회에서 예술가가 놓인 위치를 비평적으로 성찰해 왔다. 최근에는 소리와 ‘듣기’의 힘에 주목하며, 이미지, 사운드, 공간의 복합적인 관계성을 탐구하고 있다. 도큐멘타 15(2022), 브리즈번 아시아 퍼시픽 현대미술 트리엔날레(2019), 시드니 비엔날레(2018), 리옹 비엔날레(2015),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 트리엔날레(2014)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Nguyễn Trinh Thi centers on the question of memory, through which she critically examines hidden, displaced, and misinterpreted histories, as well as the position of artists within Vietnamese society. In recent years, her practice has expanded to explore the power of sound and listening, and the multilayered relationships between image, sound, and space. Her works have been presented in major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film festivals, including documenta 15(2022), the 9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2019), the 21st Biennale of Sydney(2018), Lyon Biennale(2015), Fukuoka Asian Art Triennale(2014).
굿키친의 커르자 바크티: 협업, 혼돈, 통제, 갈등, 그리고 돌봄을 요리하는 장소 Kerja Bakti in Gudkitchen: A Place to Cook Collaboration, Chaos, Control, Conflict, and Care
커르자 바크티(Kerja Bakti)란 무엇이며,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어 커르자 바크티는 kerja(노동)와 bakti(봉사)가 결합된 표현으로, 일본어 勤労奉仕(kinrōhōshi, 킨로호시, ‘공공노동’ 혹은 문자 그대로 ‘노동 봉사’)에서 유래한 용어다. 이 표현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 봉사나 자원봉사뿐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 없는 노동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위나휴 아다 유니야티(Winahyu Adha Yuniyati)는 “커르자 바크티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1라고 정의한다. 브릴 사전(Brill Lexicon)에서는 이를 “지역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농민들이 수행하는 의무적 공동노동”2 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웬(Bowen)은 “의무적 노동 봉사, 즉 kerja bakti(문자 그대로 ‘자발적 봉사노동’)라고도 불린다”3 고 언급한다. 아구스 수위그뇨(Agus Suwignyo)는 커르자 바크티를 고통 로용(gotong royong)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며, 이를 “경제적·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웃 간에 발휘되는 공동체 정신”4 이라고 설명한다.
나는 커르자 바크티를 교과서를 통해 배우기보다는, 토요일 아침마다 이웃들이 빗자루와 걸레, 손수레를 들고 나와 거리와 도랑을 청소하던 풍경을 통해 배우며 성장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난 뒤 모두가 남아 바닥을 문지르고 책상을 닦는 일을 의미했다. 자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수마트라의 메단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특정 자바어 표현들이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던 수하르토 시대의 유산으로 보인다.
나는 내가 속한 굿스쿨(Gudskul)이 운영하는 이동형 프로젝트, 굿키친의 관계 속에서 커르자 바크티를 떠올리게 되었다. 굿키친은 자카르타, 도큐멘타 15(documenta fifteen)의 룸붕 원(lumbung one), 텐트하우스(Tenthaus)가 기획한 모멘텀 12(MOMENTUM 12), 그리고 파리(Pari)와 아랍 시어터 스튜디오(Arab Theatre Studio)와 함께한 웨스턴 시드니의 룸붕에서 각기 다른 맥락으로 선보여 졌다. 나는 커르자 바크티가 점점 층위를 더하며 정치화되고, 마모되고 있다는 점을 곱씹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 개념이라고 느낀다.
작업이 커르자 바크티의 계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굿키친 또한 동네 청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했다. 배관은 손으로 관리해야 했고, 물은 손수레로 옮겨야 했으며, 예기치 않게 100명의 참가자가 몰린 가라오케 행사가 끝난 뒤에는 수십 개의 접시를 모두 씻어야 했다.









굿스쿨 『하비스트 북』(Gudskul Harvest Book, 2022)은 굿키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굿키친은 우리가 돌봄을 받고, 다시 힘을 얻는 장소였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누군가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재료를 손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지식을 나누고, 음악을 연주하며,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노동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았으며, 언제나 낭만적이지 않았다. 피켓(piket), 즉 청소를 담당자는 상호 책임을 실천하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설거지 책임을 두고 생겨난 눈치싸움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었다. 방문객들 중 일부는 주방을 식당처럼 여기며, 더러운 접시를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치워주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의 노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관을 드러냈다.
룸붕 원과 모멘텀 12에서는 전시장 내부에 기숙사와 거실이 설치되어, 전시 공간이 공동 거주의 장소로 변모했다. 아티스트, 협업자, 방문객들은 함께 자고, 먹고, 토론했다. 전통적인 전시가 관객을 예술적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과 달리, 이 공간에서는 갈등과 돌봄이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다. 하루는 한 예술가가 준비한 인도네시아 음식을 운영자와 기자들이 함께 나누는 점심으로 시작되거나, 목판화 워크숍으로 이어졌다. 이어 정치적 주제로 티타임 토론이 열리기도 했고, 그 사이 몇몇 아티스트가 즉흥적으로 부엌에서 인도네시아 전통 타악기인 타블라를 연주하며 모두의 주의를 흐트러뜨렸다. 이후 새벽 3시까지 모두 함께 취한 채 퀸의 노래를 부르며 가라오케에 온 것처럼 즐겼고, 마지막에는 이곳저곳에 숨겨진 맥주병을 모두가 다함께 치우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여기서 ‘예술’이란 마찰을 통해 맺어진 우정이었다. 공동 노동에서 비롯된 피로, 즉흥적인 식사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문화적 오해에서 생겨난 불편함. 이 모든 경험이 곧 예술이었다.






헙업의 숨은 대가
집단에서, 협업에 대한 공적인 약속은 종종 그 이면의 사적 비용을 감춘다. 그것은 바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정서적 부담이다. 미술의 맥락에서 ‘미술가’는 대체로 주인공처럼 여겨지고, 그들의 작품은 눈에 띄는 결과물로 남아 찬사를 받지만, 돌봄과 조율로 이루어진 기반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사라진다. 커르자 바크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동은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일지라도 실제로는 의무처럼 수행된다.
사회적 규모에서의 예술은 삶과 관계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다.5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관한 제안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여러 층위의 감정노동을 요구한다. 즉각적인 관리 조치, 감정의 중재, 함께 식사를 하는 일, 말없이 이뤄지는 화해 같은 순간들. 이러한 노동은 결과 보고서나 전시 벽면에 기재된 크레딧에 깔끔하게 담기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과 소문으로 남는다. 축제가 끝난 뒤의 탈진, 나누어지지 않은 공로에 대한 서운함, 너무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한 후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온갖 얽힘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은 불가피하다. 굿키친은 애초에 ‘우정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예술, 삶, 공동의 돌봄 사이의 경계를 흐리면서, 굿키친은 공동체 형성을 예술적 결과의 기법이자 의미로 전면화한다. 이 실천은 예술을 하나의 사회적 경험으로 사고하도록 이끈다. 결과물이라기보다 과정에 가깝고, 예술가와 관객, 매체와 메시지, 노동과 진정한 돌봄 사이의 구분을 흐려놓는다. 이는 관계적 인프라로 작동하며, 굿스쿨이 말하듯 친구를 만들고, 친구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조직하는 ‘농크롱 커리큘럼(Nongkrong Curriculum)’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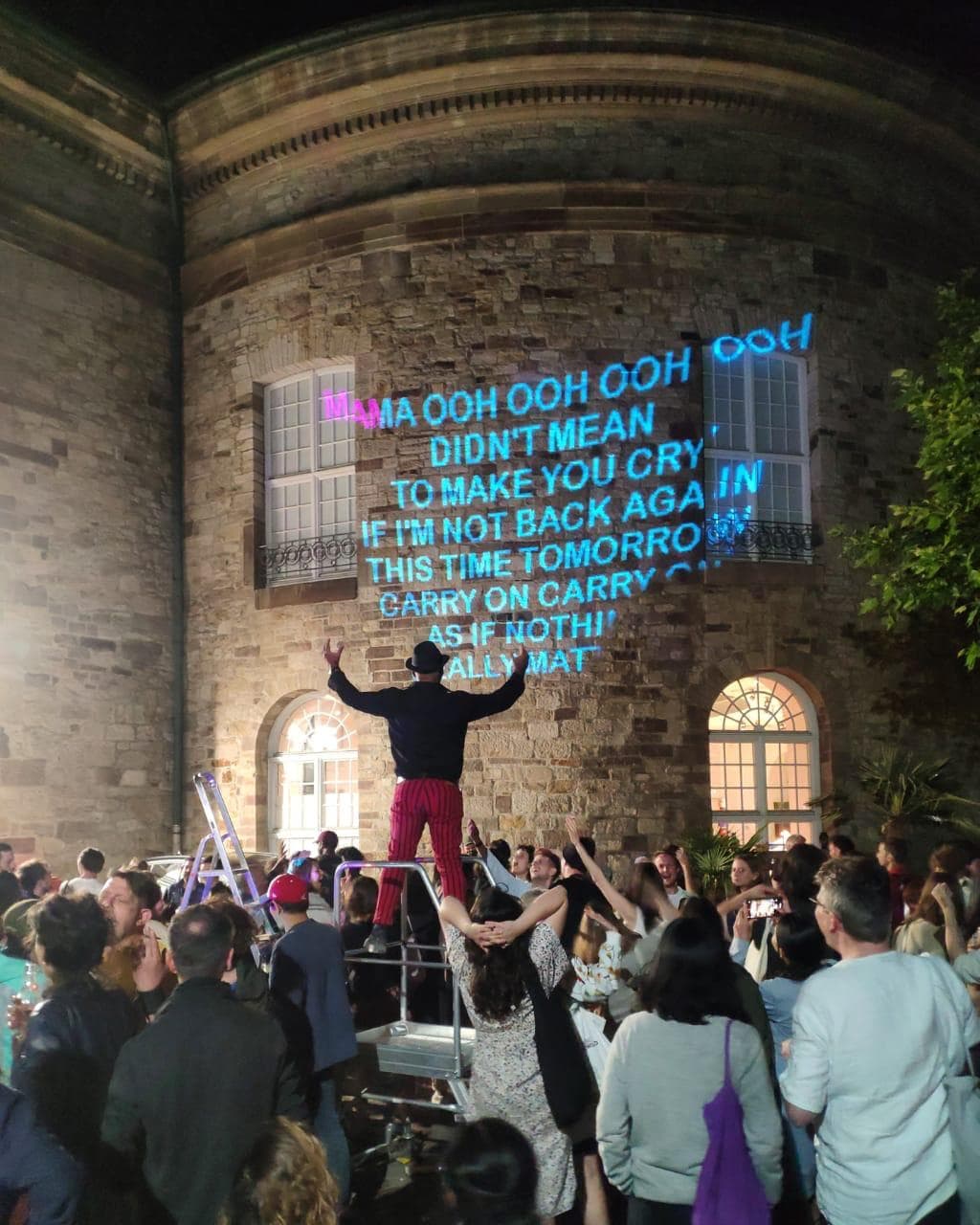




주방에서 발휘되는 공동체적 사고
태넌바움과 살라스는 역량 있는 공동체를 지속적인 성과, 팀의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는 활력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한다.6 그들은 이러한 특성이 공유된 이해, 즉 공동 인식과 상호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비전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
누가 해야 하는가?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업, 규범, 상호의존성
왜 해야 하는가? 근거
누가 알고 있는가? 전문성 (전이적 기억 체계: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
만약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상황 인식
굿키친은 이러한 질문들을 늘 현장에서 마주했다. 막힌 싱크대를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접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정 이후 박물관 보안팀과 협상할 사람은 누구일까? 결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강점과 한계, 정서에 관한 누적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조직행동론을 공부하면서, 나는 확증 편향, 제한된 정보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추정하는 경향, 집단적 사고, 새로운 정보보다 익숙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 도움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집단 심리, 이미 시작한 일을 비합리적이라도 멈추지 못하는 ‘몰입의 오류’에 관해 배웠다.7 그러나 굿키친에서 이 개념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심리학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매일의 노동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감각적으로 체감되는 현실이었다. 한 주 동안 설거지를 못 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절대’ 청소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 모두가 동의하는 듯 보여 잘못된 계획이라도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순간들, 이미 시작했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가는 관성 같은 것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추론 통계학에서는 숫자를 계산할 때조차 불확실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정확한 추론을 위해 데이터가 모델 전반에 걸쳐 일관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다른 집단의 분산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등분산성(homoscedasticity)’과 달리, 잔차(residual)가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은 데이터가 뒤섞인 상황에서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8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의 ‘잔차’는 늘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은 협업의 일부가 되었다. 때로는 비합리성이 오히려 힘이 되기도 했다. 게임이론처럼,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는 기존의 기대를 깨뜨린다. 몇 주 동안 설거지를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접시를 설거지하는 순간, 그 행동은 순식간에 집단의 역학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다.

불투명할 권리
명확한 결과를 요구하는 제도적 기준들과 달리, 굿키친은 에두아르 글리상이 말한 ‘불투명할 권리(right to opacity)’를 실천했다. 모든 관계가 외부의 시선에 이해되거나 해석될 필요는 없었다. 우정은 비공식적이고, 기록되지 않으며, 평가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자라난다. 굿키친의 가치는 완료된 업무를 증명하는 깔끔한 기록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남아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며, 대화를 이어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머물기
커르자 바크티의 목표는 공유되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작동한다. 누군가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는 행위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강제된 노동의 기억을 동반한다. 굿키친의 목표는 어쩌면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처럼 단순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수많은 협상과 즉흥,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사람들을 함께 엮는 돌봄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협업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부엌에 머무는 일이며, 그 이후의 설거지까지 함께하는 일일 테다.
게시야다 시레가르는 미국 필라델피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오가며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교육자, 작가이다. 협업의 예술 실천으로부터 비롯된 경험을 의사결정과학, 조직행동,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루앙루파(ruangrupa), 세룸(Serrum), 그리고 그라피스 후루하라(Grafis Huru Hara)가 공동으로 설립한 예술 콜렉티브 굿스쿨(Gudskul)의 구성원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예술 콜렉티브를 리서치하는 fixer.id의 연구원이다.
1 Winahyu Adha Yuniyati, “PBL Implementation in History Study Groups Integrated With Javanese Culture,”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ICTTE 2017) (Atlantis Press, 2017), 743–47.
2 Henk Schulte Nordholt, Brill Lexicon, s.v. “Kerja Bakti.”
3 D. E. Bowen, “Managing Customers as Human Resources in Service Organiza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25 (1986): 371–83, 549–50.
4 Agus Suwignyo, “Gotong Royong as Social Citizenship in Indonesia, 1940s to 1990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50, no. 3 (2019): 387.
5 Howard S. Becker, Art Worl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6 Scott I. Tannenbaum and Eduardo Salas, Teams That Work: The Seven Drivers of Team Effective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The Seven Drivers of Team Effective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7 Neha Bhatia, Organizational Behavior (cours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24).
What is kerja bakti, especially to translate it to English? Through quick look in wiktionary, in Bahasa Indonesia, kerja bakti combines kerja (“work”) and bakti (“service”), a calque from the Japanese 勤労奉仕 (kinrōhōshi, “public work”, literally “labour service”). It carries multiple shades of meaning: community service, volunteer work, even unpaid corvée labor. As Yuniyati define it, “Kerja bakti is when people reach certain goals with working together.”1 In the Brill lexicon, it is “compulsory communal labour performed by peasants for the benefit of community or state.”2 Bowen calls it “obligatory labor service otherwise called kerja bakti (lit., ‘work in voluntary service’).”3 Suwignyo situates it within gotong royong, “a collective spirit among neighbours to strengthen economic and social resilience.”4
I grew up knowing kerja bakti less from textbooks than from Saturday mornings when neighbours emerged with brooms, mops, and wheelbarrows to clean the street and open sewers. In school, it meant everyone staying after class to scrub floors and wipe desks. Even in Medan, Sumatra, far from the Javanese heartland, the term persisted, likely a legacy of the Suharto era when certain Javanese expressions often became national policy tools.
I got to thinking of kerja bakti in relation to Gudkitchen, a travelling project run by Gudskul, the collective I am part of. We have presented it as the open kitchen in our space in Jakarta, at lumbung one (documenta fifteen), MOMENTUM 12 curated by Tenthaus, and Lumbung in Western Sydney with Pari and Arab Theatre Studio. I was pondering, as the term takes on a layered meaning, politicized, eroded, but I still find it useful.
What happens when an artwork becomes the trigger for kerja bakti? The Gudkitchen, much like a neighbourhood clean-up, demanded cooperation to function: plumbing maintained by hand, water carried in trolleys, dishes washed for dozens after an unplanned karaoke party of 100 people.









The Gudskul Harvest Book (2022) describes it simply:
“The Gudkitchen was the place where we came to be nourished. Day or night, there was always someone cooking, cleaning, cutting, chatting, gossiping, exchanging knowledge, playing music, dancing and singing together.”
The work was constant, often invisible, and not always romantic. Piket, the cleaning roster, became a practice of mutual accountability. Arguments over dish duty were as much about fairness as about hygiene. Visitors sometimes treated the kitchen like a restaurant, leaving dirty dishes to be “taken care of” by invisible laborers, revealing cultural divides in how communal labor is valued.
In lumbung one and MOMENTUM 12 biennale, dormitories and living rooms were installed inside gallery spaces, transforming exhibitions into sites of cohabitation. Artists, collaborators, and visitors slept, ate, and debated together. Unlike traditional exhibitions that distance audiences from artistic labor, these spaces made conflict and care inseparable. A typical day might begin with lunch with art handlers and journalists served by one of the artists who cooked Indonesian food, woodcut workshop, spill into a tea time debate on politics, but get distracted as some artists spontaneously play their tabla drum in the kitchen, continue with drunken collective karaoke until 3 am to Queen’s songs and end with collective clean up to pick up the hidden beer bottles all over the place. These were not as ancillary “outreach” but as the project’s core. Here, the “art” was the friendships forged through friction: the exhaustion of shared chores, the joy of impromptu meals, the discomfort of cultural mistranslation.






The Hidden Costs of Collaboration
In collectives, the public commitment to collaboration often hides the private cost: the mental and emotional strain of managing the work that makes collaboration possible. In art contexts, the “artist” usually wins, with their work remaining the visible, celebrated output, while the infrastructure of care and coordination fades into the background. As in kerja bakti, the labour may be “voluntary” in name but obligatory in practice.
Art at a social scale is a system of recommendations: ways to live, to see, to connect.5 Yet these propositions require layers of affective labor: administrative improvisations, emotional negotiations, shared meals, whispered reconciliations. These do not fit neatly into outcome reports or wall labels. They live in memory, or in gossip: exhaustion after a festival, resentment over unshared credit, regrets over decisions made too quickly, very much like the intrigue we have in life.
This social tension is inevitable, as Gudkitchen is intended as a “friend-making infrastructure.” Blurring boundaries between art, life, and collective care, it foregrounds community-building as both technique and meaning of the artistic outcome. This practice thinks about art as a social experience: less a product than a process, dissolving distinctions between artist and audience, medium and message, labor and genuine care. This serves as relational infrastructures or, as Gudskul frames it, a Nongkrong Curriculum of friend-making, learning from friends, and self-organi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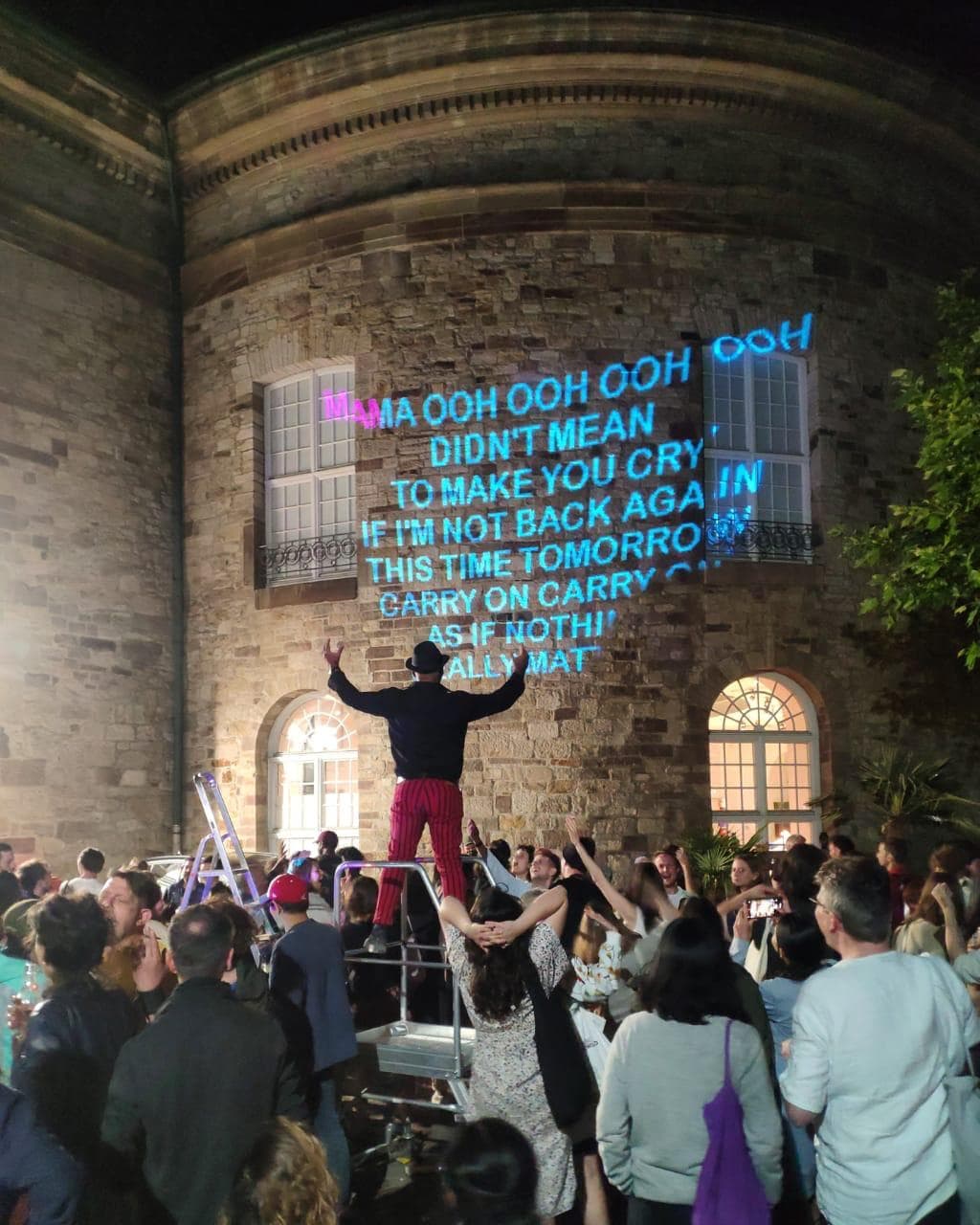




Team Cognition in the Kitchen
Tannenbaum and Salas describe a highly effective team as one with sustained performance, team resilience, and ongoing vitality6 They break this into shared cognition:
Where to? Vision
What’s important? Priorities
Who should? Roles
How to? Tasks, norms, interdependencies
Why to? Rationale
Who knows? Expertise (transactive memory systems: knowing “who knows what” and “who will do what”)
What if? Contingencies
What’s up? Situational awareness
Gudkitchen embodied these questions in real time. Who can fix the clogged sink? Who knows where the plates are stored? Who can negotiate with museum security after midnight? Decisions emerged not from a manual but from accumulated knowledge about each other’s strengths, limits, and moods.
In organizational behavior studies, I learned about confirmation bias, implicit personality theory, groupthink, the common information trap, the bystander effect, and escalation of commitment.7 In Gudkitchen, these were not abstract terms. They were the daily currents: the tendency to assume someone “never” cleans because of one bad week; the reluctance to challenge a bad plan because everyone seemed to agree; the inertia of doing things the hard way because “we have already started.”
Conflict was inevitable, but it was rarely the end. In inferential statistics, even when crunching numbers, statisticians want uncertainty to be consistent. To infer accurately, we want our data to be the same throughout the model to make predictions, but that rarely happens. The concept of homoscedasticity, the assumption that the variances in different groups are similar or equal, sounds neat in theory. Its opposite, heteroscedasticity, where residuals are irregularly distributed, can disrupt judgment when the data is messy.8 In human terms, our “residuals” were messy. Disagreements did not cancel collaboration; they became part of it. Sometimes irrationality, as like in game theory, can even work in your favour. The unpredictable player disrupts expectations, much like the person who suddenly volunteers to wash every dish after weeks of avoidance, changing the group dynamic overnight.

Right to Opacity
Unlike institutions demanding “transparent outcomes,” Gudkitchen embraced what Édouard Glissant called the “right to opacity.” Not every interaction needed to be legible to outsiders. Friendships thrived in the informal, the unrecorded, the unevaluated. The kitchen’s value was not in a clean logbook of duties completed, but in the memories of people who stayed, cooking, cleaning, and talking long after the planned program ended.
Staying Until the Dishes Are Done
In kerja bakti, the goal is shared, but the meanings diverge: for some, it is voluntary mutual aid; for others, it carries the memory of state-mandated labour. In Gudkitchen, the goal might be as simple as feeding everyone, but the process is thick with negotiations, improvisations, and the care work of holding people together through conflict.
Collaboration is not the absence of conflict. It is the practice of staying in the kitchen until everyone has eaten. And doing the dishes.
Gesyada Siregar is a curator, educator and writer based in Philadelphia, USA and Jakarta, Indonesia. A member of Gudskul—an art collective formed by ruangrupa, Serrum, and Grafis Huru Hara—her recent work bridges lived experience in collaborative art practices with research in decision scie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cultural studies. She is a researcher in fixer.id, a study on Indonesian art collectives development.
1 Winahyu Adha Yuniyati, “PBL Implementation in History Study Groups Integrated With Javanese Culture,”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ICTTE 2017) (Atlantis Press, 2017), 743–47.
2 Henk Schulte Nordholt, Brill Lexicon, s.v. “Kerja Bakti.”
3 D. E. Bowen, “Managing Customers as Human Resources in Service Organiza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25 (1986): 371–83, 549–50.
4 Agus Suwignyo, “Gotong Royong as Social Citizenship in Indonesia, 1940s to 1990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50, no. 3 (2019): 387.
5 Howard S. Becker, Art Worl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6 Scott I. Tannenbaum and Eduardo Salas, Teams That Work: The Seven Drivers of Team Effective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The Seven Drivers of Team Effective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7 Neha Bhatia, Organizational Behavior (cours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24).
수데샤 Sudesha (1983)



유간타르, 〈수데샤〉, 198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3분
〈수데샤〉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1970년대 전개된 산림 보존 운동, 치프코 운동 (चिपको आंदोलन , Chipko)의 활동가 수데샤 데비(Sudesha Devi)를 따라갑니다. 이 운동에 가장 상징화된 행동 양식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나무 몸통을 껴안는 행동, 치프코चिपको입니다. 수데샤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며, 나무를 오르고, 쉬는 날에는 동료들과 정치 토론을 합니다. 일상과 정치, 노동과 사유의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지를 때, 그는 감각적인 것—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과 정치적인 것—누가 무엇을 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감각의 질서를 발명하는 행위—의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가 됩니다. 미래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수데샤의 의지는 마치, 달라붙기, 껴안기를 의미하는 단어 치프코 चिपको처럼 이미 망가져버린 미래를 두 팔로 품에 감싸 안아 다시 돌보기 위한 행위와 같습니다.
Yugantar, Sudesha, 1983,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33min.
Sudesha follows an activist in the Chipko movement(चिपको आंदोलन) for forest preservation, which took place in the 1970s in the Himalaya region of northern India. The most symbolic practice in this movement was the act of chipkoचिपको—literally hugging trees in order to protect them. Sudesha’s husband has not returned home, so she takes his place in earning a livelihood, climbing trees, and holding political discussions with colleagues on her days off. As she blithely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the everyday and the political and between labor and contemplation, she becomes a presence who disrupts the order between the sensory—our ways of perceiving and experiencing the world—and the political—the invention of new sensory orders in terms of who can see, speak, and contemplate. As we consider the future as something more deeply connected with matters of caring than with ones of production, Sudesha’s commitment comes to resemble something akin to the word chipkoचिपको, meaning to cling or embrace: an effort to embrace and care once again for a future that has already been destroyed.
유간타르는 딥파 단라즈(Deepa Dhanraj), 아브하 바야(Abha Bhaiya), 나브로즈 컨트랙터(Navroze Contractor), 미라 라오(Meera Rao)가 1980년 결성한 필름 콜렉티브다. 이들은 당시 다큐멘터리 영상에 구조화되어 있는 식민주의적 역사와 남성적 시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영화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여성의 노동 조건과 사회 구조적 폭력을 탐구하고 기록한 〈Molkarin〉(1981), 〈Tambaku Chaakila Oob Aali〉(1982), 〈Idi Katha Maatramena(1983), 〈Sudesha〉(1983) 총 네 편의 영화를 함께 제작했다.
Yugantar is a film collective founded in 1980 by Deepa Dhanraj, Abha Bhaiya, Navroze Contractor, and Meera Rao. Critically reflecting on the colonial histories and patriarchal gazes embedded in documentary filmmaking of the time, they began making films collaboratively. Together, they produced four works that investigate and document women’s working conditions and the structural violence of society: Molkarin(1981), Tambaku Chaakila Oob Aali(1982), Idi Katha Maatramena(1983), and Sudesha(1983).
무제 77-A Untitled 77-A (1977)


한옥희, 〈무제 77-A〉, 1977,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
한옥희의 이미지에는 부정할 수 없는 극강의 생기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미지들과 발설할 수 없는 이미지들, 그러나 끝끝내 말할 수 없는 것이 늘 남는 이미지들. 물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억울한 시체 같은 이미지들. 자르고 또 잘라내고, 거르고 걸러서 만들어진 한 조각의 이미지. 그녀가 택한 “추구에 과격하고 인습의 파괴에 용감함”은 곧 언술 방식을 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제의 해체를 우선 이루고 난 다음에 발명되는 언술이 아니라, 언술의 발명과 동시에 해체될 온갖 체제들. 영상에 비명이 담겨있는 것만 같다고 느끼는 건 착각이 아닐 것입니다.
Han Okhi, Untitled 77-A, 1977,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7min.
The images of Han Okhi carry a vital intensity that is undeniable: images that cannot be withstood or revealed yet that always maintain something that can never be expressed. They are images like the body of an innocent victim suddenly surfacing in the water—fragments of images that have been cut and filtered repeatedly. Her strategy of “aggressive pursuit and bold destruction of conventions” represented the invention of a method of expression—not one invented after first dismantling the patriarchy, but one dreaming of the various institutions that would be dismantled alongside the expression. It would not be incorrect to perceive her video work as capturing a scream.
시를 전공한 한옥희는 1970년대 보수적인 한국의 사회 체제 속 검열과 통제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실험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김점선, 이정희, 한순애와 함께 여성영화인 모임 ‘카이두클럽’을 결성해 여성주의적 시선과 실험적 형식을 결합한 새로운 영화적 언어를 모색했다. 〈구멍〉(1973), 〈밧줄〉(1974), 〈중복〉(1974), 〈색동〉(1976) 등을 연출했다.
Originally trained in poetry, Han Okhi began making experimental films in the 1970s as a way of imagining an escape from the censorship and control embedded in South Korea’s conservative social system. In 1974, she founded the women filmmakers’ collective Kaidu Club with Kim Jeom-seon, Lee Jeong-hee, and Han Soon-ae, seeking a new cinematic language that combined feminist perspectives with experimental form. She directed The Hole(1973), Rope(1974), The Middle Dogs Day (Jungbok)(1974), Colour Of Korea (Saekdong)(1976).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와의 대화 : 필리핀 여성 작가 그룹, ‘카시불란’적 공동체 A Conversation with Imelda Cajipe-Endaya: A ‘Kasibulan’-like community of Filipino women artists

2024년,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Imelda Cajipe-Endaya, 1949-, 이하 ‘이멜다’)를 만났다. 이멜다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기획전,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미술가》의 참여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고, 필리핀미술관으로부터 온 자신의 작업, 〈애도, 해방!〉(1984, Taghoy, Piglas!)을 전시장에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다. 오래전 태어났지만, 수장고에 갇혔던 작품 또한 작가를 조우한 동시에 어떤 상황도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데, 계엄이었다.
〈애도, 해방!〉이 만난 첫 번째 계엄은 작품이 제작된 1984년, 필리핀의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에마누엘 에드랄린 마르코스(Ferdinand Emmanuel Edralin Marcos)에 의해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도 계엄이 선포되면서 이 작품은 두 번째 계엄을 만나게 된다. 나는 〈애도, 해방!〉을 통해 나와 이멜다의 세계가 큰 시차 속에서도 어떤 기시감을 가진 채 평행하고 있다고 느꼈다.
1960년대 격동의 시기에 작업을 시작한 이멜다는 필리핀의 독재정권, 미국 자본주의와 연계된 현실, 여성의 가사 노동과 해외로 수출되는 노동자 등 사회적 현실을 작업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정치 활동과 행정을 포함한 사회참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럿을 곤경에 빠뜨리는, “미술이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비추는 것이 현실의 문제와 어떻게 관계되는가”라는 질문이 1980년대의 이멜다에게도 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이멜다와 동료 여성 작가들이 결성한 그룹, '카시불란(Kasibulan)’1은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카시불란은 사회 변화를 ‘위해’, 미술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할 만큼 미술의 역할에 대한 다소 과격한 입장을 드러냈으나, 실제로 그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미술을 자괴감에 빠뜨렸던 질문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계엄과 민주화 사이의 격변이 이뤄지던 1987년, 카시불란은 미학적 실험이나 페미니즘 어젠다를 심화하기보다 ‘자매결연 위원회’, ‘예술적 성장 위원회’, ‘네트워킹 위원회’ 등 ‘자매애(sisterhood)’를 강조하며 공동체의 지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카시불란에서 전시를 열 때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말에 “있는 작품은 다 전시 할 수 밖에 없었다”2라고 말하는 이멜다의 대답 또한 이러한 관찰을 뒷받침한다. 카시불란 회원들은 뚜렷한 목표 없이도 모여 바느질 하거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전시를 꾸려 시간을 보내는 등 그들에게 미학과 정치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엉덩이를 같은 공간에 대고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타 쾨터(Jutta Koether)는 사람들이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예술을 만드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3 이 대화는 이멜다의 예술을 구성한 여러 층위, 그가 자신을 위치시켰던 가사와 정치, 사회, 우정, 공동체가 각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쫓으려 한다. 무거운 고민에 앞서 우선, 모여서 이야기하기, 먹기, 비평하기, 시위하기, 운영하기, 전시하기, 바느질하기 등 ‘함께하기’가 앞선다. 이와 함께 얽혔을 우정, 사랑, 위로, 불합치, 갈등, 충돌, 기다림, 화해, 만남, 이별의 감각들. 그것들은 각각 하나의 방향성으로 엮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질문을 시작한다.
이솜이당신은 실제 필리핀 미술계의 남녀 성비가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현상을 주목하며, 그 원인이 여성 미술가들이 가사 노동에 속박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80년대 후반, 필리핀에서 계엄이 종식되었을 때, 당신은 첫째 아이를 임신했었다. 한 인터뷰에서 당신 또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 가정에서 고립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정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기존의 사회정치적 헤게모니가 전복되는 전환의 분위기가 당신에게도 큰 원동력을 주었던 것일까.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미술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여성 작가들이 마치 일부만 존재하거나 부재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시월모임, 여성미술연구회, 또하나의 문화 등과 같은 여성 작가 공동체들이 한국의 독재 시기 전후에 있었고, 일부 여성 작가들은 걸개그림, 벽화 작업 등 공동 작업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 후반, 카시불란도 유사한 정치 상황 속에서 함께 벽화를 만드는 등 공동 작업을 전개한다. 한국에서의 걸개그림은 사회적 현실을 강력히 발언하는 작업으로 투쟁이나 시위 등 발언의 현장에서 직접 사용됐지만, 카시불란의 벽화는 극단과 함께 전시되는 등 제작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공동 작업을 이룬 점이 서로 닮은 것 같다. 당신은 실제로 해당 시기를 지났으니,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 1980년대 후반 당시 필리핀 여성 작가들의 위치와 활동 현황은 어땠는지 회고할 수 있겠는가?
이멜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여성 예술가들이 많았지만, 대체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여성 작가들이 답습하거나 정물화나 풍경화만 그리곤 했다. 또 가정에 고립된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의 경우, 임신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작업 활동을 멈추게 하진 않았다. 첫 딸은 수업이나 모임에도 함께 데려갔고, 아이는 늘 한쪽 구석에서 혼자 놀곤 했다. 아이가 두 살쯤 되었을 때는 낮 동안 봐줄 보모를 구했고, 세 살이 되었을 때는 두 명의 보모과 함께 아이 한두 명을 늘 데리고 다녔다. 내가 느끼기로 당시 시위와 행진들은 평화로웠고, 여성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당시의 복잡한 상황(정치 사회적 격변)이 오히려 작업을 더욱 표현적으로 이끌어간 것 같다.
이솜이1986년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 EDSA Revolution)4 당시 당신과 여러 여성 작가가 직접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이하 ‘NCRFW’)에 참석해 필리핀 여성을 위한 정치, 정책적 활동에 실질적으로 지침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실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알려진다. 또 당신은 개인으로서도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여성의 노동, 해외 노동, 이주 실태 등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술 작업과 다소 그 수행의 방식이나 온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창작 활동과 구분되어 실천되었는가?
이멜다 필리핀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재학 당시 학생 활동가(Activist)였다. 시위, 행진, 집회의 최전선에 나섰으나 대학 졸업 2년 후 결혼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내와 엄마로 집에 고립되다시피 살게 되었다. 사회 문제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래 여성 대부분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1975년 약 2주간 멕시코에서 열린 유엔이 주최의 첫 번째 여성 국제회의, ‘UN 제1차 여성 회의’(The First World Conference on Women)에 필리핀의 운동가이자 행정가인 레메디오스 리켄(Remedios Rikken)이 참석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회의는 남성이 주도했던 실정이었으나, 1986년 2월의 민중 혁명 이후 리켄이 NCRFW(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필리핀 여성 개발 포럼(The Philippine Development Forum for Women)이 주최되었다. 포럼은 타가이타이(Tagaytay)에 위치한 필리핀 개발 아카데미(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에서 합숙 컨퍼런스 형식으로 열렸는데, 목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나의 틀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기회의 평등’, 둘째는 ‘접근의 평등’, 셋째는 ‘결과의 평등’이었다. 1987년, NCRFW 위원장인 리켄이 우리에게 예술가들을 불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달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브렌다 파하르도, 안나 페르가 ‘필리핀 발전 계획에 대한 여성 협의 회의’(the consultation conference on women for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들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었다.
과거의 NCRFW는 현재 ‘필리핀여성위원회’(The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 이하 ‘PCW’)5이며,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필리핀의 대표 정책 조정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여성 헌장’(The Magna Carta of Women, 법률 제9710호)의 실행을 주도하고, 국가 발전의 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 각종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기관들의 성평등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이솜이1987년, 38세였던 당신은 그룹 카시불란을 동료들과 함께 결성했다. 그룹을 결성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다. ‘카시불란 운영위원회’는 그룹 이름이 ‘자매회’라고 비유되기도 할 만큼 무엇보다 회원들의 우정을 도모하는 활동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이를 ‘카시불란’적인 공동체라고 비유하고 싶다. 조직 차원에서 우정을 운영하고 돌보는 것은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그리고 그 실천이 실제로 우정을 지속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지 궁금하다.
이멜다 여성 작가들은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미술 창작 활동을 활용하고자 카시불란을 조직했다. 창립 멤버들은 정치적 권한 부여 문제와 필리핀의 문화유산에 열망을 가진 활동가들이었다. 우리는 예술 창작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고자 했다. 여성 노동에 관한 벽화를 공동 제작하고, 그것으로 연극 〈크라이 오브 아시아〉(Cry of Asia, 1988)와 함께 순회 전시하기도 했다.
전시로는 1989년 필리핀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여성 주술사》(Ang Babaylan), 1990년 필리핀문화센터(CCP)에서 열린 《전통 직조/ 현대 직조》(Sinaunang Habi / Makabagong Habi), 1991년 CCP에서의 《여성》(Ang Babae), 1992년 나용 필리피노에서의 《의식의 성장》(Sibol ng Kamalayan), 1993년 ≪리잘 공원에서의 어머니 자연≫(Inang Kalikasan), 같은 해 CCP에서 열린 ≪필리핀 여성: 이주 노동자》(Filipina: Migranteng Manggagawa)가 있다. 이 외에도 1997년 필리핀대학교 바르가스 미술관에서 열린 《삶의 조각 잇기: 카시불란 예술에 바치는 경의》(Tahi-Tagning Talambuhay: Isang Pagpupugay sa Sining ng Kasibulan), 2004년 CCP에서의 《balaybay@kasibulan.net》, 2014년 글로리에타/존타 마카티에서 열린 《힐롬: 여성 폭력 종식》(Hilom: End Violence Against Women) 등이 있다.
또 우리는 각종 연구 및 조사를 전개해 필리핀 예술계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의 강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여성 예술가들의 경력이 남성 예술가보다 지연되는 현실을 파악했다. 또, 전통적 예술 조직이 남성 구성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기 위해 여성의 노동에 빚지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했다.
한편, 질문처럼 우정과 자매애는 카시불란에서 늘 주요하게 작동했다. 공통점과 차이점까지도 편안히 논의할 수 있었고, 우리는 늘 다음 만남을 고대하곤 했다.
Kasibulan, balaybay@kasibulan.net. Source(link)
이솜이실제로 카시불란은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가?
이멜다 카시불란은 지역 및 세계의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룹 전시, 설치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지금도 여성 예술인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강연을 열고 있다. 그룹 구성원 또는 초청 작가들이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해 자기표현 능력을 발전시키기를 돕기 위해서다. 특히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여름 워크숍에서는 신입 및 젊은 회원들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작업을 연구하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여성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이슈를 다루는 강연을 주최해, 구성원들이 예술 외적인 영역에서도 삶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도 진행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창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와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기도 한다. 단체와 회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아트 바자 및 창의적인 프로젝트들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솜이카시불란은 “필리핀 여성의 진정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쫓는다고 말해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1980년-1990년대 당시 카시불란이 찾아 나섰던 진정한 정체성과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또 이에 대한 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멜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1980–90년대 당시 문화 노동자와 예술가들에게는 필리핀 토착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토착 신화와 전설 속 여성 인물이나 영웅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고, 나는 늘 바바일란(babaylan) 이미지를 탐구했다. 바바일란은 가족과 공동체, 자연환경을 돌보는데, 이는 창조주 마이카팔(Maykapal)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기도 한다. 한편, 당시 작가들은 개별 작품을 만들면서도, 전시에서는 서로의 작품들을 이어 붙이는(stitch) 방식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다.

이솜이한 인터뷰에서 카시불란 작가들이 가사활동으로부터 영향받아 작업이 '일종의 취미'처럼 변모하게 되었다고 회고한 부분을 보았다. 당신의 작업에서도 가사 노동의 기호들이 직접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 가사가 작업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당신은 가정에서 역할과 개인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나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사유인 것 같다. 이들은 서로 어떻게 엮이며 하나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느꼈는가?
이멜다 나에게는 멀티태스킹이 일상이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와 집을 돌보는 일이 분리되지 않은 채 늘 함께 이루어졌다. 카시불란에서 우리는 같은 상황과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었다.

이솜이카시불란의 운영위원회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에게 다섯 명 정도의 다른 동료를 초대해 올 것을 권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카시불란은 공동체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카시불란이 남긴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공동체는 어쩌면 서로 어떤 의제를 확인하기보다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이멜다 카시불란은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주목한 것이 맞다. 개인으로서는 창작 시간을 희생해 단체 활동에 시간을 쏟아야 했기에 조직의 규모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조직에는 보통 6~10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전시 때는 30~4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 불합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화를 열어 서로의 차이를 풀어갔다.
이솜이카시불란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로부터 연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이멜다 창립 멤버 중에서는 줄리 루크와 나만 카시불란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의 역할은 지원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손녀 세대의 여성 예술가들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보람차다. 현재 카시불란은 정기 모임과 프로젝트, 전시를 이어가며, 각자 자유롭게 개인 작업도 전개하고 있다. 창립 당시 세운 비전과 자매애가 카시불란을 여전히 묶어 주고 있다고 느낀다.
이솜이당신이 한 인터뷰에서 타자와 나 사이의 공동의 자아 개념인 ‘카푸와’(Kapwa)6가 필리핀 여성들에게 내재되어있다고 말한 점이 무척 인상 깊다. 스스로뿐 아니라, 모두의 정의와 주변의 콜렉티브를 돌볼 것을 권한 점도 카푸와와 상통할 것이다. 이렇듯 당신은 필리핀 페미니즘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사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이 비롯된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하다.7 필리핀이라는 국가와 카푸와라는 개념 간의 개연성이 어떻게 생성되었다고 보는가?
이멜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우리(필리핀)는 혼자서 살 수 없으며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내재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선물이나 음식을 받으면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다. 여행을 가도 늘 다른 사람에게 줄 ‘빠살루봉’(pasalubong, 귀향 선물)을 챙기는 것처럼.
이솜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페미니스트다. 우리는 여성이 되길 사랑하고, 필리핀인이 되길 사랑한다.”8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싶다. 필리핀인과 여성되기는 무엇이며,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멜다 과거에 식민지였던 우리는 너무 많은 토착적 정체성을 빼앗겼다. 수많은 사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필리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특성은 걷어내고, 긍정적인 자질을 드러내야 한다고 느낀다.
이솜이최근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지 궁금하다. 요즘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가 궁금하다.
이멜다그림을 그리면서 2026년에 계획된 개인전 세 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역사 서적의 프리랜서 집필·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이제 내 나이는 76세이다.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남편과 함께 꿈꾸던 여행지를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손주들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란다.
번역 감수: 오시영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는 예술가, 큐레이터이며 또한 활동가이다. 이멜다는 회화, 콜라주, 판화, 혼합 매체, 설치 미술 등 여러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필리핀 문화와 역사에 토착 및 민속 도상학을 접목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분쟁, 식민지 정신,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들의 노동 여건, 그리고 필리핀 여성의 투쟁 등 사회적 이슈를 조명한다. 이멜다는 1987년부터 활동해온, ‘Kababaihan sa Sining at Bagong Sibol na Kamalayan (KASIBULAN)’을 동료들과 함께 조직했다. 이멜다의 작품은 브리즈번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 그리고 베를린 사비 컨템포러리 등에서 전시되었다. 필리핀 중앙 은행, 필리핀 문화센터, 필리핀 국립 박물관, 아테네오 미술관,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솜이는 주로 미술과 그를 둘러싼 것들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2022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관리과를 거쳐 전시과에 재직하며 학예원으로 일하고 있다. 《점자동시병렬 그림》(모두예술극장, 2023), 《HOLE》(윈드밀, 2021), 《piercer》(SeMA 창고, 2021), 《Perform 2019: Linkin-out》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일민미술관, 2019) 등을 기획하고, Guest Relations (Jameel Arts Centre, 2023)의 텍스트 작업에 참여했으며, 『얽힌 언어들의 사전』(미디어버스, 2024), 『black spell hotel』(2022)을 출간했다.
1 ‘카시불란(KASIBULAN)은 ‘예술과 새로운 의식을 위한 여성들(Kababaihan sa Sining at Bagong Sibol na Kamalayan)’의 약자로,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와 조각가 줄리 루치(Julie Lluch, 1946- ), 일러스트레이터 안나 페르(Anna Fer, 1941-), 공예가 이다 부가용(Ida Bugayong, 1948-2020), 작가이자 교육자인 브렌다 파하르드(Brenda Fajardo, 1940-2024)가 1987년 공식적으로 조직한 공동체이다. 이멜다가 그룹의 첫번째 대표를 맡았으며, 카시불란은 현재까지 전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필리핀 내 페미니즘적 의식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테사 마리아 구아존과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와의 인터뷰.「KASIBULAN: 페미니스트 지향과 의식」, 『함께 말하기-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2월 7일에서 재인용
3 “작품을 만드는 당신은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예술을 만드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유타 쾨터(Jutta Koether), 『에프 (f.)』 (서울: 미디어버스, 2025), 24쪽.
4 1986년 일어난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 EDSA Revolution)은 1965년부터 부임해 1972년, 계엄령까지 이어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5 ‘필리핀여성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pcw.gov.ph/?utm_source=chatgpt.com(2025년 07월 03일 검색)
6 ‘카푸와’(Kapwa)는 필리핀 토착 언어인 타갈로그어로부터 유래한 단어이다. 필리핀 심리학자, 버질리오 엔리케스(Virgilio Enriquez, 1942-1994)는 카푸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카푸와란,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자아가 타인과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아와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필리핀어의 언어적 통합성은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개념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포용성 안에는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실천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카프와(Kapwa)의 사람들’입니다”. https://kapwapilipinas.org/kapwa(2025년 09월 2일 검색)
7 이멜다는 ‘카푸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필리핀의 페미니즘은 ‘자기(self)’와 ‘타자(other)’ 모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단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카푸와(kapwa)’라고 부르는 ‘타자’ 역시 포함돼죠. 이런 감각은 우리 안에 아주 본능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 유제니 차이와의 대화, “In Conversation: Imelda Cajipe Endaya and Eugenie Tsai at Silverlens New York,” YouTube,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8Kf414hn5Uk(검색일: 2025년 7월 28일).
8 "우리는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페미니스트예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필리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랑하죠”. 위 링크.

I met Imelda Cajipe-Endaya (b. 1949, hereafter “Imelda”) through the exhibition Connecting Bodies: Asia Women Artists in September 2024. Imelda visited Korea for the exhibition and was reunited with Imelda’s work, Taghoy, Piglas!(1984), which had been transported from the National Fine Arts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to Seoul. The work, long stored away, came into public view again. Interestingly, this work encountered two periods of martial law. The first encounter of Taghoy, Piglas! with martial law came in 1984, the year of its creation, during the two-decade-long rule of Ferdinand Emmanuel Edralin Marcos. On December 3, 2024, martial law was declared again—this time in Korea by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Through Taghoy, Piglas!, I felt that Imelda’s world and mine were intersecting, recurring, and paralleling across a time difference.
Imelda’s practice began in the turbulent 1960s, directly expressing the reality of the Philippines—dictatorship, U.S.-linked capitalism, women’s domestic labor, and the export of workers. Imedla also actively engaged in political activism and social particip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work. However, the enduring question—what art actually can do in reality, and how it relates to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was also raised to Imelda in the 1980s.
In 1987, Imelda co-founded ‘Kasibulan’1(Kababaihan sa Sining at Bagong Sibol na Kamalayan) with fellow women artists. The group seemed to move beyond the burdensome question imposed on art—what art can do. Amidst the turbulence between martial law and democratization, Kasibulan emphasized ‘sisterhood’ and set up committees like the "Committee for Sisterly Solidarity," "Committee for Artistic Growth," and "Networking Committee". Asked about the criteria for selecting artists for exhibitions regarding Kasibulan, Imelda replied, “We had to exhibit everything that existed,”2 revealing the group’s focus on the community itself rather than being organized around specific aesthetic standards or feminist agendas. At a certain point, Kasibulan’s members would gather without any clear agenda—sewing together, sharing meals and conversations. For Kasibulan, aesthetics and politics were never a binary, but rather intertwined in the simple act of sitting together, spending time in the same space. We open up the conversation with Imelda to understand what was formed through their collective gathering. Jutta Koether once said that people often ask what art can do, but rarely talk about what the things that make art are doing3. In this context , this conversation traces the multiple layers that shape Imelda’s practice—the domestic, the political, the social, friendship, and community—seeking to understand what each of these was doing. Scattered things across various places, these elements have continued to play their roles even without being woven into a single whole.
Somi In the late 1980s, martial law ended and you were pregnant with your first child. In an interview, you reflected that you felt isolated at home due to domestic labor. In such an environment, how were you able to carry out the various activities? Did the atmosphere of transition after the fall of the regime also provide you with significant energy and impetus? In the 1980s, you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gender ratio in the Philippine art scene was relatively balanced, the activities of women artists remained less visible. You argued that this was because women artists, as women in society, were also bound by domestic labor. I resonate with your question and concern, as in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women artists were numerous but seemed absent. In Korea as well, during and after the dictatorship, communities such as the SiwolGathering, the Women’s Art Research Society, and Another Culture (Ttohanaui Munhwa) were formed. I found it fascinating that Kasibulan also collaborated on mural projects in the late 1980s. In Korea during that same period, women artists also gathered to produce joint works such as large-scale banners and murals. In Korea, these banners—called geolgae painting(banner painting)—were used directly at sites of civic protest and social action, serving as powerful visual statements of contemporary social realities. Meanwhile, Kasibulan’s murals were often presented in collaboration with theater groups. Although their imagery was not always overtly political,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both practices emerged under similar social conditions and shared a collective mode of working. Having lived through that period yourself, you must have experienced the situation more concretely and viscerally. Could you reflect on the position and activities of Filipino women artists in the late 1980s?
Imelda There were many others who were as isolated as I was. Although there were many technically skilled women artists, most tended to follow the way men depicted the female body as something beautiful, or they confined themselves to still lifes and landscapes. However, being pregnant or being with children did not stop me from being active. I would bring my first born girl to my workshop classes, or meetings or even in rallies. My children would just stay in a corner with her own activities. When they were two, I had to look for a day baby sitter, and take one child along. When they were three, I had to hire two baby sitters; I always took along one child or even two. The rallies were peaceful, and being with women friends gave me a feeling of security... These situations inspired and encouraged me to be even more expressive in my paintings.
Somi During the People Power Revolution4, women artists like you and Brenda Fajardo (1940–2024) actively participated in political and policy-making efforts through the Philippine Development Forum for Women, helping establish state commissions and guidelines for women. These activities are known to have a substantial impact in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You also collaborated with NGOs as an individual, reporting on women’s labor, the overseas deployment of domestic workers, and migration issues. These feel quite distant from your artistic practice. Were they something you pursued independently from your artwork?
Imelda I have a student activist background in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 fact I was a student leader at the forefront of protests, marches and rallies. But just 2 years from college I had married and soon. I became so isolated at home as a wife and mother, with only news from television and newspapers keeping me abreast of social issues. This led me to reflect on my own role and circumstance as a woman, and realized this was the condition of most women like me in my time. Remedios Rikken attended the First World Conference on Women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in Mexico from June 19 to July 2, 1975—a conference that was, in fact, largely dominated by men.
After the People Power Revolution in February 1986, Rikken was appointed as chairperson of the NCRFW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and organized the Philippine Development Forum for Women, a conference and forum held in a live-in format at the 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 in Tagaytay City. The main objective of the forum was to establish a framework based on three guiding principles: first, 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equality of access; and third, equality of results.
In 1987, as chairperson of the NCRFW, Rikken invited us to gather artists and contribute our creative ideas. Together with Brenda Fajardo and Anna Fer, I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Conference on Women for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This conference was organized across different sectors to ensure that women from various professions could contribute as independent citizens to the country’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The NCRFW later became what is now known as the PCW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the lead policy-coordinating body in the Philipp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The Commission spearheads the implementation of the Magna Carta of Women (Republic Act No. 9710) and works to ensure that women are fully integrated into national development. The PCW plays a key role in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advocating for women’s rights, and monitoring government agencies’ performance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Somi In 1987, at the age of 38, you co-founded Kasibulan with colleagues. I would like to know what led to the formation of the group. Kasibulan’s organizing committees appeared to focus primarily on fostering close relationships among members, building what could be called a “Kasibulan-like” community. The group seemed to place great value on friendship and was even described as a kind of sisterhood. Was this friendship cared for and sustain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do you feel those practices actually worked in practice?
Imelda Imelda: We, as women artists, organized Kasibulan to effectively use our creative work as a means for social change. Together with Ida Bugayong and Julie Lluch, we conceived the idea, and with Brenda Fajardo, we developed the plans and programs. In 1989, Kasibulan was officially registered as a non-profit organization. All of its founding members were activists who shared the same passion for political empowerment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hilippines. We sought to open new pathways for artistic creation. As part of our collaborative efforts, we created a mural on women’s labor and toured it alongside the play Cry of Asia (1988).
Exhibitions include Ang Babaylan held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Faculty Center in 1989; Sinaunang Habi / Makabagong Habi at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CCP) in 1990; Ang Babae at the CCP in 1991; Sibol ng Kamalayan at Nayong Pilipino in 1992; and Inang Kalikasan at Rizal Park in 1993, as well as Filipina: Migranteng Manggagawa at the CCP in the same year. Other notable exhibitions include Tahi-Tagning Talambuhay: Isang Pagpupugay sa Sining ng Kasibulan at the Vargas Museum,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 1997; balaybay@kasibulan.net at the CCP in 2004; PasyonNasyon in 2009; and Hilom: End Violence Against Women held at Glorietta/Zonta Makati in 2014.
Through research and investigation, we found that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hilippine art world did not adequately reflect women’s perspectives and strengths, and that the careers of women artists generally progressed more slowly than those of their male counterparts. We also concluded that traditional art organizations benefited male members more, often relying on the labor of women without giving them due credit. To Kasibulan, friendship and sisterhood functioned as vital forces. We felt comfortable discussing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we always looked forward to the next gathering.
Kasibulan, balaybay@kasibulan.net. Source(link)
SomiWhat kinds of activities did Kasibulan spend most of their time?
Imelda Kasibulan has consistently organized group exhibitions, installations, and various creative projects to artistically express its positions on regional and global issues. The group continues to hold regular workshops and lectures to foster cultural dialogue among women artists, with the goal of helping members and guest artists develop their capacity for self-expression through diverse artistic media. In particular, the annual summer workshop focuses on the works of new and younger members, providing opportunities to study and critique their practice. The group also hosts lectures that address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issues that may affect women artists’ lives and creative processes. To promote sustainability beyond artistic practice, Kasibulan invites experts to give talks on business management, aiming to help members sustain their creativity while also support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addition to these activities, the organization actively holds art bazaars and creative projects to raise funds that support both the artistic needs and overall well-being of its members.
SomiKasibulan has stated its goal as “enhancing the true identity and image of Filipino women.” Could you elaborate on what this meant in concrete terms? In particular, what kind of true identity and image was Kasibulan seeking during the 1980s and 1990s? And was this pursuit sustained and effectively realized over time?
ImeldaFor cultural workers and artists of whatever political alignment in the 1980s–1990s, interest in and research on indigenous Philippine society was paramount. The tendency then was to study the lives of women heroes, as well as women in native myths and legends. We kept in mind our search for images and existing practices of the Babaylan, the healer-priestess. Her empowerment is inseparable from her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family, her children and the community. This is tied up with care for the natural environment, and faith in Maykapal (the Creator). While we created individual works, our favorite strategy was to stitch them together.

SomiIn an interview, you mentioned that Kasibulan artists were influenced by domestic labor and sometimes found their works regarded as a kind of hobby, which made it difficult to sustain their art practice. At the same time,metaphors of domestic labor appear directly in your own work, it seems that household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your art as well. You also mentioned tha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one’s roles at home, as an individual, and within society. In that case, how were your personal life, your artistic practice, and your activities with Kasibulan interconnected?
Imelda For me, multitasking was an everyday reality. Painting and creating while cooking, cleaning, caring for children and home became inseparable daily activities.

SomiIt’s said that Kasibulan encouraged members to invite five new colleagues to each meeting. Did the group consider it important to expand the number of active women artists, thinking that the collective needed to be sustained at a certain physical scale? I wonder if the group’s longevity might have come less from aligning around one specific agenda or meaning, and more from focusing on physical maintenance and expansion.
ImeldaWe targeted numbers, but that was difficult to sustain because it meant sacrificing creative hours to give some time for organizational work. So we took turns, only six to ten would be active in meetings and organizing. Numbers would grow to 30-40 during exhibition time. We held dialogues to thrash out our differences.
SomiWhat is Kasibulan’s present and future? What has remained sustained, and what has changed?
Imelda Only two of us founders, Julie Lluch and I, continue to be active, but only in supportive roles. We feel so fulfilled that women artists old enough to b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keep the organization alive. They keep to regular meetings, projects and exhibitions. Everyone is free to pursue her personal, creative and stylistic goals. It is the sisterhood and continuing regard for Kasibulan’s mission, vision and goals ( as originally stated in its founding) that continue to keep us together.
Somi You’ve said that the Kapwa—[5] The recognition of a ‘shared self’ that exists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is embedded in Filipino women, which I found very fascinating. In another interview, you urged not only seeking justice for oneself but also caring for the collective around you. It seems that you practice feminism in a deeply communal context. I am curious about the specific background that led you to this way of thinking.[6] How do you see a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Kapwa and the idea of the Philippine nation? How do you think this relationship came about?
ImeldaThe root is the innate belief that no person can live alone, we are all interdependent. Even today, if a person is given a gift or some food, the receiver always shares it with her family or friends. When travelling, whether for work or for leisure, one always shops not only for oneself, but also for a pasalubong (take-home gift)
Somi You once said, “We all country—loving feminists, we love being women and being Filipinos.”[7]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is more deeply. What does it mean to be Filipino and to be a woman for you?—and what does it mean to love these identities?
Imelda Our colonial past took away so much of our natural or indigenous identities. In the midst of so many social problems besetting our country, we are still continuing to define what it is to be Filipino: to sort out the negative traits and bring out the positive qualities that will help bring bright hope for the total well-being of the next generation .
SomiSince we last met in September 2024,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Where is your attention directed these days? What future are you envisioning?
Imelda I am preparing for three solo exhibitions scheduled for 2026 while continuing to paint. I also work as a freelance writer and editor for historical books. Now at the age of 76, I hope—if it is God’s will—to travel with my husband to some destinations we have long dreamed of visiting. I also hope to keep seeing our grandchildren and that they will continue to come visit us.
Proofreader: Siyoung Oh
Imelda Cajipe Endaya is an artist, curator, and activist. Imelda works in diverse media, including painting, collage, printmaking, mixed media, and installation art, incorporating indigenous and folk iconography with Filipino culture and history. Imelda art highlights social issues such as militarization, land conflicts, colonial mentality, overseas Filipino workers conditions, and the struggles of Filipino women. Imelda is the founding president of Kasibulan, the first feminist visual artists organization in the Philippines active since 1987; and Pananaw: Philippine Journal of Visual Arts, an initiative in contemporary art discourse. Imelda's work has been exhibited in Asia Pacific Triennale in Brisbane, Sydney Biennale, Singapore Art Museum, National Gallery Singapore, and Savvy Contemporary in Berlin. Imelda’s works are in the collection of Bangko Sentral ng Pilipinas,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Ateneo Art Gallery, Metropolitan Museum of Manila, National Gallery of Singapore, Okinawa Prefectural Museum, and Fukuoka Asian Art Museum.
Somi researches and curates and has been working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ince 2022. Somi curated Braille Parallel Drawing (Modu Arts Theater, 2023), HOLE (Windmill, 2021), piercer (SeMA Storage, 2021), and Perform 2019: Linkin-out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 Ilmin Museum of Art, 2019), and contributed text work for Guest Relations (Jameel Arts Centre, Dubai, 2023). Somi has published Dictionary of Entangled Languages (2024) and black spell hotel (2022).
1 Kasibulan, which stands for Kababaihan sa Sining at Bagong Sibol na Kamalayan (Women in Art and the New Consciousness), was officially formed in 1987 with Imelda Cajipe Endaya, sculptor Julie Lluch (1946-), illustrator Anna Fer (1941-), craftsperson Ida Bugayong (1948-2020), and writer and educator Brenda Fajardo (1940-2024). Imelda served as the first representative of the group. Kasibulan played a vital role in fostering the growth of feminist consciousness in the Philippines.
2 Tessa Maria Guazon, “KASIBULAN: Feminist Orientation and Consciousness,” in Speaking Together: Women Artists in Asi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ebruary 7, 2025 (cited in interview with Imelda Cajipe-Endaya and Tessa Maria Guazon).
3"You, who create art, are often asked the question: 'What can art do?' But no one asks what the things that create art are actually doing."; Jutta Koether, F (f.) (Seoul: MediaBus, 2025), p. 24.
4 The People Power Revolution (EDSA Revolution) of 1986 was a pro-democracy movement that arose in opposition to the dictatorship of President Ferdinand Marcos, who had been in power since 1965 and declared martial law in 1972.
5 Kapwa is a word derived from Tagalog, one of the indigenous languages of the Philippines. Filipino psychologist Virgilio Enriquez(1942-1994) defines Kapwa as follows:“Kapwa is the recognition of a ‘shared self’ that exists between oneself and others. It means that the inner self is shared with others. This linguistic integration of self and other in Filipino is a unique concept rarely found in most modern languages. Why is this so? Because within this inclusivity lies a moral obligation to treat one another as equal human beings. Even if it begins with close relationships such as family or friends, if we are able to practice this, we stand on the path of enacting peace. We are people of Kapwa”. https://kapwapilipinas.org/kapwa.
6 “Filipino feminism is based on self and the other. Not just the self, but also the other we call ‘kapwa’. That’s very innate in us.”; “In Conversation: Imelda Cajipe Endaya and Eugenie Tsai at Silverlens New York,” YouTube,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8Kf414hn5Uk.
7 “We are all country -loving feminists, we love being women and being Filipinos”. “In Conversation: Imelda Cajipe Endaya and Eugenie Tsai at Silverlens New York,” YouTube,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8Kf414hn5Uk.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현존하는 존재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 ,
죽음과 떠도는 혼들에 대하여 On Death and the Hungry Ghosts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현존하는 존재
홍콩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너무 많은 것들이 오고 지나갔다.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늘 시차를 두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이 나에게 제일 급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보는 중. 오늘은 샤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홍콩과 중국에서 칠선녀를 비롯한 여러 여신들의 절에 방문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절 중 하나가 홍콩 란타우(Lantau)섬 무이오(Mui Wo)타운의 룩테이통(Luk Tei Tong) 마을의 토유엔통(To Yuen Tong, 桃源洞 Temple)이다. 홍콩에 있는 작은 절들의 정보는 보물찾기와 같아서 사소한 페이스북, 블로그 글도 소중한 자료가 된다. 홍콩에는 미스터리가 정말 많다. 체감상 내가 사는 베를린을 적어도 네 번은 접은 것 같은 공간이다. 단순히 면적 대비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도시는 수직으로도 빽빽하다. 언덕이 굽이굽이 져 있고 산기슭과 도시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들이 숨을 곳이 참 많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산중턱에 있는 호텔에서 매일 센트럴 역으로 20분간 하산했다. 홍콩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도시를 다 알 수 없을 것 같다. 뭐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장소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베를린이 지역마다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건 홍콩에선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도시 중심이 다르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장소의 도시-자연 경관이 완전 또 다르고, 심지어 도시 중심에 있는 산꼭대기에 가면 갑자기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 근데 또 홍콩은 아케이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심 전체가 아케이드로 이뤄져 있는 마냥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를 갈 수 있게 아케이드끼리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방향성을 상실한다. 구글맵은 대체로 잘 작동이 안 된다. 구글맵은 수직으로 내가 어디에 좌표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 수직 좌표에 여러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홍콩이니까. 250개가 넘는 섬들로 이뤄진 홍콩이니 섬마다는 또 얼마나 다를까.
이 천태만상(千態萬象)한 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그것이 원했던 것처럼 발견하기가 어렵고 남겨진 자료도 거의 없다. 아! 대체 왜 나는 이런 것들에 ‘만’ 매료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굳이 그런 걸 찾아내고 안타까워하는 걸까. 왜 늘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것들, 사라져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장소들, 이야기들에 집착하는 걸까. (사라지는 것들에게 사라질 권리가 있지 않나? 사라져서 내가 낭만화하는 걸까? 그땐 그래도 그런 게 좋았지 같은 식의?) 아니다. 이것은 ‘정의 내릴 수 없음’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다. 다 알아서 언어로 구겨 넣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서랍 속에 넣을 수 있으면 이렇게 천착하지 않았겠지.


(오) 남쿠 테라스(Nam Koo Terrace). 일본 점령기 당시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현재 홍콩에서는 ‘귀신의 집’으로 알려져 있다.
여신들과 그들을 섬겼던 여성 공동체를 조사하러 이곳에 온 나의 종착지는 또다시 샤머니즘이다. 하지만 결국 아무 샤먼도 만나지 못한 채…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처음부터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면 뭐가 달랐을까?
요새 오션 브엉(Ocean Vuong)의 토크를 자주 듣는다. 놀랍게도 그의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이 나의 것과 닮아 있어 최근 가장 내밀한 친구가 되었다. 팟캐스트 채널 〈트라이시클 토크(Tricycle Talks)〉의 에피소드 “Buddhist Poet Ocean Vuong on Failure, Redemption, and Second Chances”에서 자크 데리다를 차용한 마크 피셔의 Hauntology와 으스스함(The Eerie)에 대해 얘기하며,
“그리고 그는 제가 정말 독특하다고 느낀 말을 해요. 으스스함(eerie)이란 드러나지 못한 존재의 현존이다. 그는 폐허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숲처럼—어떤 능력이나 현존을 향해 손짓하고 있지만, 끝내 완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And he says something really, I felt really unique where he says, the eerie is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 And he talks about ruins behaving this way, or, you know, forest without tree, without leaves, right? so like there’s this gesture toward capacity, towards presence that fails.)”
그리고 그가 이어서, “이게 불교의 무(無) 아닌가요?”라고 하는 걸 듣는 순간 띵.. 여기서 ‘fail’은 실패의 의미가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는 상태의 시간성이지 않을까. 언제나 여기 있는데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서의 폐허(ruin), 이야기들, 있는데 없는 상태로서의 존재들.
아무튼 다시 돌아와, 이 질문들의 시초가 된 토유엔통에 관해 얘기해 보자. 신들 사이에도 ‘인기도’가 있다. 지역마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신들이 있는데, 대체로 관세음보살(觀音, Guanyin), 관우(關帝,Guan Di), 마주(媽祖, Mazu), 투디공(土地公, Tudigong) 같은 주류 신들이다.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이들의 사당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공부한 칠선녀(Seven Fairies)는 주류 신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특히 홍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완전히 마이너한 신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광둥 지역과 홍콩에서 칠선녀 축제가 대단하게, 흔하게, 일상적으로 열렸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홍콩에서는 칠선녀를 보려면 도심을 벗어나야 한다.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췬완(Tsuen Wan) 지역이나, 배를 타고 펭차우(Peng Chau) 섬이나 란타우섬에 가야 한다. 이 여신들을 매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길을 나서야 하고, 덕분에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다. 홍콩에서 머문 세 달 동안 절 탐방을 핑계로 여기저기 많이 쏘다녔다.




란타우섬의 칠선녀 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견학했다. 여행 가는 학생들 마냥, 들뜬 마음으로. 우리는 총 6명이었고 나이도, 배경도 다르고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의 정도도 서로 모두 달랐지만, 같이 간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들로 기뻐하고 감탄했다.
배에서 내려 룩테이통 마을 안으로 한참을 들어와, 언덕을 올라 만날 수 있었던 칠선녀 사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스러워서(?) 그 아우라에 조금 놀랐다. 인터넷에서 모은 자료들을 종합한 사원에 대한 정보이다.
이 사원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들에 의해 창설되고 운영되었던 사원이라는 점이다.1970년경(1960년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다) 마을의 여성 다섯 명이 공동으로 사원을 세웠고, 설립 당시에는 관음보살을 모시고 은퇴한 미혼 여성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설립자 가운데는 일명 “메이구”(妹姑)라 불리던 로 메이(羅妹)와 사수(四嫂, 넷째 아주머니라는 뜻)라 불리던 류리완장(劉李玩璋) 등이 있었다. 초대 주지 역할을 한 메이구가 사원을 이끌다가 이후 류리완장(사수)이 뒤를 이어 사원을 관리했다. (이들 외에 창립에 참여한 여성으로 劉周玉英(유주옥영), 吳陳淑有(오진숙유), 黃區瑞清(황구서청) 등이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설립자들은 사원 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더 많은 신들을 모시기 시작했다. 칠선녀는 그 신들 중 하나였다. 이후 사원은 토지 사용 문제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사원 내부에 선인들의 유골 단지가 안치되기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공동 설립자이자 가장 최근까지 사원을 관리하던 류리완장은 “자신에게 경전을 배운 제자들과 인연 있는 신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며 영리 목적이 아닌 자선 형태의 봉안당 운영을 희망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봉안당 설치 인가 신청이 거절되었다.1






이 사원에서 놀랐던 점은 첫 번째로, 사원의 선인 전각(Hall of the deceased)에 있던 많은 여성들의 위패, 그리고 한쪽 켠에 따로 모셔져 있던 여성 샤먼들의 사진과 위패들이었다. 위패 속의 “仙姑(도교 및 광둥 민간신앙에서 여성 신선·무녀를 뜻하는 존칭)”, “修蓮女(사찰에 정식 출가하지 않았으나 경을 외우고 신탁 의례에 참여하는 비출가 여성 수도자)”, “妹姑(광둥 방언에서 젊은 여성 샤먼 또는 입무 초기 영매를 뜻함)”, “嫂(형수, 아주머니라는 뜻이지만 민간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연장자 여성 무속 리더를 부를 때 존칭으로 사용됨)” 같은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통해 이들이 단순히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샤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나는 이들이 홍콩·광동 지역의 민간 도교·불도 혼합 신앙 공동체였던 선천도에서 활동하던 여성 영매인 차이구(齋姑, Zhaigu)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선천도란?: 선천도(先天道)는 청말에서민국 초 사이, 여성 수행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민간 도교로, 관음보살이나 요지진무 같은 여신을 숭배하며 신의 뜻을 ‘받는’ 영매적 수행을 중시했다. 불교가 해탈을 지향했다면, 선천도는 신의 계시를 전하고 돌봄 공동체를 꾸리는 실천적 신앙이었다. 홍콩과 남중국의 채식당(齋堂)들은 이런 선천도의 기반 위에서 미혼 여성과 과부들이 모여 자매애와 신적 교통을 이어가는 여성 영매 네트워크로 발전했다.2
특히 홍콩 신계(New Territories)의 타이포구(Tai Po District, 大埔區) 다푸촌(Dapu Village, 運頭塘)에도 같은 이름의 선천도당, 도이원텅(To Yuen Tong)이 있었던 것, 여성신이 중심이었고 여성 영매들이 활동하며,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있었던 점, 이들의 사후 세계까지 봉안당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특히 칠선녀 전각에 놓여 있던 경전에는 선천도적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이곳이 차이구들이 머물던 장소였구나라고 추청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놀랐던 점은 사원에 함께 방문한, 우리를 안내해 준 로컬 리서처 Belinda가 말해 준 일화였다. Belinda는 이 사원을 몇 년간 알아왔고 칠선녀 축제(Seven Fairies Festival)때 방문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데, 당시 류이완장은 90세의 나이로 더 이상 사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날 외부에서 온 한 여성이 사원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 칠선녀 축제 때 이 젊은 여성의 몸에 칠선녀가 접신한 광경을 Belinda가 봤다고 했다. 그 여성은 갑자기 춤을 추고 높은 톤의 목소리를 내며 약 30분간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아마 칠선녀들이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강림한 게 아닐까? 그녀를 영매로 정한 게 아닐까?
허나 그 이후 우리는 그 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날 절에서는 보이지 않았는지, 왜 사원이 거의 방치된 것처럼 보였는지, 왜 더 이상 여성들이 그 절에 머물지 않는 건지, 왜 커뮤니티 부엌은 까맣게 먼지가 내려앉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건지 알 길이 전혀 없었다.




많은 신상들이 사원 밖에 놓여 있었는데, 현지인들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사를 갈 때 신들을 이곳에 두고 갔다고 한다.


토유엔통 사원에 방문했을 땐 단지 칠선녀에게 9월에 CHAT 미술관(Centre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에서 진행한 칠선녀 축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고 간 것이었는데, 뜻밖의 분위기와 질문들에 (물론 당시엔 이런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아예 몰랐다), 그리고 그 절의 어쩐지 다른 절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생각이 얽혀 마음에 그 이후로도 무겁게 자리 잡았다.
3개월간 리서치를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풀지 못한 질문은 이런 과거의 여성 공동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이다. 어떤 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이전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고 — 예를 들어 여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아래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 — 여성 모두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으며, 일단 나는 이렇게 도심에서 동떨어져 산속에 사는 나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우리가 방문한 완징 사원(Wanjing Temple, 蘊貞堂)의 콤시스터즈(Comb Sisters)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세속적으로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
더 중요하게는 난 아프사(AFSAR)를 소중한 공공 공원 같은 장소로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 멋지게 빛나면서 가끔은 함께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싶지 ‘같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신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욕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여신들은 주로 다산, 출산,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가치와 결부되어 있다. 여신들을 위한 이야기도 다시 쓰여야 할 때가 온 것! 많은 도교, 민간신앙의 여신들은 본래 인간이었다. 이들은 살아생전 탁월한 능력으로 마을에서 이름을 날린(?) 여자들이었고, 결혼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된 여자들이었다.
나는 이들의 탁월한 능력에 초점을 맞춰, 팬덤 문화의 일환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싶다. 아마 여신들도 답답하지 않았을까. 살아생전 무술로 이름을 알렸는데 현재 하는 일이 아이를 점지해 주는 일뿐이니. 심지어 여성들이 출산을 잘하지 않아 소원을 빌러 오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 만난 친구가 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제 우린 그런 여성 공동체가 필요 없잖아.”라고 툭 내뱉었다. 공감했다. 맞다. 우린 ‘그런’ 여성 공동체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의 감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감각은 물리적인 공간, 정신적인 깊이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시간성, 공간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프사가 공공 공원이라면 이것이 공동체로 기능하는 건 언제든 내가 그곳에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리추얼적인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의 공동체원끼리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다. 한병철이 『리추얼의 종말(The Disappearance of Rituals: A Topology of the Present)』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소통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소통이 공동체의 감각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데 이 소통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했고, 세상을 번역하고 나를 번역하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내 작은 뇌에서 만들어 내는 어떤 것일 뿐이며, 더 중요한 건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피곤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인 것 같다.
아무튼 다시 샤먼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나는 홍콩의 칠선녀 축제에서 보고 싶었던 것을 이미 마음속에 상정하고 “왜 그렇지 않지?”라고 어리석게 질문했다. 왜 여자들이 공공장소에 모여서 함께 축하하지 않지? 차이구들은 다 어디에 간 거지? 사원의 영매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칠선녀 신앙은 왜 홍콩에서 사라진 거지? 라고.
칠선녀 축제날 쯤 왠지 모르게 상당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홍콩에 있는 대여섯 군데의 칠선녀 절을 다 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중에 세 군데에 방문했다. 췬완 지역의 광판틴촌(Kwong Pan Tin Tsuen)의 칠선녀 축제에 참여했고, 근처 찻싯궁(Chat Sing Kung)과 펭차우섬의 칠선녀 절에도 방문했다.



예상한 것처럼 절에 여성들은 없었다. 절에서 하는 의례들은 보통 사제들이 주관하며 이들은 열에 아홉(열일지도)은 남성이다. 물론 종교적 수련을 하는 여성 신도들도 있다. 이들은 불교 절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수행자일 뿐 절의 의례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관심 있는 이들은 왜 여성이 전통적으로 사제가 될 수 없었는지, 이게 얼마나 낡은 생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홍콩의 영화 〈라스트 댄스(The Last Dance)〉(2024)를 보시라.


광판틴촌의 칠선녀 축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기보단, 그 마을 주민들이 매년 모이는 마을 합동회 같은 느낌이 강했다. 이들은 대개 중년 남성들이었으며,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다. 사당 옆에는 조상 전각도 있었다. 여성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 남편의 조상을 기리는 의례에 함께하거나 가족 모임의 일환으로 온 것 같았다.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칠선녀 축제에 왜 여성들이 없냐고 하니, 보통 그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이 지역 출신의 여성들은 결혼 후 이 지역을 떠난다고.
그리고 여성들이 주관하던 칠선녀 리추얼은 아마 1970년대 전후로 사라진 게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때에도 이들은 어떤 절에서 공식적으로 리추얼을 진행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구역에서 여성들끼리 계모임처럼 1년 동안 돈을 모아 사는 건물 옥상 또는 길에서 축제를 즐겼다고 한다. (하여 우리가 인터뷰한, 이전에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이를 어떤 한 시대의 풍습이지 칠선녀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으셨다.)
홍콩의 칠선녀 축제를 공부하러 방문한 대만 친구 파이버와 나는 이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던 ‘칠선녀 강림(possession)’을 경험하고 — 매년 같은 이에게(현재 영매로 활동하는 이는 남성) 강림한다고 한다 —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마을 주민들은 줄을 서서 이 영매를 차례차례 만나서 덕담을 들었다. 이 남성 영매는 ‘여성 같은’ 높은 톤의 목소리로 줄을 선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건강하세요.” 같은 짧은 덕담을 나눠주었다.
나는 사실 상당히 긴장했다. 작년부터 대만에서 칠선녀를 알아왔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겠거니 하고 늘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하던 칠선녀 언니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니!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라니. 하지만 뭐 별다른 공수 같은 건 없었다. 시간은 10초 정도로 짧았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파이버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내게 “잘 모르겠어. 칠선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이 영매를 우리가 만나야 하지?”라고 말했다. 파이버는 이 한 명의 ‘특별한’ 영매에 대해 갸우뚱했다. 동감했다. 샤먼은 신의 선택을 받은 어떤 슈퍼스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앞서 오션 브엉이 말한 것처럼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현존하는 존재(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남들보다 시력이 좋아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덜 보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시간성이 아닌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현존하는 존재’ 그러고 보니 3개월 내내 가지고 있던 감각이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어리석게도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라고 계속 물었는데 — 여기서 주어는 칠선녀 축제의 여성들, 여신 사당의 여성들, 밀교의 여성 신도들, 샤먼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 — 그들은 이미 언제나 어디에든 있었고,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그저 보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을 베를린에 돌아와서야 깨달았다.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3개월 내내 만나고 본 것이 그것들이었다는 것. 돌아와서 찍은 영상을 하나씩 천천히 열어보니 그 안에 정말 많은 여자들의 얼굴들이 있었다. 많은 질문을 가지고 떠난 이 여행을 위해 모인 소중한 사람들, 새롭게 만난 이들, 미술관에서, 절에서, 리추얼의 주요 무대가 아니라 무대 옆에 무리지어 앉아 있던 자리에서, 절에서 빌던 여자의 손, 조용히 울음을 닦던 손수건에서, 4층 건물 테라스에서 마주 퍼레이드를 지켜보던 선글라스에서, 칠선녀 축제 공예품을 만드는 중년 여성의 주름진 얼굴과 손에서, 여행하며 만난 절의 퉁명스럽기도 하고 때론 챙겨주고 싶어 하는 눈동자들, 호기심으로 가득한 얼굴들에서, 내 카메라는 3달 내내 이들만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디 있냐고, 왜 나는 묻고 있었을까? 참 어리석지.
토유엔통에 영매들과 신도들은 없었지만, 거기에 우리들이 있지 않았는가. 펭차우섬의 칠선녀 절에 우리가 태운 향들, 놓은 꽃들, 공물들, 기도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여행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현존하는 존재”의 현현 그 자체가 아니었는지.
편지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 마친다. 다음 편에는 중국에서의 여행담을 들고 오겠다!
2025년 10월 16일
무니페리
죽음과 떠도는 혼들에 대하여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7월부터 9월까지 홍콩과 중국에 있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주제는 영혼과 죽음이었다. 하여 이 이야기를 먼저 소화해야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중원절(Hungry Ghost Festival)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원절(中元節)은 불교의 우란분절(盂蘭盆節), 도교의 삼원사상(三元思想), 그리고 유교의 효 사상이 융합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조령(祖靈) 제의이다. 음력 7월 보름은 저승의 문이 열려 굶주린 혼령들이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시기로, 사람들은 조상과 떠도는 영혼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지전을 태워 그들의 안식을 빈다. 도교에서는 이날을 지관대제(地官大帝)의 탄신일로 보아 인간의 죄를 사하는 날이라 하며, 불교에서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 우란분경(盂蘭盆經)의 설화로 설명된다. 홍콩과 중국 본토,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화교 공동체에서는 이날을 ‘귀절(鬼節)’이라 부르며, 절과 거리에서 푸두(普渡, 모든 영혼을 구제하는 의식)를 열고, 해안에서는 수등(水燈)을 띄워 망혼의 길을 인도한다. 이처럼 중원절은 죽은 자를 위로하는 의례이자, 산 자가 조상과 세계의 질서를 다시 연결하는 행위로서, 생과 사의 경계를 잇는 공동체적 축제라 할 수 있다.1
중국 산터우(汕头, Shantou)에서 이 중원절의 첫날을 기념하는 의례에 참여했다. 깊은 밤이었고, 우리는 본격적인 리추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인근의 한 불교 사찰에 들러 분위기를 살폈다.
나라와 문화권마다 죽음과 영혼을 이해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유교, 불교, 도교, 민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지역에서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관습과 의례들이 발전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 하는데, 한국의 무속신앙에서는 이 영혼을 영(靈), 혼(魂), 넋(魄) 세 가지로 본다. 영은 죽은 뒤 하늘로 돌아가고, 혼은 49재 저승의 율법에 따라 신판을 받는다. 넋은 21일간 죽은 자리를 맴돌다 사라지거나, 사망 당시의 감정으로 이승에 남는다고 한다.
죽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윤회를 하지 못한(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은) 영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이 왜 죽었는지를 잊게 되고, 죽음당시의 억울함, 원한, 슬픔만이 남아 구천을 떠돌다가 인간에게 빙의하거나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잘 달래어 천도시키는 게 한국의 무당들이 수행하는 일 중 하나다.
홍콩과 중국에서 경험한 중원절의 영어 표기는 ‘Hungry Ghost Festival’이다. 여기서 ‘Hungry Ghost’란 구천을 헤매며 이승을 떠나지 못한, 본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의미한다. 무주고혼은 “제사 지낼 후손이나 가족이 없어 외롭게 떠도는 혼령들”을 뜻하는 말로, 무연고혼(無緣孤魂) 또는 무연고자(無緣故者)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들을 아귀(餓鬼) 또는 고혼(孤魂)이라 하여,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헤매는 존재로 여긴다.
유교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이 중원절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결국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8월 한 달 내내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원절을 기린다. 상점 앞에는 떠도는 혼령들을 위해 음식을 차려 두고, 지전(冥幣, 한국 무속에선 망자돈이라 부른다), 종이로 만든 각종 생활도구와 집을 함께 태운다. 망자들이 저승에서 쓰라고.
중원절이 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두’가 이 달을 기념한다는 것이다. 물론 절에서 도사들과 스님들이 많은 행사들과 리추얼을 진행하지만, 중원절은 일상에 훨씬 더 가까워서 굳이 절에 가지 않아도 내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 자주 가는 음식점에, 집 앞 같은 생활 반경에서 사람들이 이 망자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홍콩은 특히 ‘파지옥(破地獄, Break the Hell)’이라는 의식으로 유명하다. 지옥을 깬다, 지옥문을 연다는 의미다.
중원절이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무 연고 없는 영혼들을 홍콩 전역에서 위로한다는 것이다.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음식상을 차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한국인인 나에게도 익숙하다. 하지만 중원절의 본질은 나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라기보단,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이들을 딱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중원절은 단발적인 상차림, 기도가 아니라 한 달 내내 행해지는, 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망자를 위한 오페라, 퍼레이드, 각종 리추얼들을 도시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절에서 진행되는 다소 조용한 의식들도 있지만 대개는 아주 화려한 형태의 종이 공예, 음악, 퍼포먼스처럼 흥겨운 분위기가 주된 심상이었다. (물론 한국도 무당들이 떠돌아다니는 한 많은 혼들을 위해 천도재를 정기적으로 지낸다. 하지만 홍콩이 다른 점은 이 천도재를 무당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다는 점이었다.)
연고 없는 귀신들,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단지 이들이 내 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게 이것은 좀 더 근원적인 생명체의 본성처럼 느껴졌다. 딱하게 여기는 마음. 아무 대가 없는 선물 같은 것. 보도에 나온 달팽이가 사람의 발이나 자전거 바퀴에 밟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풀숲으로 옮겨주는 선의 같은 것?


홍콩에 머물며 파지옥 리추얼을 볼 기회가 있었다. 비가 많이 오는 저녁에 진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이로 만든 위패를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위패에 적힌글씨를 보니 아마 조상령의 안녕을 위해 온 가족, 지인, 친구들인 것 같았다. 의식을 주관하는 도사는 이 위패를 들고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 불길 속을 수십 번 건넌다. 지옥 문을 열어 영혼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천도하는 것인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로컬 리서처 Belinda가 내게 해준 설명이었다. 도사들이 조상의 위패를 들고 불길 속을 건너기는 하나, 핵심은 위패의 주인인 조상령들이 구천을 떠도는 고혼들을 대신해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해방을 돕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자라면서 익숙하게 경험한 망자를 위한 의례들은 관계의 내부를 지키는 일이었다면, 중원절은 관계를 여는 의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원절은 그러므로 모든 혼의 날이며, 결국 모두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연민이 아닐까? 조상을 위한 제사가 기억된 이를 위한 것이라면, 중원절은 잊힌 자를 위한 것으로, 나와 내 가족 혹은 나의 가까운 주위 사람에서 ‘나’가 확장되는 경험이었다.
요즘 부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끝이 있다는 건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한바탕 놀다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매일을 살며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삶이 그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게 느껴진다.
요새 부쩍 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며 귀신과 영혼, 신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은 이들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혼자 한국 무속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는 지점은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무속신앙은 애니미즘과 유교가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산자와 죽은 자의 순환 속에서 현생과 내세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애니미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생에서 인간이 영혼과 맺는 관계는 유교적으로 이해된다. 신은 내게 집안의 어른으로 찾아온다. 조상신을 말하는 건데, 무속에선 조상신과 천신이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가 먼저 오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서서히 온다고도 한다. 대체로는 조상신이 수호신으로 먼저 온다.
불교에서는 중원절을 우란분재(盂蘭盆齋)라고 한다. 흔히 ‘제(祭)’와 ‘재(齋)’를 혼동하는데, ‘제(祭)’는 신이나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이고 ‘재(齋)’는 의식을 준비하고 정화하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중원절은 이 둘이 합쳐져, ‘재(齋)’가 곧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산 자를 정화하는 의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중원절의 ‘재’가 나의 매일매일에 스며 있길 바란다. 내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자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이기를, 연민의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은 여기서 마친다.
2025년 10월 31일
무니페리
무니페리는 동아시아 우주론, 그리고 사변적 픽션을 기반으로 성별, 역사, 소속의 경계에서 밀려난, ‘이중으로 추락한(double-fallen)’ 존재들을 탐구한다. 아시아 페미니즘 연구·예술 플랫폼 AFSAR(Asian Feminist Studio for Art and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며,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공부와 공동 창작의 방식으로 작업을 확장한다. 개인전 《Missings: From Baikal to Heaven Lake, from Manchuria to Kailong Temple》(베스트팔리쉐 미술 협회, 2025), 《무니페리의 리서치 위드 미, 실종 : 유령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금호미술관, 2022)를 개최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2025), 노이어 베를리너 쿤스트페라인(2024), 카이 아트센터(2022), 아르코미술관(2022), KW 컨템포러리 아트 인스티튜트(2021)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1년 아르스 비바(ars viva) 상을 수상했다.
1 Ilaria Maria Sala and Guo Ting, “The Fertility Goddess: A Visit to Hong Kong’s Golden Flower Temple,” Zolima CityMag, August 19, 2020; “To Yuen Tung: To Yuen Tung and its religious rituals,” South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antau Office, accessed November 6, 2025,; “盂蘭節七姐誕虔拜祈消瘟,” 香港商報, September 3, 2020; “骨灰龕條例 梅窩隱世古剎申請做骨灰龕 村民憂破壞寧靜擬抗爭,” HK01, April 20, 2018.
2 志賀市子, “地方道教之形成:廣東地區扶鸞結社運動之興起與演變(1838–1953”, 《道教研究學報:宗教、歷史與社會》 (Daoism: Religion, History and Society), no. 2 (2010): 231–267.; “第三章 先天道道堂的传统与现在, ”豆瓣读书, accessed November 6, 2025,
1 노성환, 「대만의 중원제에 관한 일고찰: 基隆의 中元祭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 no. 34 (2013): 293–312.; 김성순, 「동아시아의 우란분절 수용에 나타난 의미의 확대와 변용 양상: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주고받음’의 축제」, 종교연구 50 (2008): 187–218. 참고.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
It has been two weeks since I returned to Berlin from Hong Kong. So many things have come and gone. What I have actually seen—what has truly entered me—is something I always realize only after a delay. For now, I simply sit before my computer, trying to listen carefully to what inside me is speaking the loudest, what wants to be said first, what feels most urgent to take form in words. Today, I want to talk about shamans.
During my time in Hong Kong and China, I visited numerous temples dedicated to female deities—including, of course, the Seven Fairies. Among them, the one that stayed with me most vividly was To Yuen Tong Temple (桃源洞), located in Luk Tei Tong Village in Mui Wo on Lantau Island. Finding information about small temples in Hong Kong feels like treasure-hunting; even a half-forgotten blog post or an obscure Facebook entry becomes a valuable trace. Hong Kong is full of mysteries. Spatially, the city feels like it folds into itself four times over compared to Berlin, where I live. It is not merely that there are more people per square meter—the city also stacks vertically. Hills curl and twist; mountains lean right into the city. Stories have countless places to hide. Every morning, we literally descended the mountain—twenty minutes down from our hillside hotel to Central Station. No matter how long one lives there, it feels impossible to ever know the entirety of Hong Kong; you never quite know what hides where, or how.

The spatial spectrum is astonishingly dramatic. People say that each district in Berlin has its own atmosphere, but Hong Kong laughs at that comparison. Each urban center feels entirely distinct; take a few steps away, and the city-nature landscape transforms completely; climb to the top of a mountain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suddenly a different universe opens. And yet, Hong Kong could just as easily be called the City of Arcades. The downtown is almost entirely composed of covered walkways; one can walk several bus stops’ distance without ever stepping outdoors. It is disorienting. Google Maps doesn’t work properly—it cannot comprehend verticality, cannot locate you precisely on its flat grid, because in Hong Kong, several worlds sit on top of one another within a single coordinate. The territory consists of more than 250 islands; how different each one must be.
The stories hidden in this ten-thousand-forms-of-life (千態萬象) space are as difficult to discover as they seem to wish to remain concealed. Almost no records survive. Ah… why am I always drawn to things like this? Why do I insist on finding them, only to mourn their disappearance? Why do I keep obsessing over intangible things—things that fade, things that slip away—people, places, stories that no longer exist? (Do disappearing things not have the right to disappear? Am I romanticizing them simply because they are gone—because it lets me say, “those were the days”?) No…that’s not it. It’s an instinctive attraction to what cannot be defined. If everything could be cleanly categorized, folded into language, and stored neatly in a drawer, I wouldn’t need to dig this deeply.


(R) Nam Koo Terrace, a former Japanese military brothel during Japanese occupation, now known in Hong Kong as a haunted house.
I came here to study goddesses and the female communities that served them—and once again, the destination became shamanism. Yet in the end, I met no shamans—only hearsay, fragments, second-hand stories. How different would things have been if I had focused on this from the start?
Lately, I’ve been listening often to Ocean Vuong’s talks. Strangely, his thoughts on death and life echo my own so closely that he has become one of my most intimate friends in recent days. In the podcast Tricycle Talks—in the episode titled “Buddhist Poet Ocean Vuong on Failure, Redemption, and Second Chances”—he speaks about Derrida, Mark Fisher’s hauntology, and the Eerie. He said,
“And he says something really, I felt really unique where he says, the eerie is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 And he talks about ruins behaving this way, or, you know, forest without tree, without leaves, right? so like there’s this gesture toward capacity, towards presence that fails.”
Then Ocean continues, “Isn’t this what Buddhism means by nothingness?” At that moment—dding—something clicked. I think here, “fail” does not mean failure. It feels more like a temporal condition where already and not yet coexist—a state in which ruins, stories, and beings are present but not yet fully manifested. Things that exist, but remain unseen. Anyway, returning to what I was saying—let’s talk about To Yuen Tong Temple, the origin point of all these questions.
Among the gods, there is something like popularity. Each region has its own most beloved deities—usually the mainstream ones: Guanyin (觀音), Guan Di (關帝), Mazu (媽祖), and others. Their temples are easy to find in any city center. The Seven Fairies, however, are not part of that mainstream—especially not in Hong Kong. Yet they are not entirely marginal either. At least before the 1970s, in Guangdong and Hong Kong, the Seven Fairies Festival was grand, common, even ordinary.
Now, at least in Hong Kong, you must leave the city to see them—to Tsuen Wan, about an hour away, or by ferry to Peng Chau or Lantau Island. There’s a sadness in that, that you can’t see them every day. But perhaps that is what makes them special—you have to make time, prepare, and go deliberately. Because of them, I got to travel; perhaps that was their real gift. During my three months in Hong Kong and China, I wandered all over under the pretext of “temple visits.”




A few people joined us on the trip to the Seven Fairies Temple on Lantau Island—excited like schoolchildren on a field trip. There were six of us in total, different ages, backgrounds, and levels of knowledge about the subject, yet that day everything flowed easily; each of us was moved in our own way.
After getting off the ferry, we walked deep into Luk Tei Tong Village, then climbed a hill—and finally arrived at the Seven Fairies Temple. It was far more sacred than I had imagined, so much that the energy of it startled me. The temple’s history, gathered from fragments and online traces, is quite unusual:
It was founded and run entirely by women. Around the 1970s—some say the 1960s—five women from the village built it together. At first, they enshrined Guanyin Bodhisattva and provided lodging for retired, unmarried women. Among the founders were “Mei Gu” (妹姑, “Younger Aunt”), whose real name was Luo Mei (羅妹), and “Sa So” (四嫂, “Fourth Aunt”), Liu Liwanzhang (劉李玩璋). Mei Gu, the first abbess, led the temple until Sa So took over. Others—Liu Zhou Yuying (劉周玉英), Wu Chen Shuyou (吳陳淑有), and Huang Qu Ruiqing (黃區瑞清)—are less known.
These women purchased the land themselves, built a base for their activities, and gradually began to enshrine more deities. The Seven Fairies became one of them. Later, disputes arose with local residents over land use. In the mid-2010s, villagers discovered bone niches containing the remains of the deceasedbeing installed inside the temple and filed complaints. The caretaker, Liu Liwanzhang (Sa So), explained that she only wanted to provide a resting place for her disciples and believers who had studied the scriptures with her—that it was not for profit but charity. Still, the government rejected the application, and the project was halted.1






What struck me most inside the temple was first the hall of the deceased, filled with women’s tablets—some accompanied by photographs of female shamans. On the tablets were words like 仙姑 (xian gu, “female immortal / shaman” in Cantonese-Daoist tradition), 修蓮女 (“female cultivator who chants scriptures and joins oracular rites without formal ordination”), 妹姑 (“younger female shaman, or early-stage spirit medium”), and 嫂 (“aunt,” used honorifically for elder women who lead shamanic rituals”). From these alone, it was clear that they were not mere religious devotees—they were shamans.
I began to wonder: could these women have been ZhaiGu (齋姑) of Xiantian Dao (先天道)?
Xiantian Dao was a popular Daoist movement led by women during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periods, worshipping goddesses like Guanyin (觀音) and Yaochi Jinmu (瑤池金母), emphasizing mediumistic communication with the divine. If Buddhism sought enlightenment, Xiantian Dao sought revelation—to convey divine messages and to sustain networks of care.2
In Hong Kong and South China, many vegetarian halls (齋堂) emerged from this tradition—spaces where unmarried women and widows lived together in spiritual sisterhood, maintaining bonds with the divine through chanting and trance. There was even a Xiantian Dao hall in Tai Po District’s Dapu Village (大埔區 運頭塘) with the same name—To Yuen Tong. A temple led by women, housing female mediums, offering food and lodging to women, managing ancestral tablets after death. In the Seven Fairies scriptures found there, phrases implying Xiantian Dao appeared repeatedly. It made me think—this must have been a place where Zhai Gu once lived.
Our friend and local researcher, Belinda, shared another story. She had known this temple for years and once visited during the Seven Fairies Festival. She told us she had witnessed something astonishing: at the time, Liu Liwanzhang, then ninety, was too old to manage the temple, and a young woman from outside had begun assisting her. During one festival, Belinda saw that young woman suddenly possessed by the Seven Fairies. She began dancing, speaking in a high tone, behaving like someone else for about thirty minutes. Perhaps the Seven Fairies descended, moved by her devotion, and chose her as their new medium. But afterward, no one knew what became of her. She wasn’t there when we visited. The temple looked neglected; no women seemed to live there anymore. The communal kitchen was covered in dust and cobwebs.






When we went to To Yuen Tong, I only wanted to ask the Seven Fairies for advice about the festival we were preparing at the CHAT museum in September. But the unexpected atmosphere—the strange heaviness of the place, the questions it stirred—lingered, weighing on my mind.
Through these three months of research—and even now, with all my questions still unresolved—I keep asking myself what we can actually learn from those women’s communities of the past. I think I was hoping for an answer of a particular kind, something to assure or console me. But we—I—no longer live in that generation. The circumstances that made it necessary for women to gather and live together under shared faith were bound to another time.
Today, women can live alone, earn their own living, shape their own worlds. As for me, I can’t even imagine myself living in the mountains, far from the city. I don’t want to live frugally like the Comb Sisters of Wanjing Temple (蘊貞堂). I want to live surrounded by beauty, to live secularly, to live lavishly.
More importantly, I think of AFSAR as a kind of public garden (like what Hye-in said)—a place that is precious and communal, but also one where I can shine on my own terms, join sometimes, step back sometimes. I don’t want “together” to be the front of everything.
And besides, gods always reflect the desires of their time, many goddesses are tied to fertility, childbirth, the values of traditional family life. Maybe it’s time their stories were rewritten. Many Taoist or folk goddesses were once human—women who were remarkable in their own time, known in their villages, who refused marriage and became deities by choice. I want to look at their brilliance, their power, through the lens of fandom. Perhaps they, too, must have felt frustrated. In life, they were famed for martial skill or wisdom, and now they spend eternity bestowing babies. And even those who once prayed for children are dwindling.



Recently, a friend listened to my long ramblings and said, “But we don’t really need that kind of women’s community anymore.” And I agreed. Right—that kind we don’t need. But that doesn’t mean we don’t need community. Or more precisely, it doesn’t mean we no longer need the sense of community.
Maybe that sense no longer depends on a physical place or lifelong devotion, but on something like a returning temporality—a space-time that allows for reappearance, for revisiting. If AFSAR is a public park, then its communal power lies in the fact that anyone can return to it, again and again. It is a ritual time.
And in that sense, there’s no need for constant communication between members. As Byung-Chul Han writes in The Disappearance of Rituals: A Topology of the Present, we live in an age of excessive communication. But communication doesn’t create community. I’ve spent too much time and energy translating the world, translating myself. I used to think that was my life’s work. But perhaps what I really need to learn now is how to create a space that endures without translation, a space that doesn’t require exhaustion.
Anyway, back to where we were, at the Seven Fairies Festival in Hong Kong, I realized that I had already imagined what I wanted to see—and when it didn’t appear, I carelessly asked, “Why?” Why aren’t women gathering publicly to celebrate? Where have all the ZhaiGu gone? Where are the mediums of the temples? Why has the Seven Fairies faith faded from Hong Kong?
Around the time of the festival, I felt a strange fatigue. We couldn’t visit all seven Seven Fairies temples across Hong Kong, so we went to three: one in Kwong Pan Tin Tsuen in Tsuen Wan, another near Chat Sing Kung, and one on Peng Chau Island.



As expected, there were no women gatherings. Most rituals were led by Taoists—nine out of ten, maybe all of them, men. There are female devotees who practice, yes, but you mostly see them in Buddhist temples, and they don’t lead the rituals. If you’re curious why women traditionally couldn’t become Taoists, or how outdated that idea really is, watch the Hong Kong film The Last Dance by Anselm Chan.


The festival in Kwong Pan Tin Tsuen felt less like a public celebration and more like a village gathering—a kind of annual reunion. (I’ll talk more about the devotees of the Seven Fairies in my next letter.) Most of them were middle-aged men who clearly knew each other well. There was an ancestor hall beside the shrine. A few women were present, but they seemed to be there with husbands or families, part of household blessings.
When I asked a local friend why women weren’t there, she said, “They usually light incense and pray at home. And anyway, women from this village move away after marriage.”
So perhaps the female-led rituals disappeared around late 1970s. Even then, they were never official temple events, but neighborhood gatherings—women pooling money through the year and holding rooftop or street festivals. (Elder women we interviewed, former textile workers, remembered them not as a form of faith, but as a social custom of their time.)
When attending the festival, we witnessed its final highlight—the possession by Seven Fairies. Apparently, it happens every year to the same person, who is now a male medium. Villagers lined up to meet him, receiving short blessings. He spoke in a high, like ‘feminine’ tone, greeting each person with a simple phrase like “Stay healthy.”
I was nervous. Since last year in Taiwan, I had thought of the Seven Fairies as my unseen companions, the ones who had led me here. And now they are here, speaking through this man? His words are their words to me? But there was nothing mystical about it. The moment lasted maybe ten seconds. I felt nothing.
Back in the hotel room, Fiber said, “I don’t get it. The Seven Fairies are always with us—so why do we need to meet this medium?” She was puzzled by the idea of a single chosen one. I agreed. A shaman is not a superstar chosen by the gods. A shaman, as Ocean Vuong once said, is someone who tells stories about “a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a person with slightly sharper sight, offering that vision to those who see less.
A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 That was the exact feeling I carried through all three months. Yet, as the saying goes, the things nearest to us are often the hardest to see. I kept asking, perhaps foolishly, “Then where are they?”—the women of the festivals, the women of the shrines, the female devotees, the shamans, their stories.
Only after returning to Berlin did I realize: they were always there. We didn’t fail to meet them—my vision simply wasn’t clear enough to see.
What do I mean by that? That everything we encountered, everything we recorded during those three months—that was them. As I reviewed the footage back in Berlin, I found countless women’s faces within it: the friends who gathered for this journey, the new people we met, the ladies from CHAT museum, the group of women at the temples sitting quietly beside the ritual stages, the praying hands, the handkerchiefs wiping tears, the sunglasses on a terrace watching the Mazu parade, the wrinkled hands crafting festival ornaments, the curious, caring eyes I met while traveling—my camera had followed them all, endlessly.
So why was I still asking where they were? How silly of me.
There were no shamans or devotees left at To Yuen Tong Temple, but we were there. There were the incense sticks we lit, the flowers we placed, the offerings and prayers we left at the Seven Fairies Temple on Peng Chau Island. Wasn’t our journey itself the manifesting of that “presence that fails to manifest”?
This letter has already grown too long, so I’ll stop here for today. In the next one, I’ll bring stories from our travels in China. (it will be shorter than this one, promise!)
October 16, 2025
Mooni Perry
On Death and the Hungry Ghosts
Hello readers,
I was trying to write about my travels in China, but somehow the writing refused to move forward. So I decided to begin with today’s story instead. Today is about death. Between July and September, while I was in Hong Kong and China, the most dominant theme that surfaced again and again was that of the soul and death. I feel that I must digest this story first, so that the next ones can follow naturally. Let’s begin briefly with what the Hungry Ghost Festival is:
The Zhongyuan Festival (中元節) is an East Asian ritual dedicated to ancestral and wandering spirits, born from the fusion of Buddhism’s Ullambana (盂蘭盆節), Daoism’s Three Primordial Beliefs (三元思想), and Confucian filial piety.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lunar month—the day when the gate of the underworld opens—it is believed that hungry souls return to the living world. People offer food, burn joss paper, and pray for the peace of both ancestors and orphaned spirits.
In Daoism, this day celebrates the birthday of the Earth Official (地官大帝), who pardons human sins. In Buddhism, it is explained through the Ullambana Sutra, in which Maudgalyāyana rescues his mother from hell. Across Hong Kong, mainland China, Taiwan, and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the day is known as the “Ghost Festival” (鬼節). Temples and streets host pudu (普渡)—rituals of universal salvation—and floating lanterns are set upon the sea to guide lost souls. The Zhongyuan Festival is thus a rite of consolation for the dead and a communal act through which the living reconnect with the cosmic order—a celebration that bridges life and death.1
I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this Hungry Ghost festival in Shantou, China. It was late at night, and before the main ritual began, we visited a nearby Buddhist temple to sense the atmosphere.
Each culture understands death and the soul differently. In East Asia,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Daoism, and various folk beliefs, diverse customs surrounding death have evolved in each region.
As we all know, nothing on earth exists only in physical form. Every being consists of both body and soul. In Korean shamanism, the soul is divided into three aspects: yeong (靈), hon (魂), and neok (魄). When a person dies, yeongascends to heaven, hon is judged in the underworld over 49 days, and neoklingers for 21 days at the site of death before fading or remaining in this world, often bound by the emotion felt at death—such as resentment or sorrow.
Souls who have long been dead but have not yet reincarnated—those who remain in this world—gradually forget the reason for their death, retaining only their grievance or longing. They wander endlessly and sometimes possess or harm the living. It is the role of shamans to soothe these spirits and help them move on.
In Hong Kong and China, the Hungry Ghost Festival refers to these very souls: hungry ghosts—the wuzhu guhun (無主孤魂), “ownerless wandering spirits.” These are the souls who have no descendants to make offerings for them. In Buddhist terms, they are called agui (餓鬼) or orphaned spirits (孤魂): beings tormented by endless hunger and thirst, roaming between worlds.
Growing up in Korea*, a Confucian society where death rituals mostly concern one’s own ancestors, I found the Hungry Ghost Festival deeply beautiful. To me, it appeared as an act of love for the distant.
In Hong Kong, people celebrate the festival throughout the entire month of August. Not only are food offerings placed outside shops for the wandering souls, but all sorts of paper objects—joss money, paper houses, daily items—are also burned so the dead may use them in the afterlife.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is festival felt special to me. First, everyone participates. Although many temples host grand ceremonies led by monks and daoist priests, the festival is much closer to everyday life. Even without going to a temple, you encounter it everywhere: outside restaurants, in front of homes, on the street corners.
Hong Kong, in particular, is famous for the ritual called “Break the Hell” (破地獄 / Po Dìyù)—literally, to break open hell. I will explain more about this later.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festival comforts unrelated souls—those with no family, no name. In Korea, ancestral rites are performed for one’s own kin; that feels familiar. But the essence of the Hungry Ghost Festival is not about honoring those linked by blood/relations—it is about pitying and caring for those who have no one.
Finally, the festival is not a one-time offering but a month-long continuum of rituals and festivities. Operas for the dead, parades, and ceremonies fill the streets. While some rituals in temples are quiet and solemn, most are vibrant—filled with extravagant paper crafts, music, and performance, overflowing with a sense of joy.
(*Of course, in Korea as well, shamans regularly perform cheondo-jae—rituals of salvation—for the many restless, wandering souls. But what distinguished Hong Kong was that these rites were not conducted only by special figures such as shamans or in temples; everyone took part in them.)
What does it mean to console and soothe the forgotten dead? Is it only to prevent them from harming the living? Perhaps partly. Yet to me, it felt like something far more fundamental—a natural instinct of all living beings: compassion without return. The simple kindness of moving a snail off a sidewalk so it won’t be crushed by a bicycle—a gift given without expectation.


One rainy evening in Hong Kong, I witnessed the Break the Hell破地獄 ritual. Many people stood in long lines, each holding a paper tablet bearing the names of their ancestors. Daoists carried these tablets and jumped—literally—through blazing fire over and over again, symbolically opening the gates of hell and releasing karmic suffering. What struck me most, however, was what a local researcher, Belinda, explained: although the daoists hold the ancestral tablets, it is the ancestors themselves who act as intermediaries—they open the gate for the orphaned souls, helping to liberate them.
The rituals I grew up with were always about preserving the inner circle of kinship—family, lineage. The Hungry Ghost Festival, however, expands those boundaries. It is, in essence, a day for all souls—a gesture of compassion rooted in the recognition that, ultimately, all are our ancestors.
Ancestral rites remember the remembered; the Hungry Ghost Festival remembers the forgotten. Through it, the “I” expands beyond myself, my family, my small circle—toward a larger sense of kinship.
Lately I have been thinking constantly about death. There is a strange comfort in knowing that things end. To have a place to return after all this play. The awareness of an ending softens the anxiety of living; life feels, somehow, already complete in itself.
My growing interest in religion has led me to wonder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ghosts, spirits, and gods—and where the living stand among them. Perhaps, I think, they are all one and linked.
As I continue my study of Korean shamanism, I’ve come to see it—despite regional variations—as a kind of animism blended with Confucianism. Everything in the world is believed to have spirit; life and death are seen as a circulation of souls. Yet relationships with spirits are understood in a distinctly Confucian way. Gods appear to me as ancestors—elder figures of the house. In shamanic belief, some people are accompanied by both ancestral and heavenly spirits; one may come first, the other later. Usually, it is the ancestral spirit who arrives first, as a guardian.
In Buddhism, the Zhongyuan Festival is called Ullambana Zhai (盂蘭盆齋). People often confuse je (祭) and jae (齋): the former means offering food to gods or ancestors, while the latter means purific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ritual. Yet the Hungry Ghost Festival combines both—jae here signifies a complete rite that both consoles the dead and purifies the living.
I wish this spirit of this jae could dwell in my everyday life—to live as both the wandering ghost and the moon above; to look at myself and the world with compassion..
I will end here for today. (Today is Halloween!)
October 31, 2025
Mooni Perry
Mooni Perry explores ‘double-fallen’ identities – those who exist between categories of gender, history and belonging – through moving image, East Asian cosmology, and speculative fiction. She co-founded Asian Feminist Studio for Art and Research (AFSAR), and as a founder and member, she works with many collaborators through shared study and collective art-making. She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Missings: From Baikal to Heaven Lake, from Manchuria to Kailong Temple (Westfälischer Kunstverein, 2025), Research With Me, Missing: Not Even Returning as Ghosts (Kumho Museum of Art, 2022). She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2025), Neuer Berliner Kunstverein(2024), Kai Art Center(2022), ARKO Art Center(2022), and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Berlin(2021). She received the ars viva prize in 2021.
1 Ilaria Maria Sala and Guo Ting, “The Fertility Goddess: A Visit to Hong Kong’s Golden Flower Temple,” Zolima CityMag, August 19, 2020; “To Yuen Tung: To Yuen Tung and its religious rituals,” South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antau Office, accessed November 6, 2025,; “盂蘭節七姐誕虔拜祈消瘟,” 香港商報, September 3, 2020; “骨灰龕條例 梅窩隱世古剎申請做骨灰龕 村民憂破壞寧靜擬抗爭,” HK01, April 20, 2018.
2 志賀市子, “地方道教之形成:廣東地區扶鸞結社運動之興起與演變(1838–1953”, 《道教研究學報:宗教、歷史與社會》 (Daoism: Religion, History and Society), no. 2 (2010): 231–267.; “第三章 先天道道堂的传统与现在, ”豆瓣读书, accessed November 6, 2025,
1 노성환, 「대만의 중원제에 관한 일고찰: 基隆의 中元祭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 no. 34 (2013): 293–312.; 김성순, 「동아시아의 우란분절 수용에 나타난 의미의 확대와 변용 양상: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주고받음’의 축제」, 종교연구 50 (2008): 187–218. 참고.
천우속 #1, 그러나 우리는 이 언어 속에서 만났다 天雨粟 #1, 我们在这个语言中相遇 (Grounds of Coherence #1, but this is the language we met in) (2023)



쉔신, 〈천우속 #1, 그러나 우리는 이 언어 속에서 만났다〉, 2023,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16초
‘천우속(天雨粟)’은 『회남자(淮南子)』 에 유래한 구절로, 문자가 탄생한 순간, 세계가 뒤흔들릴만큼 변화가 일어났다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서 서툴게 문자를 따라 쓰는 손가락, 아랍어와 위구르어 단어를 발음하는 목소리와 그에 맞춰 나타나는 자막,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번역어들, 시위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목소리들, 새 소리가 귀에 울리는 순간들처럼 온갖 종류의 언어들이 끊임없이 어긋나고 또 겹쳐집니다. 복수의 시공간이 동시적으로 뒤섞이고,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 인물, 사건, 시간, 공간의 연쇄를 통해 상징적 언어와 감각적 경험이 거대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타인의 상실과 고통처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가 밟고 선 자리에서 비롯된 이해로부터 사유를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Shen Xin, 天雨粟 #1, 我们在这个语言中相遇 (Grounds of Coherence #1, but this is the language we met in), 2023, two-channel video, color, sound, 12min. 16sec.
The title Grounds of Coherence (天雨粟) is taken from the ancient Chinese text Huainanzi (淮南子, Masters from Huainan), symbolically expressing how the birth of the written word represented a transformation momentous enough to shake the world. On a computer screen, various forms of language constantly appear in overlapping and misaligned ways: a finger crudely tracing over characters, a voice sounding out Arabic and Uyghur words with accompanying subtitles, translation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voices converging at a demonstration, conversations in foreign languages adopted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sounds of birds ringing in a person’s ears. This great state of entanglement is conveyed through symbolic language and sensory experience by way of figures who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and a chain of events, moments, and spaces. The artist thus suggests that when faced with limitations that cannot be fully understood—such as the loss and suffering of others—we should begin with understanding from our own position.
쉔신은 땅으로부터 형성된 공동체, 역사, 기억, 언어의 관계를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속감의 문제를 다룬다. 실체 없는 차이를 ‘경계’로 규정해 온 사고 방식을 포기하는 태도를 기르며, 진실을 단일한 정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들의 힘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개인전으로 《Mink and Berry》(TINA, 2025), 《but this is the language we met in》(Richmond Art Gallery, 2024), 《one, arriving at floodplains》(MadeIn Gallery, 2023) 등을 개최했으며, 퐁피두 센터 파리(2024), 제14회 상하이 비엔날레(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23)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Through epistemic relationships manifested from the land, Shen Xin tells stories that reconstruct terms of innate belonging against territories of nation states. Nurturing the renunciation of boundaries drawn with reified absence, their practice is of habituation towards truth as kindred capacities. They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Mink and Berry(TINA, 2025), but this is the language we met in(Richmond Art Gallery, 2024), and one, arriving at floodplains(MadeIn Gallery, 2023). They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the Centre Pompidou, Paris(2024), the 14th Shanghai Biennale(2023), and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2023).
큐레토리얼 콜로니얼리즘을 다시 사유하기 Rethinking Curatorial Colonialism
큐레토리얼은 예술과 행동주의의 확장에서 어떻게 콜로니얼리즘의 한 형태로 기능해 왔는가? 주체성을 내세우는 큐레토리얼 담론의 의지와, 사회적·정치적 균열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이 에세이는 예술과 행동주의를 제도 비판을 향한 하나의 지식 아카이브로 전환하려는 큐레토리얼 지식의 식민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보다 진정한 개입과 참여가 가능해질 또 다른 경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우리가 ‘큐레토리얼(the curatorial)’이라 부르게 된 범주를 통해 지식 생산에 대한 원대한 통찰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기보다, 큐레토리얼이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 작동하는 담론적 가치의 작동 조건과 그 범위를 다시 사유해 보려는 시도에 더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담론적 가치란, 마리아 린드(Maria Lind)와 골드스미스 칼리지(Goldsmiths College)의 큐레토리얼/지식(Curatorial/Knowledge) 프로그램의 필자, 큐레이터들이 활용한 ‘큐레토리얼’이라는 용어가, 학제 간 지식의 지도화(mapping)와 담론적 실천을 수사적으로 대표하게 된 오늘날의 상황을 가리킨다.1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큐레토리얼의 작동을 일종의 ‘커머닝(commoning)’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큐레이팅을 단순히 전시를 구성하는 행위나 실천으로, 혹은 현대미술 이전 시대의 소장품을 관리하는 이해하는 관점과는 대비된다. ‘큐레토리얼(the curatorial)’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철학적으로 변혁적이라 주장되는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조금 더 호의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럽과 미국 밖의 지역에서 지배적인 큐레토리얼 탐구 방식과 그에 수반되는 제도적 기준이 비판 없이 답습되는 상황을 경계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는 제도적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1990년대 이후 큐레토리얼은 하나의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계몽주의적 이성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큐레토리얼 담론이 비판적이고 자기반성적인 태도를 취하려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모순이 남아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계의 주변부에서 비롯된 예술과 행동주의를 다룰 때 드러나는 큐레토리얼의 목적과 동기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큐레토리얼은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민화의 틀을 내포해 왔다. 이는 큐레토리얼이 긴급한 사회적 문제들을 제도적 언어로 번역해, 반성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지식의 형태로 바꾸어온 과정과 맞닿아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주변부에서 비롯된 예술과 행동주의는 제1세계의 제도 비판을 뒷받침하는 아카이브로 흡수되고, 그 결과로써 동시대적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현실의 갈등과 협상의 한복판, 그리고 구체적인 참여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제의 교육 과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현장의 땀과 눈물, 그리고 거칠고 생생한 현실감에 누가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어쩌면 이런 일들은 애초부터 런던에서 이론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말이다.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럽과 미국 밖의 지역에서 지배적인 큐레토리얼 탐구 방식과 그에 수반되는 제도적 기준이 비판 없이 답습되는 상황을 경계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관점을 이릿 로고프(Irit Rogoff)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심포지엄에서 진행한 강연, 〈확장의 장(Sites of Construction)〉에서 발견했다.3 로고프는 문화 인프라나 제도적 지원이 있다고 해서 더 높은 수준의 문화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락스 미디어 컬렉티브(Raqs Media Collective), 콜렉티보 시투아시오네스(Colectivo Situaciones), 투쿠만 아르데(Tucumán Arde), 오다 프로젝트(Oda Projesi), 엑스-어번(X-Urban) 등 예술가 주도의 여러 이니셔티브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사회적 실천의 형태를 취하거나 비판이론과의 교류 속에서 전개되는 프로젝트들로, 서로 다른 결과와 방식을 보여주지만 특정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 대응하는 지역적 실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로고프는 이러한 시도를 예술과 행동주의의 접점에서 이해하며, 그것들이 기존 제도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시대성’의 개념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시대 구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여러 층위의 ‘긴급한 문제들’을 통해 구성되며, 동시대 미술과 과거와의 관계는 현재의 정치적이고도 이념적인 투쟁 속에서 어떠한 효용을 지니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실천이 목록화되고 추상화되는 순간, 그것들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포섭된다. 이 과정에서 예술의 창의적 전략을 활용해 사회적 변화를 실천하려는 행동주의적 실천은 기존의, 대체로 서구 중심적인 큐레토리얼 제도와 모델을 해체하려는 시도와 담론 생산의 ‘성공 사례’를 규정하려는 기획 속에서 아카이브의 일부로 흡수된다. 갈등과 협상의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실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에서, 현장의 구체성과 살아 있는 현실감에 누가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결국 그것은 런던의 이론적 언어 속에서 다시 추상화되고 만다.
큐레토리얼 장치로서 동남아시아
이 문제를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대립 구도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큐레토리얼 사고와 실천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태국 정세는 흑백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 없는, 끊임없이 변하고 뒤섞이는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태국의 복잡한 현실은 대중운동이 언제나 ‘민중’을 대표하는 민주적 힘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설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은 종종 민주주의의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콕 예술문화센터(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BACC)의 앞 거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컨셉, 콘텍스트, 콘테스테이션: 동남아시아의 예술과 집합성(Concept Context Contestation: Art and the Collective in Southeast Asia)》이라는 대규모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는 “지역적 맥락에서 비롯된 개념적 사고를 통해 관객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예술 실천”을 조명하며, 지난 40여 년간 동남아시아 현대미술 속에서 개념적 접근과 사회적 이념이 맺어온 긴밀한 관계를 탐구하고 있었다.4
거리에서 벌어지던 투쟁의 양상과, 미술관 안에서 전개된 추상화된 ‘논쟁의 장’ 사이의 대립은 그야말로 극명했다. 그 안에서 ‘사회적 정의’는 예술가를 행동가이자 개념적 주체로 소환하고 있었다. 전시는 ‘동남아시아’에서 비롯된 개념미술 작품들을 한데 모아 배열하며, 그것들을 동시에 아카이브이자 사회 비평의 형식으로 제시했다.
세상에는 큐레토리얼의 개입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존재할까?
전시에 참여한 대부분의 예술가가 이미 미술 시장과 컬렉터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들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동남아시아의 개념미술이 정치적 감수성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큐레토리얼의 전제는 지나치게 모호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5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채, 역사, 기억, 정치라는 주제에 대한 피상적인 예술적 접근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큐레토리얼은 제도적 담론이 급진적인 정치성을 흡수하고 제도화해 버리는 과정을 드러내는 징후로 읽힌다. 전시는 국가별로 분리된 미술사적 경계를 넘어 ‘공유된 역사’를 상정하기 위해 지역을 비교의 틀로 설정하며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직면하지는 못했다. 전시는 수사적 장치 혹은 기획의 틀을 통해 개별적인 입장과 역사를 하나의 틀로 추상화시켰고, 방콕 예술문화센터 바깥의 거리에서 분출된 생생한 에너지와 견주어볼 때, 큐레토리얼의 실천은 저항의 질감과 그 동기, 맥락, 그리고 개념마저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는 정치적 행동주의의 가능성을 기획된 아카이브로 보여주고자 한 전시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예술적 체계 안에 포섭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앞 선 비교는 “동시대 미술”이 하나의 생태이자 제도로서 과연 현실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이어지는 논의는 몇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몇 해 전 아트 바젤 홍콩의 좌담에서, 쩡추차이(Tsang Tsou Choi), 흔히 ‘카오룽의 왕(The King of Kowloon)’으로 알려진, 괴이한 낙서 서예가에 관한 신간 단행본 출간 행사 중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다.6
흥미를 끌었던 것은, 당시 대화에서 중국의 문화비평가 오우 닝이 쩡추차이의 미술 실천과 홍콩의 젊은 행동주의 인물인 조슈아 웡(Joshua Wong)을 나란히 비교했다는 점이었다. ‘우산 운동’7 이전부터 조슈아 웡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그는 2011년 ‘학민사조(Scholarism)’라는 단체를 설립해 중, 고등학생들을 모으고, 홍콩 교육청이 추진하던 ‘도덕 및 국가교육(Moral and National Education)’ 교과 과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새로 도입된 교육과정은 홍콩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홍콩의 젊은 세대는 이 변화를, 특히 중국의 홍콩 주권을 다루는 방식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도로 받아들였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으로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고, 당시 홍콩은 보통선거를 포함한 폭넓은 자치권을 유지할 것이라 약속받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 약속은 여전히 논쟁 속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우 닝이 이 두 현상을 서로 연결해 사고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오우 닝의 발언을 말레이시아의 작가이자 행동가인 일리 파르하나(Ili Farhana)의 발언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파르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도 말레이시아에서 예술과 행동주의가 만나는 일은 여전히 드물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처럼 보기 어렵다. 말레이시아의 시위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단조롭고 형식적이다. 대체로 연설이나 격한 비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것만으로는 결국 대중의 흐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대중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 그 힘으로부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8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시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불안이 존재한다. 시위는 반드시 ‘창의적 요소’를 포함해야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시위에 예술적 감각이나 표현을 더함으로써 정치의 단조로움과 피로감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만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런 태도는 예술의 범위를 새롭게 확장하려는 시도이자, 다소 순진하게는 정치를 보다 창의적인 것으로 다시 상상하려는 시도다. 반면 오우 닝(Ou Ning)과 같은 인물은 사회적 시위 속에서 그런 창의적 장치나 미적 개입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 그에게 시위의 형식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예술적이다. 따라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제도적 영역에서 역사가, 큐레이터,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현실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소비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담론’ 속에 편입시키는 일에 그칠 뿐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거대한 정치적 쟁점과 그 안에서 창의적이고도 미적인 실천이 놓이는 지점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연결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는 대중운동과 그 에너지 자체를 일종의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집트, 이스탄불의 타크심 게지 공원, 시리아, 방콕, 대만의 사례를 떠올려보라. 우리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태의 창조적 생명력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몇 년간 아시아에서 벌어진 가장 비예술적인 논란들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알빈 탄(Alvin Tan)과 비비안 리(Vivian Lee), ‘알비비(Alvivi)’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커플은 온라인에 사적인 영상을 공개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들은 2012년 유튜브에서 자신의 성생활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고백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그 노골적인 행위와 대담함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중 모두에게 충격과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성과 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사례는 싱가포르의 문제적 인물 아모스 이(Amos Yee)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소개한다. 열세 살 때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그는, 『모비 딕』 서평에서부터 직접 만든 단편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왔다. 그가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된 것은 2015년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정치 지도자 리콴유(Lee Kuan Yew)가 사망한 직후, 기독교 우파와 리콴유 모두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상을 게시하면서부터였다.
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에게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의 근본적인 문화적 불신은 체제의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체계화되고 산업화된 교육 방식 전반에 대한 깊은 의심이다. 시몽 카스테(Simon Castets)와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가 1989년 이후 출생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찾아 나서며, 제도화된 담론의 언어와 예술 제도의 규범 안에서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을 주목했다면,9 알비비와 아모스 이는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 담론이 만들어내는 규범과 힘에 포섭되거나 통제되기를 거부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문명적 태도나 순응의 방식을 거부하는 급진적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바드 칼리지(Bard College), 골드스미스(Goldsmiths), 드 아펠(de Appel)과 같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큐레이터 교육이 점점 더 중시되는 오늘날의 큐레토리얼 생태 속에서, 앞서 언급한 이러한 ‘예술가들’이 지나친 반항성과 공격성으로 인해 그 체계 안에 포섭되거나 길들여질 수 없는 존재로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결국 한 질문에 이르게 된다. 과연 세상에는 큐레토리얼 사고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현상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큐레토리얼이 그 작동 논리를 계몽주의적 이성에 일정 부분 빚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한 사유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성과 담론의 언어로는 끝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나는 오우닝의 논리처럼, 알비비와 아모스 이의 행위를 일종의 문화적 실천, 더 나아가 ‘예술’로까지 규정하며 그것을 동시대적 조건이나 문화, 혹은 예술에 대한 큐레토리얼한 지식의 틀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의 행위를 미술사적이거나 큐레토리얼한 지식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다시 말해 담론 속에 식민화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들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시각문화사 서사 속에 포함시키거나 전시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알비비와 아모스 이의 행위가 예술과 행동주의를 결합해 이해하려는 우리가 설정한 담론적 틀을 훨씬 넘어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다른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나는 오히려 그들의 사례를, 큐레토리얼이라는 장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개념적 맹점을 비추는 거울로 제시하고 싶다. 스스로를 ‘진보적’이라 부르는 이 장은 여전히 유행에 민감하고, 자유주의적이며, 전향적인 사고 방식을 표방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맺는 방법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알고자 하는 욕망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특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큐레이터가 알고 있는 데로, 그러나 종종 이상적인 태도로만 여겨지고 실제로는 필수적인 전제나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어떤 태도를 조심스레 제안하고자 한다. 모든 작업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충동은 긴급함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이는 끊임없는 탐구와 사유를 이어가는 일종의 인류학적 태도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큐레토리얼을 단순히 해체의 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연구는 큐레토리얼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과정 자체를 되풀이해 성찰하는 데 머물기보다, 그 바탕에 놓인 전제들을 실질적으로 해명하고 풀어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앞선 논의를 이어가자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도식으로 그려내고 구획하려는 폭력적인 시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큐레토리얼이 세계를 무대 위에서 재현하듯 엮어내며, 여러 학문적 영역과 지식의 체계, 지리적 맥락을 한데 묶어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어떤 서술의 틀을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이해는 타인을 ‘경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타자는 더 이상 제도적 특권을 지닌 이들이 자신들의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 호출하는 아카이브로만 존재하지 않게 된다.
큐레토리얼 지식의 확장된 개념을 보여주는 영화를 한 사례로 들고자 한다. 이는 내가 큐레토리얼을 지식과 실천의 형태로 확장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논의가 향해 온 특정한 방향들에 의문을 던지고자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큐레토리얼이 스스로를 전시 공간이나 전시 행위에 한정된 실천으로 고정하지 않으려 했던 본래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탄 핀 핀(Tan Pin Pin)의 다큐멘터리 영화 〈비망록: 보이지 않는 도시(Invisible City)〉(2007)로, 사소한 개인들의 삶을 기록하지만, 싱가포르의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 다큐멘터리를 회고하며 탄 핀 핀은 이렇게 말한다. “나처럼 ‘싱가포르’를 자신의 작업 주제로 삼은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싱가포르가 아니라, 싱가포르 자체가 작업의 중심이 되는 경우다.10
영화는 네 인물의 시선을 통해 싱가포르를 탐색한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가 독립을 맞이하던 격동의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로, 1950년대 싱가포르와 말라야의 토착 공동체를 촬영한 수많은 영화를 남긴 아이반 폴루닌(Ivan Polunin), 지금은 사라진 오래된 건물들을 1950년대에 담아낸 사진가 마저리 도게트(Marjorie Doggett), 중국계 중등학교 학생 시위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는 전 학생운동가 한 탄 주안(Han Tan Juan),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 60년 된 군사 벙커를 발굴하는 고고학자 림 첸 시안(Lim Chen Sian)이다. 이들의 기록은 개인적 집착이자 기억, 그리고 때로는 트라우마에 가깝지만, 서로의 목소리가 겹치고 울려 퍼질 때 영화는 싱가포르의 정치사가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 질감으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 속 섬의 풍경을 펼쳐 보인다.
이 집요한 기록이 흥미로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탈국가적 전환’의 담론 속에서 오히려 지역에 뿌리내린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져 왔다.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런 흐름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다. 세계를 단 하나의 시선이나 사고의 틀에서만 바라보려는 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군사 벙커 속에서 50년 된 코카콜라 병을 발굴하는 일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의문을 단순히 비웃거나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 만들기의 과정이 하나의 큐레토리얼한 실천으로 작동하며, 한 고고학자의 개인적 집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는다. 이는 큐레이팅이라는 행위 자체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영화는 오늘날 동시대성의 표지로 여겨지는 공존이나 동등성의 감각에 관한 단호한 거부의 태도를 보인다. '글로벌'을 하나의 회로로 설정해 그것을 '국가'와 대립시키는 대신, '로컬'은 공식적인 국가 서사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성과 잠재력을 지닌 역사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유는 세계를 따라잡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하고, 다른 위치에서부터 세계를 향해 발언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의 역사는 특정한 중심이 아니라, 그 바깥의 또 다른 시선과 장소들로부터 형성된다.
감독 탄 핀 핀이 1950년대 열대 질병 연구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말라야의 토착 공동체를 컬러 필름에 담았던 의사 아이반 폴루닌(Ivan Polunin)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흥미로운 정지의 순간이 찾아온다. 인터뷰를 이어가던 탄이 자신의 ‘큐레토리얼한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미묘히 막다른 지점에 다다른다.
(카메라 밖):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반: 물론 물어보는 건 자유지요. 다만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카메라 밖):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이반: 그 대답이 만족스러울지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이 장면은 두 번째 논점을 시사한다. 앞선 대화는 감독이 인터뷰 대상과 마주하며 그를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과정에서 겪는 긴장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대상을 해석해야 하는 순간에 요구되는, 일종의 ‘큐레토리얼 진정성(curatorial sincerity)’이 발현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탄 핀 핀의 영화에서 호기심은 단순히 학문적 사고를 해체하기 위한 ‘집착의 목록’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진정한 정치적 변화를 향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인물이 지닌 집착의 고유한 결을 드러내고 그 목소리에 형태를 부여하는 대로 나아간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자신을 정치적 해방의 장으로 과도하게 선언할 필요가 없다. 탄의 작업을 이끄는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이미 그 자체로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리적 공감이란 어떤 교묘한 설득의 제스처가 아니라, 타인의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태도다. 큐레이팅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SouthEastAsia: Spaces of the Curatorial』(edited by Ute Meta Bauer and Brigitte Oetker, Sternberg Press, 2016)에 수록된 바 있습니다.
사이먼 순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말라야대학교 문화센터 시각예술학과에서 동남아시아 미술사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그의 박사 논문 「예술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What is Left of Art?)」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에서 전개된 좌파적 예술 운동과 근대 도시 형성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탐구한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의 다양한 근대성, 공간과 시각적 실천, 그리고 사진사와 미술사 서술의 역사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1 이 에세이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는 이전에 두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첫 번째는 2013년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Art Stage Singapore)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제시되었고, 이후 그 초기 구상을 발전시켜 2014년 퍼스 현대미술관(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에서 열린 심포지엄 〈프랙티싱 레지스턴스(Practicing Resistance)〉에서 「큐레토리얼 콜로니얼리즘에 저항하기(Resisting Curatorial Colonialism)」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 “마리아 린드, 큐레토리얼에 관하여 (Maria Lind on the Curatorial),” Artforum, 2009년 10월호 참조. “‘Curatorial/Knowledge’라는 제목의 결합은 큐레이팅을 지식의 생산이자 지식과의 적극적 관계 맺음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여기서 ‘앎’은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거나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릿 로고프 , 「확장하는 장(The Expanding Field)」, 이슈(Yishu), 2014년 3–4월호 참조.
4 “컨셉, 콘텍스트, 콘테스테이션: 동남아시아의 예술과 집합성”(Concept Context Contestation: Art and the Collective in Southeast Asia), exhibition,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2014, http://edm.bacc.or.th/edm/201402/eng.html. See also Concept Context Contestation: Art and the Collective in Southeast Asia, edited by Lola Lenzi (Bangkok: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2014).
5 실제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한 인물이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윤리적 딜레마는 큐레이터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드러내야 하는가에 있다. 특히 전시가 스스로를 일종의 정전(canon)을 구축하는 시도로 내세우고, 그 작가 선정이 곧 하나의 ‘미술사 쓰기’로 기능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예민하게 다가온다.
6 Art Basel HongKong, Salon2S, May 2013.
7 ‘우산 혁명(Umbrella Revolution)’은 2014년 8월,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를 시민 투표에 앞서 위원회가 먼저 선출하도록 결정한 데에 반대해 일어난 시위를 가리킨다. 이 시위는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졌으며, 2016년에는 조슈아 웡(Joshua Wong)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문 편집자 주).
8 일리 파르하나(Ili Farhana), 「우리는 우리 예술을 자각하고 있는가?」, PohonBintang, 2014년 1월 2일. “오늘날까지도 말레이시아에서 예술과 행동주의의 결합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게 여겨진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은 작다. 말레이시아의 시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단조롭고, 분노 섞인 외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대중의 에너지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가 대중운동과 더욱 긴밀히 맞물려 국가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일이다.”
9 89플러스(89 Plus)는 2014년에 시작된 장기 연구 프로젝트다. http://www.89plus.com
10 탄 핀 핀, 「감독 노트」, 2007. http://www.tanpinpin.com/invisiblecity/IC%20SYNOPSIS%20BIO%206.4mb.pdf.
How has the curatorial functioned as a form of colonial discourse in its expansion into art and activism? By what means can we identify the contradictions between its claim to agency and the complex texture of social and political disruption? This essay attempts to critique the colonizing tendencies of curatorial knowledge as it seeks to transform art and activism into an archive of knowledge directed at institutional critique, and prospect other means in which genuine engagement can take place.
This cursory essay is not so much an attempt to provide some far-reaching insight into knowledge production via the rubric that we have come to call “the curatorial,” rather than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parameters of the currency in which the curatorial is imbricated with the political.1 By this I refer to the increasing currency in which the term “the curatorial,” in instances that have been used by writers/curators like Maria Lind or the Goldsmiths College Curatorial/ Knowledge program, have come to anxiously represent a rhetorical form of interdisciplinary knowledge mapping and discursive performance.2 In more recent parlance, it is also described as a kind of “commoning.”
This is in contrast to the idea of curating solely as an activity or a practice of putting together an exhibition or even the pre-contemporary art role of a curator as a caretaker of a collection. Instead, the emphasis on the curatorial is primarily centered on the activation of sites of discourse that purport to be socially and philosophically transformative. Such a claim is problematic, especially if we consider the kind of institutional networks that support this form of performative thinking. As a discursive spectacle that emerged from the 1990s onwards, the curatorial as the epistemological handmaiden of advanced capitalism that continues to align itself within the paradigm of reason along the tradition of the Enlightenment meant that certain blind spots continue to exist even if curatorial discourse makes bold critical claims towards discursive reflexivity.
It is the aim and motivation of the curatorial, when directed at art and activism emerging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that I would like to try to discuss here as a problem area. The very encompassing notion of the curatorial has inadvertently carried within its thinking process an unintended colonizing framework. I believe this has to do with how the notion of the curatorial continues to frame and transform specific urgencies into a form of knowledge that is largely generated within a specific reflexive, promotional, and pedagogical mechanism. In this act of knowledge construction, third world art and activism achieves contemporaneity by becoming an archive, pressed into the service of institutional critique in the first world.
Who really cares about the sweat and tears, meat and grit of context when one is removed from the grinding reality of conflicts and negotiations, the actual pedagogical process that goes into shaping specific engagement, when this can be theorized in London?
One generous view is that this line of inquiry could help resist the uncritical adoption of a hegemonic and dominant form of curatorial forms of inquiry, as well as its attendant institutional standards, from being replicated uncritically elsewhere outside of Europe and America. This is what I took from Irit Rogoffs lecture in Hong Kong at the Asia Art Archive Symposium “Sites of Construction.”3 Her strongest argument undoes the presumption that cultural infrastructure and support automatically guarantees superior culture. In its place, she offered a tentative, but by no means exhaustive list of artist initiatives, including Raqs Media Collective, Collective Situaciones, Tucuman Arde, Oda Projesi, and X-Urban. These are artist initiatives that either take the form of social practice or proceed as engagements with critical theory. Though different in textures and responses, they exist primarily as local enterprises that respond to specific socio-political contexts, and have been clustered by Rogoff under the umbrella of art and activism.
In this manner, the notion of contemporaneity is also framed differently. It is not seen simply as a historical period but as multiple sets of shifting “urgencies” whereby the relationship of contemporary art with the past is defined by its use value for the present political/ideological struggles and critique. Even so, in one fell swoop, the enumerated list of collectives and art practices, collected and abstracted, are constellated within a framing device that renders them objects of study for a different purpose. Here, creative activism is transformed into an archive towards an enterprise whose sole aim is to unpack existing, presumably Western, institutional modes and models of curating as determining what are successful ways of discourse production. Who really cares about the sweat and tears, meat and grit of context when one is removed from the grinding reality of conflicts and negotiations, the actual pedagogical process that goes into shaping specific engagement, when this can be theorized in London?
Southeast Asia as Curatorial Conceit
If one assumes this is strictly an East/West division, let me provide an example of how such curatorial process and thinking can also emerg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y attending to a specific case study.
Take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in Thailand as an example since it represents a scenario and a series of evolving and shifting political battle lines that is not entirely black and white. Suffice to say, the complex political scenario suggests that the typology of mass movement, which we so often take to represent the people as a kind of political force, does not always align with democratic processes, even if it claims to.
Ironically, just as the anti-government protest was taking place out on the streets, right outside the doorsteps of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BACC), a survey exhibition “Concept Context Contestation: Art and the Collective in Southeast Asia” was being held inside it. The exhibition attempted to bring into discussion art practices that demonstrated “locally-rooted conceptual thinking used to actively engage audiences [...] CCC investigates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conceptual approaches and social ideologies in Southeast Asian contemporary art of the last four decades.”4
The antinomies between the kind of struggle that was taking place outside on the street and the abstracted grounds of contestation drawn out inside the gallery, where social justice calls the artist activist/conceptual figure into being, could not have been more stark. The exhibition constellates a group of conceptual artworks from “Southeast Asia” and presents them as both an archive and social critique.
Are there phenomena out there that resist the curatorial?
Besides the fact that most of the artists showcased are in fact household names in the art collector circuit, the curatorial premise that argues that a significant feature of Southeast Asian conceptual practice is colored by a political commitment is extremely vague to the point of uselessness.5 How this is political is not enumerated other than facile artistic engagement with notions of history, memory, and politics.
It seems that in this instance, the curatorial has signaled the ever-present possibility in which institutional discourse subsumes radical politics. While the curatorial premise held out some posture of reflexivity by considering the region as a comparative frame in order to postulate a shared history over and beyond the silos of national art histories, it is achieved at the expense of addressing certain blind spots within its own discursive mechanism. In the case of the exhibition, not only are specific positions and histories abstracted through the conceit of the comparative, in comparison with the energy on the street outside of the BACC, what the curatorial did was to flatten the texture of protest, its motivation, context, and concept – even as it claims to recover these potentialities as strategic archives.
The Artful and the Artless
The comparison above therefore brings to the fore the question about whether “contemporary art” as an ecology and institution really has any special purchase on the present. The following discussion attempts to address this through a number of case studies. In an Art Basel Hong Kong’s talk program some years ago, an interesting observation was made during the launch of a newly released monograph on the late Tsang Tsou Choi, the mad graffiti calligrapher, who is better known as the King of Kowloon.6
What piqued my interest was that during the talk the Chinese cultural critic Ou Ning took the opportunity to draw parallels between Tsang’s practice and a relatively young figure in Hong Kong’s activism scene, Joshua Wong. Prior to the umbrella movement,7 the then fifteen-year-old Joshua Wong was already seen as a kind of boy wonder figure who founded a movement called Scholarism in 2011, where he managed to mobilize a group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oppose the Moral and National Education school curriculum introduced by the Hong Kong Education Bureau.
The new school curriculum sought to revise how Hong Kong history is being taught. This change was perceived by the youth of Hong Kong to be ideologically skewed in what it says about Chinese sovereignty over Hong Kong, even under the “one nation, two system” arrangement, Hong Kong was handed back to the Chinese government in 1997 under the promise that the island would retain a large measure of internal autonomy, including universal suffrage, which the country still, debatably, does not enjoy today. Here, it is significant to highlight how Ou Ning had managed to connect these two phenomena together.
Now I want to compare Ou Ning’s statement to a statement made by Ili Farhana, a Malaysian writer and activist. Farhana noted on her blog:
“Up until today, involvement between art and activism in Malaysia is still a rare occurrence. Not to say it doesn’t exists, but it is rare. Protests in Malaysia if compared to those that took place in other countries, lack color. It is often about speeches and heated admonition that at the end of the day weakens the momentum of the masses if it is the only thing that is being offered to the masses. We do not ask to be entertained but to seek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artistic/cultural and the mass movement, that should come together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country.”8
On the one hand, we have in the Malaysian case an anxiety that social protest in and of itself is insufficient if it does not possess a creative element – elements I presume that are meant to add a little creative spark to the protest, to make it exceed the dullness and tedium of politics. In doing so, not only does it seek to transform the terms of art, it also seeks to quite naively rethink politics as possibly more creative. While on the other hand, you have someone like Ou Ning, who has no desire at all to seek out that “creative element” or spark within a social protest movement. So it’s almost as if the entire protest form itself, without any form of creative additives, was sufficiently artful on its own terms and that what art or culture (or the sphere we operate within as historians, curators, and artists) needs to do, is to make a claim of this discourse. We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add to this space really, all we have to do is to consume it and make it part of our own “cultural discourse.”
I find both examples interesting in their desire to bridge this almost unbridgeable chasm between the larger political issue and the location of the creative and the aesthetic within this space. Our desire to fetishize mass movement and energies is apparent: think of Egypt, Taksim Gezi Park, Istanbul, Syria, Bangkok, and Taiwan. We search for a creative sign of life within turmoil, but what exactly are we in fact searching for?
In recent years, I find myself following some of the most artless controversies that have visited Asia. For example, Alvin Tan and Vivian Lee, or known collaboratively as Alvivi until their recent breakup, was best known for sharing their sex videos online. They also ran a confessional and bare-all sex confession channel on YouTube in 2012 that has made both Singaporeans and Malaysians recoil in horror at their antics and derring-dos.
What happens to things that you cannot explain away by reason and discourse?
The other personality that has made recent headlines is Singaporean rabble-rouser Amos Yee, who incidentally calls himself an “artist” on his Facebook page. Though he started making YouTube videos at the age of thirteen, which ranged from a review of Moby Dick to homemade movies, his claim to notoriety can be attributed to a video that lambasted both the Christian Right and Lee Kuan Yew, shortly after the latter’s passing in 2015.
What do these YouTube personalities have in common? In a sense, their deep-seated distrust towards cultural norms is expressed through a refusal to play by the rules of the system, harboring a deep suspicion for any systematized and industrialized forms of pedagogy. Unlike Simon Castets’s and Hans Ulrich Obrist’s search for post-1989 digital natives who still operate within the glib performance of civil discourse, Alvivi and Amos Yee are decidedly belligerents in their refusal to even be civil or governable through the regulatory and spectacle power of discursive performance.9
Is it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in within a kind of curatorial ecology that increasingly prizes curatorial education in centers such as Bard College, Goldsmiths, and de Appel that a certain discursive density emerges from which the above “artists” cannot be assimilated or tamed due to their belligerence? Ultimately, this leads me to the question: are there phenomena out there that resist the curatorial? If we assume that the curatorial owes some of its operative logic to the faculty of reason of the Enlightenment and yet is a thinking process that has emerged specifically in the era of late capitalism, can there be a space where we can escape from the curatorial? What happens to things that you cannot explain away by reason and discourse?
Now, I am not going to be like Ou Ning to say that what Alvivi and Amos Yee did constitute a kind of cultural practice (let alone “art”) that suddenly needs to be framed in relation to some kind of curatorial knowledge about the contemporary condition/culture or art. I don’t want to colonize what they are doing into our knowledge, whether this is art historical or curatorial. Including them in a story about Singaporean and Malaysian visual cultural history, or exhibiting them, doesn’t seem to do justice to it.
What I want to suggest here is the incommensurable gulf between what Alvivi and Amos Yee are doing as a possible space for activism that exceeds what we are trying to frame or discuss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precarious and slippery concept of art and activism combined. In fact, I want to hold them up as a mirror of the kind of conceptual blind spot on our part to recognize the limits of the curatorial as a field. A field that continues to call itself progressive still believes that it is trendy, liberal, forward thinking, yet at the same time seeks out the entirely formulaic and repetitive. Do we then need to revise the terms of our engagement?
Curiosity
Where do we go from here? There is really no new method that I want to suggest here. I would only tentatively suggest what has been understood by most if not all curators, yet this is something that is often held up as more of an ideal than a necessity or a precondition for any form of work that one does. One must work from a genuine compulsion to know, driven by curiosity rather than urgency.
It calls for a kind of anthropology of sustained inquiry. This means that one does not treat the curatorial simply as a deconstructive paradigm. One’s research needs to proceed from a genuine unpacking of assumptions rather than navel-gazing at the epistemological processes that inform the curatorial.
Proceeding from the above, an understanding of the world does not stem from the violent enterprise of mapping. It has less to do with how many disciplinary terrains, knowledge domains, and geographic localities one can traverse and bind together through the stagecraft of the curatorial or what kind of descriptive paradigm one can summon to bring the world into relief. Instead, a turn towards curiosity calls for a genuine desire to know another through experience, so that the other not only becomes valuable and urgent, solely when it becomes an archive for those in a privileged position to critique their own institutional procedure.
As an example, I will not turn to an exhibition but to a film, and one that embodies such an expanded notion of curatorial knowledge. This suggests I am not so much against this expansion of the curatorial as a form of knowledge and practice than the specific vectors that such discussions have so far engendered. This is also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the curatorial to dislodge the exhibition space and practice as the primary site in which the curatorial could manifest itself. I refer here to Tan Pin Pin’s documentary film Invisible City, in which she cataloged the obsessions that the world at large might not deem to be significant, but nevertheless resonate with those individual actors who have lived through a certain moment in Singapore’s history.
Reflecting on the documentary, Tan notes: “I decided to seek out people who, like me, choose Singapore as the topic of their work. I don’t mean where Singapore is the setting for their work, but where Singapore is the main subject.”10
Her film explores Singapore through the viewpoints of four idiosyncratic, but highly colorful residents who have lived through Singapore at the cusp of her independence. They are: Ivan Polunin who produced numerous films of native communities in Singapore and Malaya in the 1950s; Marjorie Doggett, who ha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she took from the 1950s of old buildings that are now demolished; Han Tan Juan, a student activist who showed a collection of photographs connected to the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 riots; Lim Chen Sian, an archaeologist excavating a sixty-year-old military bunker on Sentosa island. These are personal obsessions, traumas, and memories at best, but stitched together with their voices ricocheting against the other they offer a vision of the island-city through the lens of social and cultural history that is vastly different in tone and texture from that of Singapore’s political history.
This catalog of obsessions is fascinating to me on two counts. All our talks of a transnational turn have occluded those committed to localities. The focus in this instance demonstrates a stubborn refusal to speak of the global only from one particular vantage, from one particular frame of mind. Does digging up a fifty-year-old Coke bottle in a Singapore army bunker, in the annals of archaeology, have any global resonance? However, the film-making methodology as a curatorial device here takes the risk of translating one archaeologist’s obsession, compelling the filmmaker to take responsibility in the way we read the other instead of abnegating this responsibility in favor of solipsistic critique of the very enterprise of curating.
In doing so, the film is also committed to a trenchant refusal towards parity or a sense of coexistence that has been taken as a hallmark of contemporaneity. Rather than pit the global as a circuit against the national, the local offers other historical frames of reference that are equally significant and that are equally multitudinous in their ability to challenge official national history. In this argument against the coexistence of concepts, one turns against the desire to catch up with the world, and instead argues for a speaking to the world from other positions. The history of the world can be shaped through other visions and locales outside of putative centers.
In a wonderful exchange where director Tan Pin Pin is interviewing Ivan Polunin, a medical officer who shot color footage of native communities in his study of tropical diseases in the 1950s, reached a kind of impasse when confronted by a subject who reflected on her curatorial gaze.
Off camera: Can I ask you ...
Ivan: You can definitely ask me, but whether you get an answer is another matter.
Off camera: I’ll try any way.
Ivan: Whether you get a satisfactory answer is very much another matter.
This leads me to the second point. The above exchange demonstrates a struggle on the part of the director to come to grips with her subject and in that scenario, it also shows us something akin to curatorial sincerity when one is summoned to the task of interpretation.
In what Tan does, her curiosity does not merely become a catalog of obsession in order to deconstruct disciplinary thinking, but extends beyond the need to address the anxiety of genuine political transformation, to manifest and give the very obsession of her subjects a voice in their particularities. In this way, the film does not need to anxiously declare its relevance as an emancipatory space of the political, since the curiosity of the other that drives Tan’s filmmaking is already transparent. The question of ethical sympathy is less of a sleight of hand than a willingness to listen. So too, I think, should be the curatorial.
This text was originally published in SouthEastAsia: Spaces of the Curatorial, edited by Ute Meta Bauer and Brigitte Oetker (Sternberg Press, 2016).
Simon Soon is a researcher and senior lecturer in Southeast Asian Art History at the Visual Art Department of the Cultural Centre, University of Malaya. His thesis “What is Left of Art?” investigates the intersection between left-leaning political art movements and modern urban formations in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from 1950s–1970s. His broader areas of interest include comparative modernities in art, spatial-visual practices, the history of photography and art historiography.
1 The ideas expressed in this essay have previously been presented on two occasions. This was first presented in a panel discussion at Art Stage Singapore in 2013. The preliminary concept was expanded and then presented as “Resisting Curatorial Colonialism” in a one-day symposium, “Practicing Resistance,” at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n 2014.
2 See “Maria Lind on the Curatorial,” Artform, October, 2009. Goldsmiths College website further notes,“The conjunction of the title ‘Curatorial/Knowledge’ implies an understanding of curating as the production of and engagement with knowledge. Thus ‘knowing’ is not the absorption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and neither simpl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ut rather something we actively produce through our various practices.”
3 See Irit Rogoff, “The Expanding Field,” Yishu(March/April 2014).
4 “Concept Context Contestation: Art and the Collective in Southeast Asia,” 2014. bacc.or.th/edm/201402/eng.html; See also Concept Context Contestation: Art and the Collective in Southeast Asia, ed. lola Lenzi (Bangkok: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2014).
5 In fact, one of the curators is a collector of a number of the artists featured in the exhibition. The ethical quandary here relates to what extent the curator needs to declare his or her self-interest.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when the exhibition prides itself as canon-making and the selection is an attempt at writing a kind of “art history.”
6 Art Basel HongKong, Salon2S, May 2013.
7 JUmbrella Revolution was the name given to protests against a deci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Beijing made in August 2014 to have the candidates for the Hong Kong Executive first be elected by a committee before presenting them to the people of Hong Kong. The protests lasted until December 2014. In 2016, Joshua Wong was found guilty by a court as the leader of the demonstrations (Editor’s note).
8 Ili Farhana, “Adakah Seni Kita Sedari?” PohonBintang, January 2, 2014. “Hingga ke hari ini, penglibatan seni dan ak- tivisma di Malaysia masih dilihat sangat kecil, bukan tidak ada, tetapi kecil. Protest-protest di Malaysia jika dibanding kan di negara-negara lain masih kurang warnanya, dan hanya tentang ucapan-ucapan atau pesan-pesan amarah yang akhirnya akan melemahkan momentum massa jika hanya itu saja yang mampu ditawarkan pada massa. Kita bukannya minta untuk dihiburkan tetapi mengakrabkan gerakan massa dengan hal-hal kesenian dan budaya yang seharusnya berjalan sejajar dalam menuntut perubahan negara.”
9 89 Plus is a long-term research project that began in 2014. See: http://www.89plus.com.
10 Tan Pin Pin, “Director’s Note,”(2007). Available at:http://www.tanpinpin.com/invisiblecity/IC%20SYNOPSIS%20BIO%206.4mb.pdf.
우정 실천: 큐레이터로서 시간을 존중하기 Practicing Friendship: Respecting Time as a Curator
저는 매일 미술을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한때 예술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신자유주의 체제와 제도적 승인 방식이 예술적 실험을 특정한 형태로 규율하는 현실에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술 제도는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현대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창의적 생산을 가로채 수단화하는 일종의 식민화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 실천이 가능했던 이유는, 화이트 큐브 박물관의 관료주의적 체계를 가로지르며 형성된, 지역적 예술 지식에 뿌리를 둔 드물고도 특별한 우정 덕분이었습니다.1 그 우정은 비판적 친밀감으로 작동했으며, 바로 그것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론 기관의 운영진들은 우리 사이의 이런 친밀함을 불편해하게 여기며 경계했지만요.
이 깨달음 이후, 우정의 역할은 제게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밀함이 형성되는 공간이야말로 예술적 지식이 자라나는 토대라고 믿습니다.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화된 환경 즉, 미술관의 이데올로기적 감시와 상업적 기만으로부터 벗어나 중국과 베트남으로 향했을 때, 예술의 언어와 형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정이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정은 공동의 감각을 강력하게 조직함으로써 정치적 자율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술가들이 스스로 구축한 사회적 공간 안에서 발현하는 미술의 목적과 그 사회적 연관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상, 우정으로 상징되는 내부의 환경은 제 노동과 작업의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가 말하는 ‘노동/작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지역 사회의 제도적 전통과 토착적 예술 언어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문화 공간을 이루기 위한 돌봄 실천입니다. 무형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이며, 때로는 작은 범위에 머무르지만, 그 안에는 하늘만큼이나 광위적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기억이 부여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즉, 공동의 의식을 구성하는 살아 있는 영혼으로 인식되며, 서로 다른 맥박으로 진동하는 끝없는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그 대상과 덧없음은 끊임없이 재분류되고 새롭게 호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심리적인 괴로움과 정치적 빈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에 의해 세워진 문화적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공적인 상호작용은 종종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정은 균열 속에서도 결속을 이루며, 기억과 회복의 용광로가 됩니다. 우정의 힘이란, 타인이 우리를 규정하려 할 때 이에 정치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 작업은 흔히 ‘큐레이팅’으로 불리지만, 저에게 그것은 미술가와 그들의 작업을 통해 미학적, 정치적 만남을 창조하는 대화적 상호텍스트성(dialogical intertextuality)에 가깝습니다.2 순간을 만들고, 수행하며, 각인시키고, 더 나아가 감히 시간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곧, 특정 지역과 공동체의 맥락에서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이 이미지와 형식으로 드러나고, 그 과정을 윤리적 책임과 정치적 사유 속에서 다루는 일이지요. 저는 기억과 감정, 형식과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불투명하고 유동적이며 다공성으로 가득한 그림자들 사이에서 응집하는 시간성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때로는 그 시간을 모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정만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정 속에서만 예술적 표현의 생산과, 예술가가 작품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이 미리 이름 붙여지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이 예견되거나 규정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또한 우정(유대이자, 법을 넘어선 관계)안에서는 예술가와 저자 각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이 허용됩니다.3 이 우정의 공간, 즉 존중과 신뢰, 상호 의존, 신용, 일관성, 그리고 개방성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정의되지 않은 것들은 선입견 없이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현실과 전승되는 이야기의 상호 의존성을 배우고(필리핀 여성들은 이를 ‘카프와(kapwa)’4 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스로 살아 숨쉬는 법을 배우고, 세계와의 관계를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것이 더 단단한 담론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력을 길러주고, 그 소환 속에 내재된 꿈을 반영하는 이름을 찾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도달하는 관계의 장이 단지 미적 욕망의 실현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 직업은 정의와 실천의 측면에서 쉽게 맞물리지 않으며, 결국 우리가 속해있는 지리적 환경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놀라울 만큼 뒤섞인 차이의 혼돈 속에서, 저는 예술과 문화의 맥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적 의미와 세계적 의미 사이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큐레이터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전시사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한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결핍된 생태계 속에서, 저는 제 역할이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우정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을 수락한다고 해서 정말 ‘친구’가 되는 걸까요? 중국 국경 인근 지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참여한 ‘사이공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만약 제가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제 노동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또 런던에서 시리아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했을 때, 그 예술가들의 얼굴조차 모른 채 그들의 소망을 언어로 대신 말하려 했다면, 그것이 과연 신중하고 윤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현실이 내전의 지속으로 인해 전 세계적 비극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21세기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책임 있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경험에 시간을 들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큐레이팅이라는 제 직업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는 장소 즉, 예술의 의미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오늘날 예술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박물관과 비엔날레가 ‘글로벌’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플랫폼이 된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적 체계가,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의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현대 미술을 생산하고, 전시하며, 소비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는 의미와 생산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우정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예술가의 이력서에 적힌 유명 전시 기관 예를 들어, 뉴욕현대미술관, 테이트, 베니스 비엔날레, 아트 바젤은 예술이 실제로 탄생한 장소와의 깊은 교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시 중심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시스템은 작품을 생산의 맥락에서 분리해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 맥락에 물리적, 사회적 실체를 덧붙이거나 시스템을 보다 풍부한 차원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 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풀뿌리적, 게릴라식, ‘대안적’ 공동체의 공간에서는, 신체적 행위와 감각적 실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며,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은 관계를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인내심 있는 사유와 건설적 사고를 북돋는 자원이 되며, 예술적 생산과 관계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두 개의 사회적 자본의 행성이 정기적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나누는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전시’5 의 맥락적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역 생태계 속 주요 박물관들이 지식 네트워크를 수집하기 위해 추구하는 연구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박물관의 조직 구조 안에서 우정을 매개로 통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6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전문적 임명’이 아닌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정은 시간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적 지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 경의이며,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명예로운 존중을 요구합니다. 특히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빈곤이 억압된 맥락 예를 들어, 시리아의 Doxbox, 쿠바의 Immigrant International, 콩고의 Studio Kabako, 캄보디아의 SaSa Art Projects, 베트남의 Sàn Art, 스리랑카의 Sri Lanka Archive of Contemporary Art, Architecture, and Design 등에서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양육되는 지식과 기억을 존중하고, 그에 목적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길러내는 것은 바로 우정이라는 비단실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문화 공간의 물리적 벽은 종종 무너지고, 분쟁의 대상이 되며, 이동식이거나 가상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이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 직위’가 이러한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완전히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몇몇 독자들은 제가 예술과 그 생산 및 지원의 맥락에서 말하는 ‘우정’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큐레토리얼 네트워크가 인간의 사고와 문화적 기반에 작용하는 맥락의 영향력을 언제나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큐레이터들이 속전속결로 치르는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미팅은 예술을 깊이 없는 전시 공장으로 바꾸어 버리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무력감에 빠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진,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여러 세계들 사이에서 우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까지 별개로 작동하던 사회적 자본의 구조들이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협력과 가능성의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근원적 우정만이 흔들림 없는 지속성을 지닙니다(bebaios). 왜냐하면 그것은 결단과 성찰을 수반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행위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라고 데리다는 말합니다. “이름에 걸맞은 결단 즉,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결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 결코 빠르거나 쉬울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발언이 지닌 모든 무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7 만약 데리다가 ‘관시(guanxi)’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논평하라고 요청받았다면, 그는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중국과 베트남의 이 사회적 상호호혜 및 상호이익 시스템 다시 말해, 장기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한 우정의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과 지식이 확장되고, 새로운 기회가 촉진되며, 사회적 자본의 접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8 특히 제가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두 나라는 폭력적으로 ‘세계화’된 산업 경쟁 속으로 던져졌고, 현지 ‘문화’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익을 승인 기준으로 삼는 편집증적 정치 감시 메커니즘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미얀마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유사한 문화 통제의 환경에서는 예술 인프라가 자금, 지원, 공간 측면에서 극도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술적 우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이러한 결핍을 메우고, 혁신을 촉진하며, 예술 언어에 내재한 역사적 의식을 “구애하고, 창조함으로써… 선물이 모이는 그릇을 만들어내”9 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물이 모이는 그릇’이 도구화될 때, 그 안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제약을 낳거나, 불길할 만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기업 내 부패, 크로니즘(cronyism)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주체성은 자아에 의해 왜곡되고, 성찰성을 잃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유용성’이 아니라 ‘주의 깊은 성찰(mindfulness)’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논쟁의 한켠에서 부처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차를 나누며 이야기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은 성찰’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의 ‘현존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상호 연결된 순환적 의존성을 인식하고, 그 인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절박한 태도를 내포합니다. 우정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즉, 유익한 사람들과의 연결, 기술의 공유, 조언을 건네는 현자의 역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이러한 이익이나 ‘용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관계이기도 합니다.
미술의 전시와 수집 속에서 시간과 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 요구가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벤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식 운영이 가속화되고, 문화적 책임을 합리화하려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강화되는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적 삶의 생산 양식은 사회적·정치적·지적 삶의 과정 전반을 규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회적 존재가 그의 의식을 결정한다.” 10
사이공에서
2015년 11월 22일
이 글은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에서 발행한 『Field Notes』 제5호에 수록되어, 2015년 11월 22일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조이 버트는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비판적 사고와 역사적 감수성을 지닌 예술 공동체를 만들고, 남반구의 문화적 지형들 사이의 비평적 대화를 촉발해 왔다.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큐레토리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탱저블 인스티튜트(in-tangible institute)’를 설립했다. 호치민 팩토리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예술감독(2017-2021), 산아트(Sàn Art) 총괄디렉터(2009-2016), 베이징 롱마치 프로젝트(Long March Project)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2007-2009), 브리즈번 퀸즐랜드 아트갤러리(Queensland Art Gallery) 아시아 현대미술 어시스턴트 큐레이터(2001-2007)로 일했다.
1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저는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의 현대 아시아 및 태평양 미술 큐레토리얼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정치는 무엇이 보이는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누가 볼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간의 속성과 시간의 가능성을 둘러싼 것이다.” Rancière, J. and G. Rockhill (2004).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London, Continuum), Kindle loc 278.
3 “존재와의 관계는 오직 증거의 자연스러운 자리인 재현 속에서만 생성되는가? 전쟁에서 드러나는 냉혹함과 보편적 권위를 가진 객관성은 존재가 이미지, 꿈, 주관적 추상과 구분될 때 의식에 자신을 부과하는 독특하고 근원적인 형태를 제공하는가? 대상에 대한 인식은 진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바로 그 움직임과 동일한가?” “전체를 이루지 않는 관계는 존재의 일반적인 경제 내에서 ‘나’에서 ‘타자’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로서, 깊이의 거리를 그리면서—대화, 선함, 욕망의 관계로서만 생성될 수 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관한 에세이』 (피츠버그: 듀케인 대학교 프레스, 1969), 24, 39.
4 “Kapwa”는 필리핀 토착어인 타갈로그(Tagalog)어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로, 식민지 이전의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타자 안의 자기(self in the other)’라는 문화적·민족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세대 간의 관계적 태도로서, 각 개인이 자신의 조상 집단의 의미를 계승할 책임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특히 지역 공동체와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Referential Fields: Subjectivization, Kapwa, 2015년 10월 23일 접속,http://glossary.mg-lj.si/referential-fields/subjectivization/kapwa
5 예를 들어, 캐롤린 크리스토프-바카르지에브(Carolyn Christov-Bakargiev)의 ‘dOCUMENTA (13)’가 카불에서 개최한 “Kabul-Bamiyan: 세미나와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의 영향력을 확장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글로벌 전시가 영감을 받은 지역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전시 플랫폼이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평적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
6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큐레토리얼 부임제(curatorial adjunct appointment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인물들이 자신이 전문성을 쌓고, 거주하며, 활동하는 맥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호세 로카[José Roca]는 라틴아메리카 미술 담당 에스트레야타 B. 브로드스키 부큐레이터[Estrellita B. Brodsky Adjunct Curator of Latin American Art]로 임명되어 있다). 또한 테이트는 아시아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순환하는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구성된 “아시아 수집 위원회(Asian Acquisitions Committee)”를 운영한다. 이러한 큐레이팅과 컬렉션 모델은 그 영향력과 형성 과정을 어떻게 더 잘 논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기관들이 학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그 실천의 효용성과 관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7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우정의 정치학』 (런던·뉴욕: 베르소, 1997), 15.
8 치 샤오잉, “관시, 사회자본 이론과 그 너머: 세계화된 사회과학을 향하여”, 『브리티시 저널 오브 소시올로지』 64, no. 2 (2013).
9 루이스 하이드, 『선물: 현대 세계의 예술가와 창조성』 , 25주년 기념판(뉴욕: 빈티지 북스, 1983), 186.
10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Every day I take a moment to quietly reaffirm my motivations for working in the arts, for I’ve got to be frank, I once nearly quit on my passion. Utterly. At a too-early point in my career, I had grown oh-so-tired of the way neoliberal systems of institutional approval were dictating how artistic innovation was allowed to take form and be interpreted—a stance touted to respect the inspiration of artists from far-flung locales with differing determinations of “contemporaneity,” but sadly felt more like a colonisation of their productive processes. What sustained my practice within these particular glass-encased white cube bureaucracies of Museology was the critical intimacy cultivated in my curatorial department—these were rare and special friendships of regional artistic knowledge.1 Indeed, Management was wary of our closeness.
Ever since, the presence of friendship in my field has been of key consideration in the work I have chosen to do. I value this space of intimacy as the most discerning base of knowledge in the arts. In my decision to exit the “professionalised” landscape of government-supported arts infrastructure in Australia for the ideologically monitored, commercially hoodwinked terrain of China and Vietnam, I came to understand just how significant friendship is to sustaining the development of artistic languages and forms—how it can provide political autonomy with a powerful organised presence. Thus I have gleaned much about the purpose of art and its relevance from the social spaces of artists; indeed, these domestic environments of friendship crucially shape my work.
And what is this “work”? It's the building of care towards independent houses of culture that are rooted in the formal and vernacular artistic languages of their localities today. They are immaterial and concrete, often small in size yet holding dreams as vast as the sky, whose charge of memory is grasped as living souls that count for a collective consciousness—a never-ending social network of differing pulse whose objects and ephemerality deserve constant re-categorisation. I'm talking particularly about houses of culture built by artists that dwell together in landscapes of psychological pain and political poverty; where to be visible and publicly interactive is to incur possible conflict; where the power in friendship is an alliance, a crucible of remembering and resilience; where the power in friendship becomes the means to politically challenge those who seek to define you.
My work is referred to as “curating,” but to me it is about the dialogical intertextuality of engaging artists and their art to create encounters between aesthetics and politics2—it's about facilitating time, performing time, imprinting time, and dare I say producing time. It is about caring for the way memory is locally visualised and responsibly provoked; it's about interpreting, describing, and collecting the adhesive presence of time between memory and emotion, between form and its political legitimacy, between shadows opaque, liquid, and porous. Time that only those in friendship can truly critically understand. For it is within friendship that the production of Representation—the journey towards that final destination called an Artwork by an Artist—is able to remain nameless. I say nameless for it is in naming that we are coded, thus presumed spoken for. I say nameless for it is in friendship (that code, that bond, beyond Law) that the Face of the artist, the author, is permitted the space to Be.3 It is within this space of friendship—the qualities of respect, trust, reliability, credibility, constancy, openness—that namelessness can look with unconditioned eyes on its surroundings, can learn of its interdependency on the facts and legends of its people (perhaps the Filipina would call it “kapwa”4), allowing the idea to learn how to breathe, to figure its own relationship to the world, to beg friendship to make introduction to discursiveness sturdier, to come up with a name that reflects the dreams inherent to its conjuring, to hope that its eventual interface does not enter the aesthetic regime with only one stride.
But this profession of mine is a deeply uneven one in definition and practice, and ultimately hinges on the geographies and social networks with which we live and devote. In this wondrous calamity of difference, I believe the context of art and culture must be facilitated, and I believe such facilitation requir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pace that is carefully weighted between local and global meaning. Some curators believe their key task to contribute to a history of exhibitions; in an ecology of cultural lack, however, I believe my key task is to sustain critically thinking creative communities of friendship.
But let's revisit Time. If I click “Yes” on a friendship request on Facebook, am I thus now a “friend”? If I set up an art project in Saigon as a social enterprise engag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long the border region with China, yet I've never spent time with such a victim, do I truly believe in my work? If I curate an art exhibition in London of Syrian contemporary art with artists I don't even physically recognise, am I demonstrating care in knowing the depth of my naming their dreams into words has consequence,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global depravity of their ongoing civil war? How important is the investment of shared experiential time to build interpersonal networks that responsibly define who we are and what we do as curators working transnationall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speaking of this Occupation of mine—curating—I'd like it to invest more “time” in understanding an artist and the conditions with which their art is given meaning, presence, and value in the sites that gave birth to its existence. With the current speed of the global systematisation of art, and its palate to collect and showcase the “global” within museum and biennale platforms, I think it crucial that such systems care about the impact of its tourism on local communities struggling to sustain criticality with their own cultural knowledge. The attitude with which we produce, display, consume, and interpret contemporary art should be supportive of sustaining its diversity in production and meaning.
And here I must return to friendship, for it is sadly not the acclaimed venue notches of an artist's curriculum vitae that a depth of exchange with artistic sites of production is practiced—not the likes of MoMA or the Tate; not the Venice Biennale or Art Basel. Their showcase-driven, marketable (and thus timetabled) arms hold the interface (the artwork) aloft from the context of its production as opposed to considering how to give those arms increased dimension, to give physical articulation to such context. It is rather within the smaller, grassroots, guerilla-like, “alternative” collective spaces of action, at the local level, that arms and hands are found in provocative swat and caress, where time is of currency in encouraging patient constructive thinking.
If only these two planets of social capital could sit at a regular table and share a meal of time, perhaps then we could discuss the impact of shifting the situatedness of an “exhibition”5; or perhaps better implement a research strategy for collecting art by which knowledge networks from the local ecologies’ major museums seek to acquire are integrated as friendships into departmental structures of museum life.6 I must emphasise here again why I say “friendships” (as opposed to “professional appointments”) for friendship demands a respect for time, a deference for the long-term in building social forms of knowledge, a respect for the role of honour in failure while searching for success. In contexts of suppressed psychological pain and political poverty particularly (think Syria with Doxbox; think Cuba with Immigrant International; think Congo with Studio Kabako; think Cambodia with SaSa Art Projects; think Vietnam with Sàn Art; think Sri Lanka with Sri Lanka Archive of Contemporary Art, Architecture, and Design and so many more…), it is the silken thread of friendship that sustains, gives purpose, and ultimately breeds a respect for knowledge and memory that is nurturing and under constant re-evaluation. The physical walls of these houses of culture are often crumbling, contested, mobile, virtual, or publicly inaccessible and thus trust is of urgency to ensure survival.
This is not to say that “professional appointments” are void of such bonds, and I am sure I will find readers thinking I am overly idealistic with my romance of friendship in the context of art and its production/facilitation here, but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a curatorial address book needs to remember the impact of context on human intelligence and its cultural underpinnings. Speed dating parachute meetings by visiting curators turn art into a factory of showcase with no depth, and I have witnessed first-hand just how many of these visits critique and leave young artists utterly gutted, confused, and helpless. We need to practice friendship across our transnational planets of differing understandings of time to give structures of social capital the chance to interlock.
“Only primary friendship is stable (bebaios), for it implies decision and reflection: that which always takes time…” Derrida says. “A decision worthy of the name—that is a critical and reflective decision—could not possibly be rapid or easy, as Aristotle then notes, and this remark must receive all the weight of its import.”7 I wonder what Derrida would say if tasked to comment on the interpersonal networks of “guanxi,” for it is in this system of social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in China and Vietnam—an interpersonal network of friendship anchored in nurturing long-term exchange8 that I have witnessed respect and knowledge expand, opportunities facilitated, and contacts of social currency gained. I am speaking particularly of my experiences in China and Vietnam, these countries that were violently thrown into a “globalising” industrial competition, where local “culture” has been systematised by paranoid political surveillance mechanisms who argue patriotism, nationalism, and profit as key determinants of approval. In such environs (and there are many other similar landscapes of cultural control—think the divisive and brutal religious doctrines that have mired Afghanistan, India, and Myanmar, for example), the infrastructure for the arts is incredibly lacking in funds, facilitation, and space, and it is thus the interpersonal networks of artistic friendships that enable and innovate this lack, who invoke historical consciousness embedded within artistic languages “by courting, by creating . . . that begging bowl to which the gift is drawn.”9
Of course the instrumentalisation of such a “begging bowl” can be dark, intelligibly limiting, and hauntingly violent (corruption in business; cronyism in politics), but that is where the agency of such networks has been foiled by ego, and where reciprocity has lost its mindfulness. Yes, I say “mindfulness” as opposed to “utility,” and now perhaps we have Buddha sharing a cup of tea with Aristotle in this little duel, but I say “mindfulness” for its Being “present,” for its acknowledgment of interconnected cyclical dependencies and, thus, the interwoven urgency to be held responsible for its cause and effect. Friendships can be useful in practice—we take advantage of what the Other can provide—social introductions to beneficial people, sharing of skills, a sage for advice, but friendships are also virtuous bound beyond profit, beyond “use.”
I may be impractical in my plea for time, for friendship, to be respected within the showcase and collection of art, but I think in the increasing entertainment frenzy of event management and a rationalised capitalistic system of cultural accountability, we must remember “[t]he mode of production of material life conditions the social, political, and intellectual life process in general. It is not the consciousness of men that determines their being, but, on the contrary, their social being that determines their consciousness.”10
Saigon
22 November 2015
This text was published on November 22, 2015, in Field Notes, Issue 5, issued by Asia Art Archive.
Zoe Butt is a curator and writer, nurturing critical thinking and historically conscious artistic communities, fostering dialogue among cultures of the globalizing souths. In 2022 she founded ‘in-tangible institute’, seeking a robust ecology for locally-responsive curatorial talent in Southeast Asia. Previously she was Artistic Director, Factory Contemporary Arts Centre, Ho Chi Minh City (2017-2021), Executive Director, Sàn Art, Ho Chi Minh City (2009-2016), Director, International Programs, Long March Project, Beijing (2007-2009), Assistant Curator, Contemporary Asian Art, Queensland Art Gallery, Brisbane (2001-2007).
1 I refer to my time working at the Curatorial Department of Contemporary Asian and Pacific Art at Queensland Art Gallery, Brisbane, Australia from 2001 to 2007.
2 “Politics revolves around what is seen and what can be said about it, around who has the ability to see and the talent to speak, around the properties of spaces and the possibilities of time.”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trans. Gabriel Rockhill (London: Continuum, 2004), Kindle edition, loc. 278.
3 “Is relationship with Being produced only in representation, the natural locus of evidence? Does objectivity, whose harshness and universal power is revealed in war, provide the unique and primordial form in which Being, when it is distinguished from image, dream, and subjective abstraction, imposes itself on consciousness? Is the apprehension of an object equivalent to the very movement in which the bonds with truth are woven?” (24); “A relation whose terms do not form a totality can hence be produced within the general economy of being only as proceeding from the I to the other, as a face to face, as delineating a distance in depth—that of conversation, of goodness, of Desire…” (39). Emmanuel Lévinas,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24, 39.
4 “Kapwa” is an indigenous Filipino (Tagalog) term of psychology whose root is anchored in pre-Hispanic, pre-colonial thinking, a cultural ethnic attitude of "the self in the other." This is a relational attitude between generations where each individual acknowledges their relevance and responsibility to carry forward their ancestral collective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spect to their local community and natural environment, Referential Fields: Subjectivization, Kapwa, accessed October 23, 2015, http://glossary.mg-lj.si/referential-fields/subjectivization/kapwa
5 For example, to study the impact of Carolyn Christov-Bakargiev's dOCUMENTA (13) in her extending the exhibition presence to Kabul with her “Kabul-Bamiyan: Seminars and Lectures” programme;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such global surveys on the sites in which its thematics are inspired, to beg the question, “How can such showcase platforms be continuous and long-term in their critical cultural exchange?”
6 The Tate Modern have curatorial adjunct appointments that allow these individuals to remain in the contexts they specialise, live, and work (José Roca is Estrellita B.Brodsky Adjunct Curator of Latin American Art); it also possesses an “Asian Acquisitions Committee” of rotating expertise and social status within the region it claims to care. How can such models of curating and collecting be better discussed in impact and formation so as to improve its work and relevancy, in order for other institutions of enabling capacity to learn and innovate?
7 Jacques Derrida, Politics of Friendship (London and New York: Verso, 1997), 15.
8 Qi Xiaoying, “Guanxi, Social Capital Theory and Beyond: Toward a Globalized Social Sci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 no. 2 (2013).
9 Lewis Hyde, The Gift: Creativity and the Artist in the Modern World, 25th Anniversary ed. (New York: Vintage Books, 1983), 186.
10 Karl Marx,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reface abstract), accessed October 23, 2015, Marxists Internet Archive,
당신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유승아: 이 글은 아시아를 방법론으로 삼아 미술 생태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웹 기반의 큐레토리얼 프로젝트 AIC(Asian Institutional Critique)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며 참고했던 이론가, 작가들의 목소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1 적극적 인용은, 내가 어떠한 사유의 장 안에 있으며, 나의 선택과 행위, 그리고 생각이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제가 어떤 관계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로런 포니에: 이는 지극히 교차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이며 포스트식민적인 비판의 방식을 닮고자 하는 욕망에서 쓰였으나, 그런 식으로 작업이 완성될 리 만무하고 또 모든 것을 포용하거나 아무런 오류도 없는 비판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승아: AIC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제도적 예술 장치를 성찰하는 큐레토리얼 프로젝트입니다. AIC는 지금껏 우리가 미술 작품과 제도를 둘러싼, 행위 주체들을 감수성 있게 돌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술 실천안에서 간과된 노동, 협업의 방식, 리서치, 과정, 연구, 프로덕션의 방식을 다루는 웹사이트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적이고 수행적으로 제도와 범주, 공동체를 다르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아시아 창작자들에 주목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탐구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 예술 조직과 제도 기반에서 탈식민주의적 변화와 시도
- 제도 건설적 움직임
- 상호 배움을 통한 지식의 생산
- 돌봄과 노동
- 콜렉티비즘
- 자기이론(Autotheory)
이때 제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의미에 관해서,
쑨거: 개념적 존재로서 아시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적’ 사유 방식은 단순히 ‘아시아인’의 사고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특정한 사고방식과 구분되는 성찰적 구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유럽인, 아프리카인, 미국인 모두 아시아적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아시아적’ 사고가 시공을 초월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후도(風土, fūdo)와 역사적 경험의 산물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서구중심주의가 서구인의 특권에만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서구 근대 역사 과정의 산물인 것처럼, ‘아시아적’ 사유 방식 또한 실체라기보다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존합니다. 나는 이러한 ‘아시아적’ 사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서구중심주의를 효과적으로 배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시아성은 궁극의 종착지가 아니라, 특수성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하며 사고의 계기로 작동하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유승아: ‘아시아’라는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창작자들의 실천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쑨거: 동태적 구조들의 집합이자 끊임없는 자기부정으로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로런 포니에: 욕망과 어려움, 매혹과 좌절, 고집스러운 경화와 유순, 반복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양가적인 부지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승아: 미술을 탄생시키는 다양한 외부 조건과 그 기반이 되는 거대한 생태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할 텐데요.
이릿 로고프: 비평성은 이중적 속성을 갖습니다. 우선 비평성은 예술제도 내에서 노동하는 개별 주체에게 체화된 비판의 형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것을 재구성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 모델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 넓은 범주의 비판적 참여자를 통해서 현재 작동 중인 예술 제도의 수행적이고 참여적인 실천 조건들을 탐구함으로써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승아: 한편 아시아에서의 제도비판적 움직임은 서구에서 파생된 맥락과는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테: 서구 제도 비판 운동에서 강조되는 비판적 성찰성(critical reflexivity)을 아시아 미술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범주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기준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승아: 대안적인 것에 관한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태계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낀 몇몇 아시아 지역의 사례처럼, 오히려 제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콜렉티비즘적인 움직임이 더 눈에 띄지 않았나요?
또, 오늘날 제도를 성찰한다는 행위란,
카렌 아키: 예술 노동자가 예술 제도를 비판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롭고 급진적이며 보다 포용적인 접근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타야 우어리워라클: 생명에 대한 보살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돌봄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승아: 그러므로 AIC는
사디아 시라지: ‘유색인종의 시간(Colored People’s Time)’, 지연된 시간, 비선형적 시간, ‘크립 타임(crip time)’ 등 대안적 시간성을 포용하여,
김재리: 특정한 개념이나 맥락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관객이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단단한 큐레이션(hard curation)’과 다른, ‘부드러운 큐레이션(soft curation)’을 시도합니다.
유승아: 그럼으로써 서구중심주의적 관점을 재고하고 해체하는 사유 연습의 수단으로 말이죠.
이빈소연: 이제, 당신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유승아: 한편,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척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AIC가 초대한 창작자들의 주제어로 우정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조이 버트: 우정은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사회적 지식의 형성을 향한 오래된 경의이며, 성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패마저 품위 있게 존중하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늘 재평가되고 가꾸어지는 지식과 기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목적을 부여합니다.
게시야다 시레가르: 우정은 비공식적이고 기록되지 않으며 평가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 자라납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투명한 성과와는 달리, 우정에는 에두아르 글리상이 말한 ‘불투명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는 타자 즉,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를 반드시 투명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서로의 불투명성을 존중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서구 중심적 ‘보편성’이 행사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승아: 동등성을 전제로 하며, 복잡하고 느린 시간이 요구되는 우정의 개념은 매우 해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정 속에서 미술로 대화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새로운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앤서니 데이비스, 스테판 딜레무스, 야콥 야콥센: 시도하라, 흐름을 타라, 계속,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라, 실패를 즐거워하라, 캠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은 생산이다, 역사를 다시 써라, 정체성을 재정의하라, 재산의 개념을 다시 배워라, 다른 언어를 배워라, 감성적인 것을 다시 분할하라, 탈전문화하라, 다시 전문화하라, 현재를 다시 상상하라, 우울감과 친해져라, 새로운 사전, 용어, 어휘, 색인, 목록, 지도를 만들어라.
유승아: 그렇다면, 우정의 개념을 통해 미학과 행동주의 사이의 제도적 실험이 가능할까요?
셀린 콘도렐리: 우정의 건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정은 정치적인 것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빈소연:
유승아는 기획의 방법론으로 ‘여성적 글쓰기’를 실험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탐구한다. 언어로 명백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앎, 무의식적이고 감각·지각적인 차원, 비선형적인 시간성과 같은 ‘여성적 글쓰기’의 주요한 특징을 큐레토리얼의 방법론으로 삼아, 이 세계의 관습적인 작동 방식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힘, 기존의 시야와 전혀 다른 새로운 앎의 방식을 조형한다. 전시 《마야माया》(아케이드서울, 2025), 《Summerspace》(Hall1, 2024)와 《꿀꺽》(두산갤러리, 2024, 이상엽, 이지언 공동 기획) 그리고 큐레토리얼 프로젝트 〈How Does Performance Art Work?〉(2023)를 기획했다.
이빈소연은 과장되고 허황된 서사를 만들어 이방인의 정치성을 탐구한다. 정상성의 연대에서 모범으로 호명되는 주체들보다, 연대를 거부하거나, 회의적이거나, 어깃장을 놓는 자들이 벌이는 좌충우돌의 정치에서 나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연대 없는 연대를 모색한다. 개인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부서(Nothing(0) Department)》(2024, 상히읗), 《사랑의 작대기 Love on the air》(2022, YPC space) 등을 열었으며, 아마도예술공간(2025), 세화미술관(2025), 인천아트플랫폼(2023), SeMA 벙커(2021)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 인용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지의 전망들: 동시대 미술과 제도』 (국립현대미술관, 2023); 국립현대미술관,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국립현대미술관, 2024); 로런 포니에, 『자기이론』, 양효실, 김수영, 김미라, 문예지, 최민지 역(마티에, 2025); 쑨거, 『새로운 보편성을 창조하기』, 한윤아 역 (미디어버스, 2021); 줄리 아울트 외, 『스스로 조직하기』, 박가희, 전효경, 조은비 역 (미디어버스, 2016); 차학경, 『딕테』(서울: 문학사상, 2024); Gesyada Siregar, “Kerja Bakti in Gudkitchen: A Place to Cook Collaboration, Chaos, Control, Conflict, and Care,” 2025; Nitaya Ueareeworakul, “Womanifesto: Flowing Connections,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Foundation,” 2023,https://cdn.aaa.org.hk/_source/womanifesto-flowing-connections.pdf; Irit Rogoff, “From Criticism to Critique to Criticality.” 2003.http://eipcp.net/transversal/0806/rogoff1/en/print; 이 글은 2025년 9월 5일, 아르코데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프록시 컨퍼런스: 숲 속에서 Proxy Conference: In Forest (2023)





아프사×다브라, 〈프록시 컨퍼런스: 숲 속에서〉, 2023, 싱글 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35분 4초.
서로 다른 시공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숲 속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들, 사랑을 위해 거대한 바위와 나무로 다시 태어난 존재, 할머니의 지혜와 거래되는 꿈, 의식에서 희생된 가장 어린 소녀와 그를 위해 소환된 요정, 파리(परी). 대화의 구체 속에서 “공포는 순수를 감싸고, 어둠은 통찰을 불러일으키며, 연약함은 다시 일어설 힘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살아낸 이야기 속에는 늘 역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짓는 방식으로 이 여자들은 서로 머나먼 거리에서 손과 손을 마주 잡으며, 미지의 영향력 아래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숨겨졌던 것들을 보게되고, 감춰져 왔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AFSAR×DAVRA, Proxy Conference: In Forest, 2023, single-channel 4K video, color, sound, 35min 4sec.
Unidentified beings from different times and places meet and converse in a forest: madwomen from an attic, a being reborn in massive rock and wood for the sake of love, a dream of transaction with a grandmother’s wisdom, the youngest girl sacrificed in a ritual, and a pari(परी) summoned to her aid. The dialogue states, “Horror shelters innocent, gloom ignites insight, fragility preserves resurgence, paradox in the lived stories.” Through their storytelling methods, the women link hands over great distances, dwelling together within an unknown influence. This approach allows them to see things that were hidden and speak things that were concealed.
아프사(AFSAR, Asian Feminist Studio for Art and Research)는 영화 제작, 상호 배움, 프로그램, 출판 등 유동적인 형식을 기반으로하여, ‘아시아’를 지역성과 디아스포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탐구한다. 동시대 여성주의 담론을 토대로 한 예술적 연구(artistic research)를 생산하고, 체현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아프사는 아시아아트아카이브(2025), 타이콴(2024), 아시아아트비엔날레(2024), 맨체스터 이시아 컨템퍼러리(2023) 등 다양한 기관의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다브라(DAVRA)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가 도쿠멘타 15 프로젝트 〈칠탄〉을 확장해 2021년 결성한 중앙아시아 연구 그룹이다. 다브라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촉진하며 예술 생태계를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억을 통해 자기 발견과 지식 교환, 공동체적 치유의 의례에 관해 탐구하는 『칠탄: 중앙 아시아에서 형상을 변신하는 영성들』(2022)을 출간했으며, 아이 필름미술관(2023), 퐁피두 센터(2023), 고이스트 영화제(2023) 등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오고 있다.
Taking fluid shapes such as film production, study groups, programming, and publications, Asian Feminist Studio for Art and Research (AFSAR) explores “Asia” as a framework to approach issues impacting its localities and diaspora. AFSAR produces artistic research rooted in contemporary feminist discourse, bringing together artists, curators, writers, and practitioners to generate a living and embodied archive. AFSAR has participated in programmes and exhibitions at Asia Art Archive(2025), Tai Kwun(2024), the 2024 Asia Art Biennial(2024), and ESEA Contemporary (2023).
DAVRA is a Central Asian research collective founded by Saodat Ismailova as an expansion of her Chilltan project for documenta fifteen. The collective aims to strengthen and connect the Central Asian art ecology by fostering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cross the region. DAVRA published Chilltan: Shapeshifting Eternal Spirits from Central Asia(2022), a study that explores rituals of self-discovery, knowledge exchange, and communal healing through memory. DAVRAe has organized programs and screenings of Central Asian moving-image works at institutions including the Eye Filmmuseum(2023), the Centre Pompidou(2023), and the goEast Film Festival(2023).